❀全州崔氏(妻家)❀
■영 암 향 약■영암에 전승되고 있는 향약 자료와 그 유형■
晛溪亭 斗井軒
2024. 8. 25. 09:21
728x90
반응형



■영 암 향 약■
https://www.hiks.or.kr/Translations/2/read/79
[머리말]
영암군(靈巖郡)은 전라도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장흥군, 서쪽은 영산강을 건너 무안군, 남쪽은 해남군·강진군, 북쪽은 나주시와 접하고 있다. 마한시대 때는 월지국(추정)이었으며, 백제 때는 월나군(月奈郡)이었는데, 통일신라 757년(경덕왕 16)에 영암군(靈岩郡)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 995년(성종 14)에는 낭주(朗州)로 승격하여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두었다가 1018년(현종 9)에 안남도호부가 전주로 옮겨감에 따라 다시 영암군(靈岩郡)이 되었다. 황원군(黃原郡, 해남군 황산면)·도강군(道康郡, 강진군)을 속군으로, 곤미현(昆湄縣, 영암군 미암면)·해남현(海南縣)·죽산현(竹山縣, 해남군 마산면)을 속현으로 관장하였는데, 1172년(명종 2) 감무(監務)의 파견으로 이들 군현이 독립했다. 조선시대에도 영암군을 유지했으며, 별호는 낭주(郎州)·월나(月奈)이다.
영암은 일찍부터 향약이 시행된 지역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유풍이 잘 남아있는 곳이다. 그와 더불어 향약을 시행했던 장소와 그것의 산물인 향약자료가 잘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향약의 1번지라고 말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영암의 덕진면 영보리에 있는 영보정 동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영보정 동계는 기록에 의하면, 1550년에 연촌 최덕지의 내·외손들이 목족계(睦族契)로 만들었는데, 불행히도 정유재란 때 좌목과 약조가 일실되었고, 신축년(1601)에 옥곡(玉谷) 김광헌(金光獻)이 족인들과 함께 다시 계를 만들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上舍) 민계영(閔繼榮)과 상사 신각(辛珏)이 서문을 짓고 계의 명칭도 바꾸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영보정 동계 자료는 1649년에 작성한 것부터 남아있는데, 약조(約條) 중에 번거롭거나 가혹한 것, 소략하거나 빠진 것, 지금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 등을 바로잡아 중수한 것이다.영보정은 연촌 최덕지(崔德之) 선생이 관직을 떠난 후 영암의 영보촌에 내려가 학문연구에 몰두하면서 사위 신후경(愼後庚)과 함께 지은 정자이며, 선조 이후 퇴락하자 최정(崔珽)과 신천익(愼天翊)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영보정 동계자료는 현재 영보리 전주최씨 문중의 재실인 합경재(合敬齋)에 보관되어 있다. 이곳 합경재에는 녹동서원의 자료도 함께 보관되어 있는데, 녹동서원은 1713년에 사액을 받은 서원으로,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존양사(存養祠)라는 이름으로 1630년에 창건한 곳이다. 그래서 동계자료와 존양서원 청금안의 인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영보정과 함께 향약시행소로 알려진 곳이 모산리(茅山里)의 영팔정(詠八亭) 동계인데, 현재는 원본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후대에 중수한 자료도 매우 소략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역사성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본서에서 영보정 동계 뒤에 붙여서 싣도록 하였다.
영팔정(詠八亭)은 전라도관찰사 류관(柳寬, 1346~1433)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의 아들 류맹문(柳孟聞)을 시켜 1406년에 건립한 정자이고, 그 후 1689년에 영의정을 지냈던 류상운(柳尙運, 1636~1707)에 의해서 중창되었다고 한다. 영팔정은 처음에는 나주목사 류두명이 마을 이름인 모산의 ‘모(茅)’자와 류관의 호인 하정의 ‘정자(亭)’자를 따서 ‘모정(茅亭)’으로 불렀으나, 율곡 이이(李珥)가 이곳에 와서 류관의 학덕을 기리면서 주변 경관을 팔경시(八景詩)로 읊었으며, 그 뒤 고경명(高敬命)·남이공(南以恭)·류상운(柳尙運) 등이 팔경시를 차운하여 지은 것으로 인해 영팔정으로 바뀌었다. 현재 영팔정에는 위의 네 사람이 지은 팔경시 외에도 남구만의 시와 전라도관찰사인 류봉휘(柳鳳輝)의 기록, 류상운이 찬술한 , 1985년에 김태경(金太璟)이 쓴 등이 현판으로 걸려있다.
영팔정의 동계는 문화류씨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정유재란 때 모두 소실되었던 것을 1611년에 중수를 하였고, 그 후 1707년에 또 중수를 하여 완의와 조약을 다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어떤 연유인지 도중의 활동이 남아있지 않다가 1915년에야 중수를 하게되었고, 이때 전사한 기록에 덧붙여 지금까지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망호정의 향약자료집은 별도의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망호정의 동계로는 동상계와 대동계가 있는데, 동상계는 1779년에 만들어졌고, 대동계는 186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본서에서는 대동계 자료 중에서 회계장부인 강신안을 뽑아 그중에서도 1900년 이전에 작성된 것을 싣도록 하였다.
■영보촌의 촌락공동체 조직, 영보동계(永保洞契)■
영암 영보촌은 전주 최덕지(1384~1455)를 중심으로 지연·혈연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최덕지의 호는 연촌(烟村) 혹은 존양당(存養堂)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그는 전주최씨 영암 입향조로, 본래 전주에서 살다가 말년에 영암으로 유우(流寓)하였다. 그는 1405년(태종 5)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과 삼사(三司)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가 말년에 남원부사직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1450년경 영암 덕진면 영보리로 입향하여 정착하였다.
전주최씨는 영암에 입향한 이후 1589년(선조 22)에 영보동계를 중수할 만큼 동족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예컨대 1578년(선조 11)에 연촌 최덕지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연촌영당을 건립하였고, 1610년(광해군 2)에는 연촌영당을 개장하였으며, 1630년(인조 8)에는 연촌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존양사(存養祠)를 창건하였다. 뒤이어 1659년(효종 10)에는 연촌영당을 중건하였고, 1678년(숙종 4)에 연촌유고를 간행하였으며, 1680년(숙종 6)에 존양사 사액을 위한 청액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1690년(숙종 16)에 존양사에 출입하는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전주최씨 문중의 향촌활동은 모두 외손인 거창신씨와 남평문씨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먼저 거창신씨가 영보촌에 입향하게 된 연원은 본디 연촌과 친분이 있었던 전라감사 신기(愼幾, ?~1493)와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연촌 최덕지의 사위인 신후경(愼後庚)이 신기의 아들이다. 거창신씨의 영암에서의 향촌활동은 신후경의 아들 신영수(1442~1497)과 신영명(1451~1498), 그리고 신영명의 손자 신희남(1517~1591) 등이다. 이 가운데 신영명은 1474년(성종 5)에 이우당(二友堂)을 건립하여 향촌유림들의 집회장소로 활용하였다. 또 이우당의 손자 신희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영암향약을 창설하는 데 참여하였다. 또 신희남의 증손이었던 신천익(1592~1661)과 신해익(1592~1616) 형제는 문장(文章)과 시부(詩賦)에 능하였다. 특히 신천익은 1612년(광해 4)에 문과 급제하여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가 한성부부윤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정을 보고 관직에서 물러나 영암에 은거하였다.
다음 남평문씨의 영보촌 입향은 문맹화(1433~?)이다. 문맹화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사직하고 처향인 영암에서 은거하였다. 남평문씨는 문맹화의 중손 문익현(1573~1646) 때 영보촌에서 장암정으로 이거하였다. 문익현은 문맹화의 5자 문명견(文命堅)의 손자이다. 문맹화는 부인 서흥김씨 사이에서 5남 3녀를 낳았다. 문맹화의 1자 문명부(文命敷) 직계 후손은 영보촌에 그대로 남아 정착하였고, 2자 문명신(文命新), 3자 문명희(文命羲), 4자 문명량(文命良) 등이 타지역으로 이거하였으며, 문맹화의 막내아들 문명견의 직계 후손들이 장암정으로 분파하여 남평문씨 집성촌을 이루었다.
영보촌에 정착한 전주최씨·거창신씨·남평문씨 등은 영보촌의 동계 집회장소인 영보정 중건사업을 추진하였다. 영보정은 본래 전주최씨와 거창신씨의 영보촌 세거를 시작하면서 건립되었다. 그런데 임진·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모두 소실되자, 1635년(인조 13)에 전주최씨최정(1568~1639)과 거창신씨 신천익(1592~1661) 등이 영보정 중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1649년(인조 27)에 영보동계가 다시 중수되었다. 이때 이가식이 쓴 「중수서문」에 “영보동계의 시원은 연촌 최덕지의 내외손이 이미 결성하였던 구계(舊契)를 중수하는 것으로, 너무 번잡하거나 소략한 부분을 다시 중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1778년(정조 2)에 「중수서문」을 쓴 신철흥은 “영보동계는 1550년(명종 5)에 연촌 최덕지의 내외손이 만든 목족계(睦族契)로부터 시작하였으며, 1649년(인조 27)에 영보동계헌을 중수할 때 구계(舊契)를 중수하여 동계를 조직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1752년과 1755년에 동계중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752년 「중수서문」에 “영보동계는 족계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면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친족 간에 상부상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또 1755년(영조 31) 「동약」 서문에 “옛날 향약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약의 결속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영보동계는 족계의 전통을 잇는 부상계(賻喪契) 성향과 촌락공동체의 제반사를 총괄하는 동약(洞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일례로 1772년 부상계 서문에 계원수가 증가추세로 나타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지출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 결과 본래의 상장부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영보동계에서 10석을 내고, 동(洞)의 각계(各契)에서 20석을 출연하여 상장부조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촌락제반사를 관장하였던 동계가 수차례 중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암에 전승되고 있는 향약 자료와 그 유형
임진왜란 이후 향촌세력들은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해 양반신분의 상계(上契)와 상민신분의 하계(下契)를 통합하여 동약(洞約)을 만들었다. 동약은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와 부세(賦稅)에 대응하기 위해 동(洞) 단위로 만든 자치조직이었다. 이름하여 동계(洞契)·동의(洞議)·동안(洞案) 등으로 불렀다. 이러한 동계는 동일 촌락 구성원들로 조직된 까닭에 소위 동헌(洞憲)·동규(洞規)·동약(洞約) 등으로 칭하였다. ‘향약·동계·동약’ 등으로 불리는 마을공동체 조직은 수개의 인접 촌락을 연계하는 형태로 결성되었다.
전라도 영암을 대표하는 성씨와 사람들은 자연촌을 단위로 하여 지연(地緣)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혼인을 통해 혈연(血緣)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지연과 혈연을 기반으로 영암에서 세거하면서 촌락공동체 조직인 향약·동약·동계를 결성하였다. 현전하는 전라도 영암지방 향약·동약·동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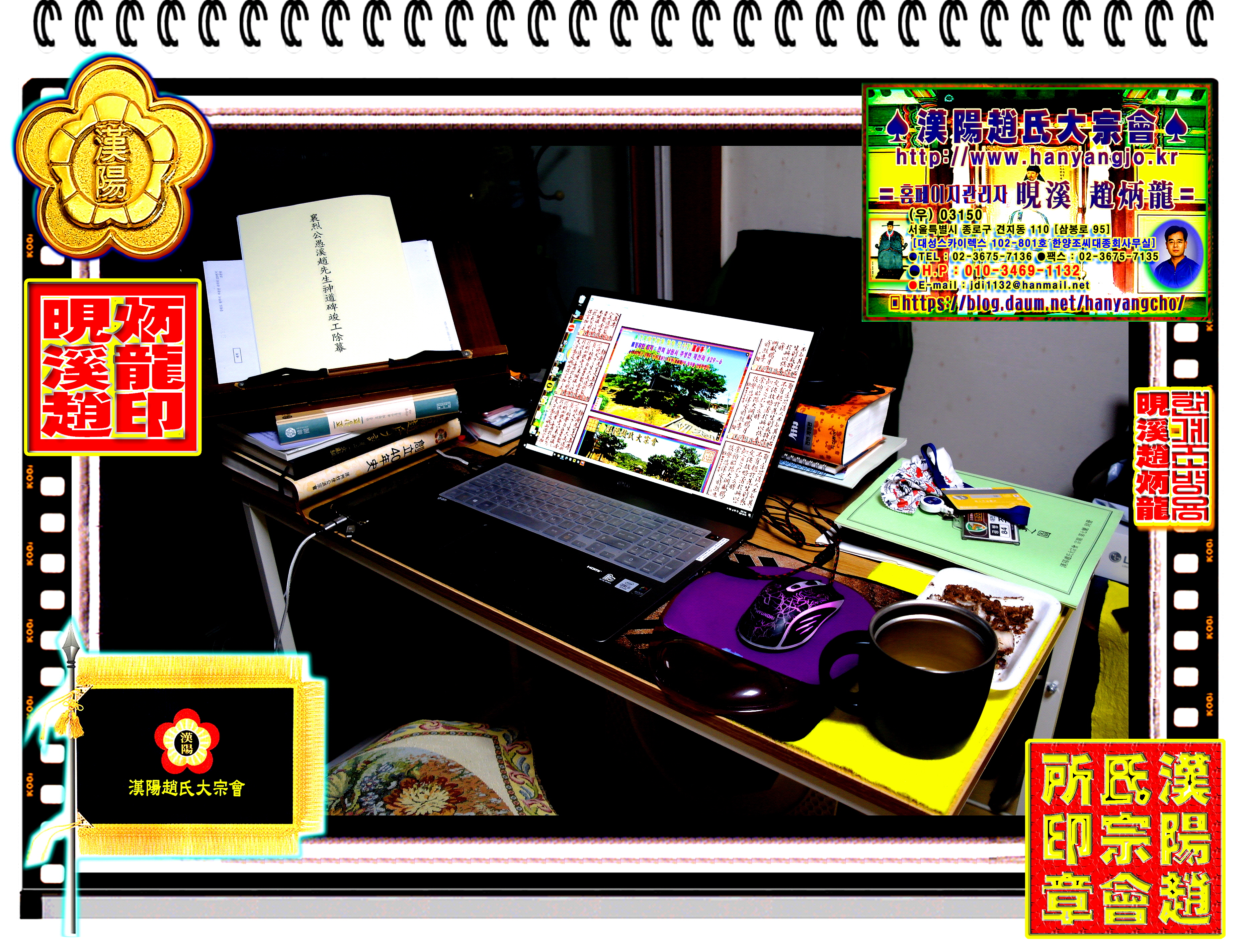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