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우계선생신도비명(牛溪先生神道碑銘) 병서 (昌寧成氏成某)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10. 23. 07:45
728x90
반응형


계곡선생집 제13권 / 비명(碑銘) 9수(首)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







■우계선생신도비명(牛溪先生神道碑銘) 병서 (昌寧成氏成某)
[DCI]ITKC_BT_0333A_0140_010_0020_2004_002_XML DCI복사 URL복사
만력(萬曆) 26년(1598, 선조 31)에 우계 선생(牛溪先生)이 작고하였다. 그 뒤 4년이 지나 정인홍(鄭仁弘)이 선생에 대해 무함을 가하였는데, 또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공의(公議)가 비로소 정해지면서 관직을 추증(追贈)하고 역명(易名 시호(諡號)를 내리는 것)하는 의전(儀典)이 차례로 거행되었다. 이에 군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우세했다가 드디어는 하늘이 이기는 이치가 밝게도 징험되었도다. 사람은 세력으로 하고 하늘은 이치에 따르는 법, 세력이 행해짐은 한때이지만 이치의 밝음은 백세에 뻗치도다. 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행을 권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는 이윽고 선생의 풍도를 사모하는 공경대부와 사인(士人)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선생의 도가 이제 크게 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묘도(墓道)에 아직도 드러내 새기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이는 선생의 덕을 드러내고 후세를 인도하는 방도가 못 된다.”
하고, 마침내 서로 재물을 모아 비석을 마련한 뒤 그 명사(銘詞)를 나에게 부탁해 왔다. 이에 내가 고루(固陋)하다는 이유로 누차 사양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선생의 휘(諱)는 모(某)요 자(字)는 호원(浩原)이요 자호(自號)는 묵암(默庵)으로서, 우계(牛溪)라고 하는 호는 학자들이 선생을 일컫는 호칭이다.
성씨(成氏)는 본래 창녕(昌寧)으로부터 비롯된다. 비조(鼻祖)인 인보(仁輔)는 고려 때 중윤(中尹)의 관직에 이르렀고, 6대조 석연(石䂩)은 아조(我朝)에서 벼슬하여 예조 판서가 되었다. 증조 휘 충달(忠達)은 현령으로 판서를 증직받았고, 조부 휘 세순(世純)은 지중추부사로 시호(諡號)가 사숙(思肅)이다.
부친 휘 수침(守琛)은 유속(流俗)을 높이 초월한 절조(節操)의 소유자로서 은거하여 도를 강론하였는데, 세상에서 청송 선생(聽松先生)이라고 불렸다. 누차 부름을 받았으나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죽어서 사헌부 집의에 추증되었는데, 파평 윤씨(坡平尹氏)를 배필로 삼아 가정(嘉靖) 을미년(1535, 중종 30)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동유(童儒) 시절부터 자질이 영민하여 공부를 잘하였다. 17세에 사마(司馬) 양시(兩試 진사시와 생원시임)에 응시하였다가 병으로 복시(覆試)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마침내 과거 시험 보는 일을 포기하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온 마음을 쏟은 결과, 겨우 약관(弱冠)의 나이에 배움과 실천면에서 모두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 동배들로부터 크게 추복(推服)을 받았다.
청송(聽松)이 일찍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선생이 2번이나 허벅다리 살을 베어 약에 타서 드리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상(喪)을 당하자 3년 동안 여묘(廬墓) 생활을 하였다.
선묘(宣廟) 초년에 방백이 탁월한 학행(學行)의 소유자로 선생을 조정에 천거하여 2번이나 참봉을 제수받았고 잇따라 6품으로 훌쩍 뛰어올랐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또 적성 현감(積城縣監)을 제수받았을 때는 사은(謝恩)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시골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원근(遠近) 지역의 학자들이 날로 찾아오자 선생이 가르쳐 인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서실(書室)의 내규(內規)를 지어 제생(諸生)에게 행동 규범을 제시하였다.
그 뒤로 장원(掌苑), 사지(司紙)와 주부, 판관, 첨정과 공조의 좌랑ㆍ정랑을 차례로 제수받았으며, 대직(臺職)으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말하면 지평이 10여 차례, 장령이 2번이나 되었는데, 심지어는 마여(馬轝)를 내주면서 타고 오게까지 하였으나 모두 고사(固辭)하고 응하지 않았다.
상이 일찍이 율곡(栗谷) 이 문성공(李文成公)에게 문의하기를,
“성혼(成渾)이 어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만, 그의 재주는 어떠한가?”
하니, 문성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독자적으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임무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신이 감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사람됨이 선(善)을 좋아하니, 선을 좋아하면 천하를 넉넉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다만 그는 병이 잘 걸리는 허약한 체질이라서 복잡한 임무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니, 한가한 부서에 놔 두고서 자주 경악(經幄)에 입시(入侍)하게 한다면 분명히 성덕(聖德)을 보익(輔益)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신사년에 종묘서 영(宗廟署令)에 임명하면서 간절히 부르자 선생이 병을 무릅쓰고 상경하였다. 이에 상이 어의(御醫)를 보내어 병을 살피게 하는 동시에 약이(藥餌)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인견(引見)하여 치도(治道)의 요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니, 선생이 답변드리기를,
“인군(人君)은 반드시 몸과 마음을 수렴(收斂)하여 지기(志氣)가 늘 맑아지도록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본이 확립되면서 의리가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치란(治亂)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단지 인주(人主)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반드시 훌륭하게 보좌할 수 있는 정승을 얻어서 널리 인재를 거두어 각종 직위에 배치시키도록 한 뒤에야 정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현재 조정을 보면 무사 안일주의로 자리만 보존하려는 신하들이 많은 반면, 임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인사들은 보기 드무니 이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하였다. 또 상이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과 관련하여 그 대책을 물으니, 선생이 답변드리기를,
“세입(稅入)을 헤아려 지출을 하되 위의 비용을 덜어서 아래 보태 준다면 그 은혜가 백성의 마음을 결속시켜 천명(天命)을 길이 받드는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이윽고 다시 봉사(封事 임금만 보도록 봉해서 올리는 상소문)를 올려 조금 전에 아뢰었던 내용을 부연하여 강력하게 개진하였다. 그런데 그 상소문을 오래도록 안에만 놔 두고 있자 정원이 선시(宣示)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소한 내용 가운데 가령 학문을 논한 대목 등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성찰을 할 것이다마는, 나라의 제도를 모조리 경장(更張)하려고 하는 것은 또한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훌륭한 법 제도가 연산(燕山)에 의해서 온통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중에서도 공물(貢物)의 진상(進上)을 중하게 늘렸던 일이 아직껏 다 개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변통하지 않는다면 좋은 정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상이 이 점을 상당히 난처하게 여긴 것이었다. 그 뒤에 인대(引對)하는 기회에 또다시 그 주장을 펼쳤었는데, 당시 이 문성공의 뜻도 선생과 합치되어 누차 이를 언급하곤 하였으나, 끝내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선생은 서울에 있을 때 녹봉(祿俸)을 받지 않았다. 상이 이 말을 듣고 특별히 미두(米豆)를 하사하였는데, 선생이 사양을 하자, 상이 이르기를,
“부족한 것을 도와줄 때는 받는 것이 옛날의 도이다.”
하였으므로, 선생이 곡물을 받은 뒤에 친척과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풍처창 수(豐儲倉守)와 전설사 수(典設司守)로 옮겨졌다. 대신이 계청(啓請)하여 직질(職秩)을 높여 주고 경연 참찬관을 겸하게 하였는데, 상이 한직(閑職)에 몸담으면서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였다.
선생이 몇 차례나 상소를 올려 물러가게 해 줄 것을 청하면서 교외에 나가 명을 기다리자, 상이 하교하여 소환한 뒤 인견(引見)하여 극력 만류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더욱 간절하게 퇴직을 청하자 상이 비로소 우선 돌아가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 뒤 누차 사헌부 집의와 제시(諸寺)의 정(正)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계미년 봄에 특별히 병조 참지에 제수하면서 몇 번이나 소명(召命)을 내리자 선생이 마지못해 입경(入京)하였다. 얼마 있다가 이조 참의로 옮겨지고 은대(銀帶)를 하사받았는데, 선생이 3차례나 상소하여 사직한 끝에 허락을 받고 명에 의하여 경연에만 입시하였다.
문성공이 당시 조정에 있으면서 중외(中外)의 촉망을 한 몸에 받았는데 선묘(宣廟) 역시 바야흐로 융숭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군소배들이 어떻게든 해치려고 들면서 하찮은 일들을 주워 모아 공을 탄핵하자 선생이 상소하여 그 무망(誣罔)을 변박(辨駁)하였는데, 군소배들이 더욱 노여워한 나머지 마침내 선생까지 싸잡아 탄핵하였으므로 선생이 그날로 파산(坡山 파주(坡州))에 돌아왔다.
이에 태학생 4백 70인과 호남 및 해서(海西)의 유생 수백 인이 서로 잇따라 항장(抗章)을 올리면서 사정(邪正)을 가려 진달드리자, 상이 포답(褒答)을 하고 또 하교하기를,
“진정 군자이기만 하다면 당(黨)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 나는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당에 끼고 싶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군소배들을 모조리 축출한 뒤 다시 이조 참의로 선생을 불렀는데, 선생이 누차 사직하여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조정에 나와 명에 숙배(肅拜)하였다. 뒤이어 참관으로 승진되자 5차례나 소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문성공이 죽자 선생이 더욱 세상일에 뜻이 없어져 잇따라 상소하여 물러갈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지 않고 이르기를,
“이제 막 어진 재상을 잃어 나의 잠자리가 편안치 못한데, 이러한 때에 나랏일을 함께 다스려 나갈 이를 찾는다면 경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분황(焚黃 추증된 선조의 무덤 앞에서 관고(官誥)의 부본(副本)을 불사르는 것)하는 일로 휴가를 청해 돌아가게 되었는데, 상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장리(長吏)를 보내 안부를 묻고 음식을 하사하게 하였다. 그 뒤 찬집청(纂集廳)을 설치할 때 선생을 당상으로 부르면서 3번이나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문성공이 죽고 나자 상황이 크게 변한 가운데 군소배들이 차츰 조정에 진출하면서 더욱 옛날의 원한을 심화시켜 나갔는데, 선생이 다시 기용(起用)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추악한 말로 무함하며 헐뜯자 선생이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였다.
기축년 겨울에 다시 이조 참관에 임명되자 간절히 사양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이 발각되자 상이 이르기를,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긴 만큼 경이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선생이 마침내 조정에 나아왔다.
당시 역변(逆變)이 진신(搢紳) 사이에서 나온 관계로 연루자(連累者)들이 점점 늘어만 갔는데, 선생이 평반(平反 변통을 해서 죄를 경감해 주는 것)의 의논을 극력 주장하는 한편 상소를 하여 옥사(獄事)를 완화시킬 것과 형(刑)을 신중히 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역괴(逆魁)와 같은 종족이었던 어떤 상신(相臣) 하나가 진대(進對)하다 잘못 말하자 논자들이 기망죄(欺罔罪)를 적용하려고 하였는데, 선생이 극력 말하며 변호한 결과 대죄(大罪)를 면하게 해 준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임금의 총애를 받는 정승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화(禍)를 일으킬 조짐이 명백해지자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태학의 제생(諸生)이 상소하여 만류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뒤로는 선생을 부르는 명이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최영경(崔永慶)이 사람들의 입에 올라 옥에 갇히는 몸이 되자 선생이 정상철(鄭相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정상이 입대(入對)하여 영경에게 다른 뜻이 없음을 극력 아뢰었으므로 상의 노여움이 조금 풀어졌다. 그 뒤 신묘사화(辛卯士禍)가 일어났을 때는 이에 연루되어 유배당한 사람들이 모두 선생의 지고(知故)들이었는데, 군소배들이 화심(禍心)을 늘 간직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까지도 화망(禍網)에 몰아넣으려 하였다.
이듬해 왜구(倭寇)가 깊이 쳐들어옴에 따라 상이 장차 서쪽으로 피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선생이 뛰어들어 국난(國難)을 구하려 하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디 산야(山野)에서 일어난 몸으로 현재 당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목을 받는 가운데 밤낮으로 죄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니, 나라가 비록 위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리상 감히 경솔하게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승여(乘輿)가 만약 서쪽 지방으로 떠나게 될 경우 길옆에서 곡하며 맞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그때 자문을 구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마땅히 대가(大駕)를 따를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직 물러가 구렁에 빠져 죽을 따름이다.’ 하고 자제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상이 거연(遽然)히 도성을 떠날 계책을 결정하게 되었다. 선생의 집은 관로(官路)로부터 20리쯤 떨어져 있었는데, 거가(車駕)가 이미 임진(臨津)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는 부랴부랴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임진강 나루를 건너는 길이 이미 끊어진 데가 난병(亂兵)이 벌써 길들을 막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통곡을 하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산속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광해(光海)가 세자의 신분으로 이천(伊川)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을 내려 선생을 불렀는데, 병이 심해져 나아가지 못한 채 상차(上箚)하여 16개 조목의 일을 개진하였다. 그러자 광해가 편의대로 선생을 검찰사(檢察使)에 임명한 뒤 잇따라 2번이나 불렀으므로 선생이 병을 무릅쓰고 소명(召命)에 응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행재(行在)에 달려가서 상소를 하며 선장(選將), 치병(治兵), 취량(聚糧) 등의 3가지 계책을 논하고, 인하여 또 말하기를,
“적국(敵國)에 의한 외환(外患)을 하늘의 운수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제왕이 변고를 당하게 되면, 혹 조서를 내려 자기의 죄로 돌리면서 존호(尊號)를 삭제해 버리기도 하였고, 혹 나라를 그르친 신하를 죄줌으로써 사방에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역시 큰 뜻을 분발하여 통렬하게 자신을 경책(警責)하는 동시에 근습(近習)들이 궁중과 교통(交通)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폐단을 근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인사들을 등용하여 이목(耳目)의 역할을 맡긴다면, 인심(人心)이 열복(悅服)하고 구적(仇賊)도 소멸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 상소가 나오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는 장차 화의 씨앗이 여기에서 비롯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명(明) 나라의 찬획(贊畫) 원황(袁黃)이 글을 보내 학문을 논하면서 정주학(程朱學)을 집중 공격해 왔다. 이에 제공(諸公)이 대론(對論)을 벌이는 것을 난처하게 여기면서 선생에게 답변을 작성해 주도록 부탁하였는데, 선생이 말은 겸손하면서도 이치는 바르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자 원황이 다시는 논란을 벌이지 못하였다.
전후에 걸쳐 몇 차례나 참찬과 도헌(都憲)에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사양하고 산반(散班)에 몸을 담았다. 왜적이 선릉(宣陵 성종(成宗)의 능)과 정릉(靖陵 중종(中宗)의 능)을 파헤치자 선생이 명을 받들고 봉심(奉審)하면서 온당하게 변고에 대처한 뒤 해주(海州)의 행궁(行宮)에서 복명(復命)하였다. 그러다가 대가가 환도(還都)할 때에는 선생이 남아서 중전(中殿)을 호위하였는데, 호서(湖西)의 적이 일어나자 선생이 마침내 도성으로 향하였다.
처음에 임진왜란을 당해 서쪽으로 피난을 떠날 때, 상이 임진(臨津)에 이르러서 하문하기를,
“성혼의 집이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였는데, 간인(奸人) 이홍로(李弘老)가 가까운 대안(對岸)의 자그마한 촌락을 아무렇게나 가리키면서 대답하기를,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다시 하문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와서 나를 보지 않는단 말인가?”
하자, 홍로가 대답하기를,
“이런 때를 당하여 그가 어찌 기꺼이 찾아와 뵈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그 뒤 선생이 분조(分朝)에서 행재(行在)로 달려오자 홍로가 또 참소하여 말하기를,
“성혼이 이곳에 온 목적은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일단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들어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선생이 대죄(待罪)하자, 하교를 하여 변란 초기의 일까지 소급해 거론하였는데, 그 사지(辭旨)가 준열하고 엄하였다.
이에 선생이 황공한 나머지 감히 해명하지 못한 채 무거운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청하자 상이 너그럽게 답하긴 하였으나, 그 뒤 참찬 겸 비국 제조로서 선생이 진달하며 건의해도 대부분 들어주지 않았다.
왜적이 영남 지방의 10여 군(郡)에다 참호를 파고는 버티고 있었는데, 중국 군대 역시 피로에 지친 나머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다. 이때 총독(摠督) 고양겸(顧養謙)이 동쪽의 일을 전담하면서, 우리에게 자문(咨文)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강화(講和)하자는 왜적의 요구를 우선 들어주고 뒷날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먼저 중국 조정에 상주(上奏)했으면 하는 것이었다.
묘당에서는 스스로 생각해도 왜적을 물리칠 계책이 궁했으므로 고양겸의 자문대로 따르려 하였으나, 군의(群議)는 매우 강력하게 화의(和議)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런 중에서도 유독 이공 정암(李公廷馣)만은 호남을 순찰하면서 건의하기를 ‘우선 강화를 허락함으로써 적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당시 나랏일을 맡고 있던 유상 성룡(柳相成龍)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여 선생과 약조를 한 뒤 함께 입대(入對)하였다.
이에 상이 고양겸의 자문을 들어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하문을 하자, 선생이 답변드리기를,
“우리나라가 일단 독자적으로 전수책(戰守策)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제(節制)하는 권한이 모두 고양겸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 그가 하는 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정암으로 말하면 충의(忠義)의 대절(大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한 것이 나라를 걱정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심각하게 죄를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이 엄청나게 노여워하였는데, 이때 유상(柳相)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만 물러나오고 말았다. 이에 삼사(三司)가 번갈아 소장을 올려 화의를 배척하였는데, 그 의도가 선생에게 있었으므로 선생이 인구(引咎)하고 사직을 청한 뒤 시골로 돌아왔다.
무술년 여름에 병이 위독해지자 먼저 아들 문준(文濬)에게 명을 내리기를,
“내가 군부(君父)에게 죄를 얻은 몸으로 심사(心事)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했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옷은 포의(布衣)로 하고 염(斂)은 지금(紙衾 종이 이불)으로 할 것이며, 띠풀을 엮어 관(棺)을 덮고 소가 끄는 수레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러면 충분하다.”
하였다. 그러고 나서 6월 6일에 이르러 파산서실(坡山書室)에서 역책(易簀 학덕이 높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함)하였는데, 향년 64세였다. 이해 모월 모일에 파주(坡州) 향양리(向陽里) 유향(酉向)의 언덕에 장사를 지내었다.
선생이 죽고 난 뒤에도 군소배들이 미워하는 감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인홍이 일단 자기 패거리를 사주하여 무함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자, 권세를 좌우하는 자가 이에 따라 멋대로 헐뜯고 짓밟은 결과 마침내 선생의 관직이 추탈(追奪)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하여 유림(儒林)의 기운이 크게 저상(沮喪)되었다.
금상(今上)께서 대위(大位)에 오르시자 오공 윤겸(吳公允謙)과 이공 정귀(李公廷龜)가 선생이 무함을 당하게 된 시말(始末)을 아뢰어 설명드렸는데, 상 역시 평소 선생이 대유(大儒)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즉시 복관(復官)을 명하고, 뒤이어 의정부 좌의정의 증직과 문간(文簡)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에 제생(諸生)이 파산(坡山)에 서원을 건립한 뒤 청송 선생을 함께 모시고 선생의 향사(享祀)를 받들게 되었다.
나는 세상에 늦게 태어나 선생의 문하에서 직접 수업받을 기회는 없었으나 다행히 여러 노선생들로부터 그 서론(緖論)에 대해 나름대로 들을 수가 있었다. 청송(聽松)의 학문은 대체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에게서 나왔는데 선생이 이른 나이에 가정에서 이에 대해 훈도를 받았고, 또 일찍이 퇴도(退陶 이황(李滉))를 존경하며 사숙(私淑)하였으니, 그 학문은 고정(考亭 주희(朱熹))을 준칙(準則)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도를 강명(講明)하고 실천하는 데에 모든 공력을 쏟았는데, 특히 마음의 본원(本源)을 밝혀 단속하는 데에 더욱더 독실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평소의 언동(言動)이나 집안을 다스리는 의법(儀法)으로부터 상제(喪祭)의 절문(節文)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소학(小學)》과 《가례(家禮)》에 있는 대로 행해 나갔다. 이렇듯 한결같이 성(誠)과 경(敬)에 근본을 두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닦아 기른 결과, 덕기(德器)가 확고하게 형성되었으므로 누구든 선생을 바라보기만 해도 도를 소유한 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젊어서 율곡과 교분을 맺고서 이택(麗澤)의 도움을 주고받았다. 일찍이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선후(理氣先後)의 설을 함께 논하면서 수천 만 언(言)의 서신을 왕복하였는데, 그중에는 선유(先儒)들이 미처 드러내 밝히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었다. 율곡이 언젠가 공을 일컬어 말하기를,
“가령 견해의 심천(深淺)을 굳이 논한다면 내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하고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였다. 선생의 문장을 보아도 경술(經術)에 본원(本源)을 둔 가운데 명쾌하고 통창(通暢)하며 전아(典雅)하기 그지없었는데, 지금 문집 몇 권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선생은 본래 은거하면서 덕을 닦으려고 하였을 뿐 세상을 담당할 뜻은 당초부터 없었는데, 급기야 명성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선묘(宣廟)의 특별한 은총을 크게 입어 불차지위(不次之位 순서를 무시하고 특별히 발탁하는 것)의 대우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조정에 몸담고 있었던 시간을 모두 합쳐 보면 1년도 채 차지 않았다. 율곡을 위해서 한 번 해명해 준 것이 마침내 군소배들의 미움을 받게 된 나머지 결국은 그들의 중상모략에 걸려 지업(志業)을 제대로 펴 보지 못했으니, 아마도 운명적으로 도가 폐해지려는 때였던 모양이다. 이 말이 맞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령 선생이 죽은 뒤에 포숭(褒崇)하는 일이 행해져 조금 사문(斯文)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하더라도 세도(世道)가 교상(交喪)하게 된 일에 대해서야 어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부인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군수 여량(汝樑)의 딸로서 모두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 문영(文泳)은 일찍 죽었고 차남 문준(文濬)은 현감이며, 장녀는 별좌(別坐) 남궁명(南宮蓂)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부윤 윤황(尹煌)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의 아들로 모(某)가 있다. 문준은 3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역(櫟)이고 차남은 익(杙)이고 그 다음은 직(㮨)이며, 딸이 세 사람 있다. 남궁명은 3남을 두었고, 윤황은 5남을 두었다. 외손으로 남녀가 매우 많으나 다 기록하지 못한다.
명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사문에 복을 내리사 / 天胙斯文
철인이 한꺼번에 나게 했도다 / 幷生哲人
우계(牛溪)와 율곡(栗谷) / 坡山石潭
유덕군자(有德君子) 반드시 지기(知己) 있는 법 / 德則有隣
송 나라 때 주회암(朱晦庵)과 장남헌(張南軒)처럼 / 擬宋朱張
서로들 인덕(仁德)으로 도와줬다오 / 相輔以仁
도와 기의 오묘한 관계 / 道器之妙
성과 정의 미묘한 속성 / 性情之微
체와 용의 근원 하나이어니 / 體用一源
둘로 나뉘면 결별이라오 / 二之則離
자세히 따져 묻고 분명히 해명하여 / 審問明辨
의심할 여지없이 회통했나니 / 會通無疑
숨겨졌던 내용들 확충시키고 / 旣擴前秘
제기될 의문점 해소했도다 / 亦徹來蔽
숨고 나온 것은 무슨 마음이었던가 / 隱見何心
오직 의리 입각한 행동이었지 / 惟義之比
근실한 우리 선생 / 釁釁先生
완덕(完德) 속에 갖추고서 정도를 걸었도다 / 含章履貞
몹시도 어려웠던 시대를 만나 / 遭時孔囏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형통했지 / 身困心亨
사람들은 내 마음 안 알아줘도 / 人莫我知
하늘만은 속일 수가 결코 없는 법 / 天不容欺
사람들이 우세하여 액운당하다 / 人勝而阨
하늘의 뜻 정해짐에 회복되었네 / 天定乃復
일단 회복되고 나자 / 亦旣復矣
발산되는 빛 / 不顯其光
백세 뒤에라도 / 百世以俟
남긴 글 휘황하리 / 遺文煒煌
도덕 군자 끝까지 왜곡된다면 / 道而終詘
선인(善人)들 어떻게 북돋우리요 / 善者曷勗
후대의 학자들 부탁하노니 / 凡厥來學
나의 이 비명(碑銘) 잘 살피시기를 / 鑑此鑱石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1995

■牛溪先生神道碑銘 幷序 (昌寧成氏成某)
[DCI]ITKC_MO_0333A_0140_010_0020_2003_A092_XML DCI복사
萬曆二十六年。牛溪先生卒。後四歲。仁弘之誣行。又二十餘歲。公議始定。贈官易名之典。長第擧焉。君子曰。昭哉徵乎天人之交相勝也。人以勢天以理。勢行於一時。理明於百世。不如是。爲善者何勸焉。旣而公卿大夫士慕先生之風者。相與謀曰。先生之道。於今可謂大信矣。墓道尙闕顯刻。非所以章德詔後。遂相與鳩財治石。而以銘詞屬維。維屢以固陋辭。不得命。謹按先生諱某。字浩原。自號默庵。牛溪者。學者所稱也。成氏本出昌寧。鼻祖仁輔。高麗時官中尹。六代祖石䂩。仕我朝爲禮曹判書。曾祖諱忠達。縣令。贈判書。祖諱世純。知中樞府事。 諡思肅。考諱守琛。有高世之操。隱居講道。世稱聽松先生。屢徵不起。卒。贈司憲府執義。配坡平尹氏。以嘉靖乙未。生先生。自童孺敏悟善學。年十七。擧司馬兩試。以病不赴覆試。遂棄擧子業。專心爲己之學。甫弱冠。學就行尊。大爲流輩所推服。聽松嘗病谻。先生再割股和藥以進。及丁憂。廬墓三年。 宣廟初。方伯以學行卓異薦于朝。再除參奉。尋超陞六品。皆不就。授積城縣監。謝恩已卽歸。遠近學者日益進。先生誨迪不倦。作書室儀。以示諸生軌則。歷除掌苑司紙主簿判官僉正工曹佐郞,正郞。 其爲臺職。以持平召者十餘。掌令者再。至命乘馬轝以來。皆固辭不至。上嘗問栗谷李文成公曰。成渾之賢。予已聞知。顧其才何如。文成對曰。謂之獨任經濟。臣未敢知。其爲人好善。好善優於天下。但多病不堪任劇。置之閑局。使數侍經幄。必能裨益聖德。辛巳。拜宗廟署令。召旨懇切。先生力疾詣京。上遣醫問疾。賜藥餌。尋引見。訪治道之要。對曰。人君必先收斂身心。使志氣常淸。則本立而義理昭著矣。又言治亂無常。只係人主一心。然必得賢輔相。使廣收俊乂。列于庶位。然後治化可 成。又曰。方今朝著多容身保位之臣。鮮引君當道之士。此最可憂。上問民生困瘁。對以量入爲出。損上益下。則可以恩結民心。爲祈天永命之本。已而又上封事。申前意而極言之。疏久留中。政院請宣示。上曰。疏中如論學等事。予當省察。但欲盡取國制而更張之。其亦難行矣。先生嘗謂祖宗良法。盡爲燕山所壞。進上貢物之增重者。未盡裁革。不變而通之。無以爲治。上頗以是難之。後因引對。復申其說。時李文成公意與先生合。亦屢以爲言。而終不行。識者恨之。先生在京不受祿。上聞之。別賜米豆。先生辭。上曰。周之則受。古之道也。先生悉分與親戚隣里。遷豐儲倉,典設司守。大臣啓請進秩兼經筵參贊官。上命以閑職入侍。先生累疏乞退。出郊待命。上下敎召還。引見勉留之。先生乞退益懇。上始許姑歸。屢拜司憲府執義,諸寺正。皆不就。癸未春。特拜兵曹參知。召命屢下。先生黽勉入京。俄遷吏曹參議。賜銀帶。先生三疏辭職。許之。因命入侍經筵。文成公當朝爲中外屬望。宣廟眷注方隆。群小惎之甚。捃摭細事論劾之。先生上疏辨其誣罔。群小益怒。遂倂劾先生。先生卽日還坡山。太學生四百七十人。湖南海西儒生數百人。相繼抗章。指陳邪正。上褒答之。又敎曰。苟君子也。不患其有黨。予願入珥,渾之黨。遂盡逐群小。復以吏曹參議召先生。先生屢辭不許。遂赴朝拜命。陞拜參判。五疏辭不許。未幾。文成公卒。先生益無意世事。連章乞骸。上不許曰。新喪賢宰。予寢不貼席。共理國事。非卿而誰。居數月。以焚黃乞暇歸。上命本道遣長吏存問賜食物。纂集廳之設也。以堂上徵。三拜同樞。皆辭。文成公旣沒。時事一變。群小稍稍進用。益修舊郤。恐先生復起用也。以醜語誣𧥮之。先生上疏自劾。己丑冬。復拜吏曹參判。懇辭。會鄭汝立謀反事發。 上曰。國有大變。卿不可退。先生遂赴朝。時逆變出於搢紳。株連寢廣。先生力主平反之議。上章請緩獄恤刑。相臣有與逆魁同宗。因進對失實。論者將當以欺罔。先生極言救解。得免大何。無何。幸相煽蜚語。禍幾已兆。先生解職歸。太學諸生。上疏請留。不報。自後徵命不復下。崔永慶被口語逮獄。先生以書抵鄭相澈。鄭相入對極言永慶無它。上意稍解。辛卯士禍作。坐竄貶者。皆先生知故。群小蘊蓄禍心。必欲倂及先生。明年。倭寇深入。聞上將西狩。先生欲入赴難。自念本起山野。方身被鉤黨之目。朝暮且得罪。國雖有急。義不敢輕自進。乘輿若西幸。當哭迎道左。如蒙顧問。則當隨駕。否則唯有退死溝壑耳。俄而上遽決去邠計。先生家去官路二十里。比聞車駕已渡臨津。倉黃欲追赴。而江津阻絶。亂兵已梗路矣。遂慟哭舁疾。避兵于峽中。光海以世子駐伊川。下令召之。病甚不得赴。上箚陳十六事。光海便宜拜檢察使。尋再召。先生力疾赴召。旋詣行在。上疏論選將治兵聚糧三策。因言敵國外患。不可歸諸天數。在昔帝王遭變故。或下詔罪已。貶去尊號。或罪誤國臣。以謝四方。今宜奮發大志。痛自警責。絶近習交通宮闈與政之端。用正直士。爲耳目寄。則人心悅服。仇賊可滅矣。疏出。觀者知禍萌在是也。天朝贊畫袁黃。詒書論學。專絀程,朱。諸公難其對。屬先生草答。辭遜而理正。袁不能復難。前後累拜參贊都憲。輒辭就散班。賊發宣,靖二陵。先生承命奉審。處變得宜。復命于海州行宮。大駕還都。先生留扈 中殿。湖西賊起。先生遂赴都。初壬辰西狩。上至臨津。問成渾家去此近遠。李弘老壬人也。妄指近岸小村曰。卽此是也。上曰。何不來見予。弘老曰。當是時。渠寧肯來謁。及先生自分朝赴行在。弘老又進讒曰。成渾此來。爲世子圖內禪也。上旣屢入其言。至是因先生待罪。下敎追擧變初事。辭旨峻厲。先生惶恐不敢辨。願伏重誅。上優容之。以參贊兼備局提調。所陳建多不從。倭賊窟據嶺南十餘郡。天兵亦罷老。不能進取。摠督顧養謙。方專管東事。移咨於我。欲姑聽倭和。以爲後圖。令我先上奏。廟堂自度計窮。欲曲聽顧咨。而群議攻和甚力。獨李公廷馣巡察湖南。建言宜姑許和以緩賊。柳相成龍當國。亦以爲然。約與先生同入對。上問顧咨從違。先生對曰。我國旣不能自辦戰守。制權在顧手。不宜強違其說。又言李廷馣有忠義大節。意在憂國。未可深罪。上盛怒。柳相噤嘿而退。於是三司交章斥和。意在先生。先生引咎乞骸歸。戊戌夏。疾篤。先令子文濬曰。吾得罪君父。心事未白死。目不瞑矣。衣以布衣。斂以紙衾。編茅覆棺。牛車歸葬足矣。六月六日。易簀于坡山書室。壽六十四。是歲某月日。葬于坡州向陽里酉向之原。先生沒後。群小仇嫉猶未已。鄭仁弘旣嗾其徒。上疏誣構。用事者因肆齮齕。遂追奪官職。儒林爲之氣塞。至今上踐阼。吳公允謙,李公廷龜啓陳先生被誣本末。上亦雅聞先生大儒。卽命復官。尋贈議政府左議政。諡曰文簡。諸生建書院于坡山。與聽松先生。共享俎豆。維生也後。未及與拔篲之役。幸從諸老先生。竊聞緖論。聽松之學。蓋出於靜庵。而先生早服庭訓。又嘗尊慕退陶而淑艾焉。其爲學。以考亭爲準則。講明踐履。交致其功。而於操存本源。尤慥慥焉。其平居言動及治家儀法。以至喪祭節文。悉遵小學家禮而行之。一本於誠敬。充養旣久。德器凝定。望之可知其有道君子也。少與栗谷定交。得麗澤之益。嘗論四端七情理氣先後之說。往復累千萬言。多有儒先所未發者。栗谷嘗稱曰。若論見解所到。吾差有寸長。操履敦確。吾所不及云。文章本源經術。明暢典雅。有文集若干卷行于世。先生蘊德丘園。本無當世志。及聲實騰聞。大被宣廟殊眷。待以不次之位。然歷計立朝日月。不滿一歲。一爲栗谷伸辨。遂爲群小所忌嫉。竟遭中傷。不得展布志業。道之將廢命也。不其然耶。卽身後褒崇。差可爲斯文增氣。庸何及於世道之交喪乎。夫人高靈申氏。郡守汝樑之女。生二男二女。男文泳早死。次文濬縣監。女長適別坐南宮蓂。次適府尹尹煌。側室子曰某。文濬三男。長櫟。次杙,次㮨。女子三人。南宮蓂有三男。尹煌有五男。外孫男女。甚繁不盡記。系以銘曰。
天胙斯文。竝生哲人。坡山石潭。德則有隣。擬宋朱,張。相輔以仁。道器之妙。性情之微。體用一源。二之則離。審問明辨。會通無疑。旣擴前祕。亦徹來蔽。隱見何心。惟義之比。亹亹先生。含章履貞。遭時孔艱。身困心亨。人莫我知。天不容欺。人勝而阨。天定乃復。亦旣復矣。不顯其光。百世以俟。遺文煒煌。道而終詘。善者曷勖。凡厥來學。鑑此鑱石。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2
《계곡집(谿谷集)》 해제(解題)
최석기(崔錫起)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국역 대본에 대하여
이 책은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 중 한 사람인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1638)의 시문집 《계곡집(谿谷集)》을 국역한 것이다. 이 책의 대본은 36권 18책의 목판본으로, 원집(原集) 34권, 만필(漫筆)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表題)는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이며, 판심(版心)은 ‘계곡집(谿谷集)’으로 되어 있다. 사주쌍변(四周雙邊)이 있고, 반곽(半郭)은 가로 21.9㎝×세로15.4㎝이며, 판심에 상하화문어미(上下花紋魚尾)가 있다. 또한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半葉)은 10행으로 되어 있으며, 행마다 19자로 되어 있다.
원집 첫머리에는 박미(朴瀰)ㆍ이명한(李明漢)ㆍ김상헌(金尙憲)ㆍ이식(李植)의 서문 및 저자의 자서(自敍)가 실려 있다. 권1부터 권34까지의 원집에는 사부(詞賦)ㆍ표(表)ㆍ전(箋)ㆍ장(狀)ㆍ교서(敎書)ㆍ책문(冊文)ㆍ잠(箴)ㆍ명(銘)ㆍ찬(贊)ㆍ잡저(雜著)ㆍ설(說)ㆍ서(序)ㆍ기(記)ㆍ제문(祭文)ㆍ묘지(墓誌)ㆍ묘갈(墓碣)ㆍ비명(碑銘)ㆍ행장(行狀)ㆍ소차(疏箚)ㆍ계사(啓辭)ㆍ주본(奏本)ㆍ자문(咨文)ㆍ격(檄)ㆍ정문(呈文)ㆍ첩(帖)ㆍ시(詩) 등이 문체별로 수록되어 있다. 시는 다시 오언 고시ㆍ칠언 고시ㆍ오언 율시ㆍ오언 배율ㆍ칠언 율시ㆍ칠언 배율ㆍ오언 절구ㆍ칠언 절구ㆍ육언(六言)ㆍ잡체(雜體)로 분류해 놓았다. 원집 뒤에 《계곡만필(谿谷漫筆)》 2권이 실려 있는데, 앞에 역시 저자의 자서(自敍)가 있다.
이 판본은 인조 21년(1643) 전라도 광주(光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이다. 이후 중간(重刊)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간본은 간행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므로 국역 대본으로 삼은 이 책에는 저자에 관한 행장ㆍ연보ㆍ제문ㆍ만장(挽章)ㆍ유사(遺事) 등의 부록 문자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자의 생애 및 교유 관계를 살펴볼 만한 자료가 적다. 지금까지 저자의 행장 및 묘갈명 병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황경원(黃景源)이 지은 묘지명 병서와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신도비명 병서가 남아 있어 저자의 생애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계곡은 약관의 나이 때부터 문필에 종사하여 타계하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고 저술을 일삼았다. 그는 32세 때 젊어서 지은 것들은 대부분 불태워 버리고, 잡고(雜稿)ㆍ시문(詩文) 등을 약간만 선별해 4권 분량의 문집을 편집한 뒤 《묵소고갑(黙所稿甲)》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을ㆍ병ㆍ정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저자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신의 저술을 정리해 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49세 때인 인조 13년(1635)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자신의 저술을 다시 편집하여 《계곡초고(谿谷草稿)》 26권으로 정리하고, 자서(自敍)를 지어 붙였다. 이 자서를 보면, 《묵소고갑》을 편집한 뒤 10여 년 동안 저술한 것 가운데 시는 1634년 이전의 것을, 산문은 1633년 이전의 것을 취하여 《묵소고갑》과 합해 새로 편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계곡초고》는 저자가 직접 자신의 저술을 교정하고 문체별로 분류해 만든 시문집으로, 사부(詞賦) 16수, 표(表)ㆍ전(箋) 23수, 교서(敎書) 10수, 책문(冊文) 3수, 잠(箴)ㆍ명(銘)ㆍ찬(贊) 13수, 잡저(雜著) 40수, 설(說) 9수, 서(序) 42수, 기(記) 15수, 제문(祭文) 38수, 비지(碑誌) 26수, 행장(行狀) 5수, 소차(疏箚) 50수, 계사(啓辭) 17수, 주자(奏咨) 30수, 격(檄) 1수, 정문(呈文) 2수, 첩(帖) 45수, 오언 고시 143수, 칠언 고시 41수, 오언 율시 421수, 오언 배율 44수, 칠언 율시 432수, 칠언 배율 7수, 오언 절구 50수, 칠언 절구 292수, 육언 10수, 잡체 44수 등 모두 1860여 수를 수록했다.
이 《계곡초고》를 만든 뒤, 저자는 병에 시달리다 3년 뒤인 1638년에 타계하였다. 이 3년 동안 지은 글들은 아들 장선징(張善澂)이 《계곡집》을 편찬할 때 ‘속고(續稿)’로 제목 아래에 별도 표기해 놓았다. 그런데 이 3년의 기간 중 청 나라의 침입으로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 매우 혼란스러웠다. 가족들은 강화로 피난하였는데, 그 와중에 정리하지 못한 저술 중 일부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전에 정리해 두었던 《계곡초고》도 일부 없어진 듯하다.
1638년 저자가 졸한 뒤, 아들 선징이 《계곡초고》를 수습하고 속고를 보충하여 완질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미(朴瀰)ㆍ이명한(李明漢)ㆍ김상헌(金尙憲)ㆍ이식(李植)의 서문을 붙이고,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각(李恪)의 도움을 받아 1643년 광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것이 초간본으로, 본 국역서의 대본이다. 이 판본에는 원집 뒤에 짤막한 간기(刊記)가 붙어 있는데, 이 책을 판각한 승려 11명의 소임과 이름이 적혀 있다.
계곡이 살아 있을 때 편집한 《계곡초고》의 자서(自敍)에 있는 문체별 편수와 사후에 간행한 《계곡집》 초간본의 문체별 편수를 비교해 보면, 《계곡초고》가 편집된 뒤에 지은 글의 편수를 대략 알 수 있다.
구분 계곡초고 계곡집 증감 비고
사부(詞賦) 16수 17수 +1
표(表)ㆍ전(箋) 23수 22수 -1 1수 일실
교서(敎書) 10수 9수 *批答 1수 0
책문(冊文) 3수 3수 0
잠(箴)ㆍ명(銘)ㆍ찬(贊) 13수 잠 3수, 명 9수, 찬 4수 +3
잡저(雜著) 40수 76수 +36
설(說) 9수 10수 +1
서(序) 42수 53수 +11
기(記) 15수 19수 +4
제문(祭文) 38수 42수 +4
비지(碑志) 26수 묘지(墓誌) 12수, 묘갈(墓碣) 16수,
비명(碑銘) 17수 +19
행장(行狀) 5수 7수 +2
소차(疏箚) 50수 79수 +29
계사(啓辭) 17수 10수 -7 7수 일실
주자(奏咨) 30수 주본(奏本) 5수, 자문(咨文) 26수 +1
격(檄) 1수 1수 0
정문(呈文) 2수 2수 0
첩(帖) 45수 47수 +2
오언 고시(五言古詩) 143수 162수 +19
칠언 고시(七言古詩) 41수 47수 +6
오언 율시(五言律詩) 421수 448수 +27
오언 배율(五言排律) 44수 37수 -7 7수 일실
칠언 율시(七言律詩) 432수 393수 -39 39수 일실
칠언 배율(七言排律) 7수 7수 0
오언 절구(五言絶句) 50수 42수 -8 8수 일실
칠언 절구(七言絶句) 292수 291수 -1 1수 일실
육언(六言) 10수 10수 0
잡체(雜體) 44수 44수 0
새창열기
《계곡초고》에는 숫자만 써 놓았을 뿐, ‘편(篇)’이나 ‘수(首)’를 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체별 숫자가 편명의 숫자인지 작품의 숫자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계곡집》의 숫자는 작품의 숫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해 보면 《계곡초고》의 숫자도 작품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식(李植)은 서문에서, 1635년에 만든 《계곡초고》의 작품 중 1636년 병자호란 때 열에 한둘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여기서 ‘열에 한둘이 없어졌다’는 말을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위 도표에서 ‘-’로 표기된 숫자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로 표기된 것은 《계곡초고》가 만들어진 뒤의 속고(續稿)로, 《계곡집》에는 제목 밑에 문체별로 ‘속고(續稿)’ 또는 ‘이하 속고(以下續稿)’라고 표기해 놓았다.
2. 계곡(谿谷)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문학
1) 생애
저자 장유(張維)의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ㆍ묵소(黙所)로,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며, 봉호(封號)는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이다. 계곡은 선조 20년(1587) 12월 25일 부친의 임소(任所)인 평안도 선천부(宣川府) 관아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이조 판서ㆍ형조 판서 등을 지낸 장운익(張雲翼 1561~1599)이고, 모친은 밀양 박씨(密陽朴氏)로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지낸 박숭원(朴崇元 1532~1592)의 딸이다.
계곡은 7세 때부터 부친 슬하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였는데, 특히 암기를 잘하여 《시경(詩經)》ㆍ《서경(書經)》의 정문(正文)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13세 때인 1599년 부친상을 당했는데, 성인(成人)처럼 상례를 치렀다. 15세 때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의 문하에 나아가 《한서(漢書)》ㆍ《사기(史記)》를 배우고, 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나아가 예(禮)를 배웠다. 16세 때에는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문하에 나아가 한유(韓愈)의 글을 배웠는데, 오래지 않아 고문(古文)의 구조를 깨달았다. 그리고 《초사(楚辭)》ㆍ《문선(文選)》등을 읽었으며, 사부(詞賦)를 배웠다.
계곡은 19세 때 한성시(漢城試)에 응시하여 장원하였고, 20세 때에는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이해에 《음부경해(陰符經解)》를 지었는데, 이 책은 《음부경》의 어구(語句)마다 주해를 붙인 것이다. 문집에 실린 음부경해서(陰符經解序)를 보건대, 도가적 시각으로 주해한 전대의 해석을 탐탁지 않게 여겨, 유학적 관점으로 새로 해석한 것인 듯하다. 《계곡만필》에 의하면, 계곡은 이 시기에 송대의 성리서를 두루 읽고 있었으니, 한창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빠져들던 시기에 저술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계곡은 23세 때인 1609년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응시하여 을과(乙科)로 합격하였다. 이해 12월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되어 벼슬길에 나갔다. 이 시기 그는 관각과시(館閣課試)에서도 고등으로 뽑혀 문장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진부하고 쓸데없는 말을 쓰지 않고, 당 나라 때 고문운동(古文運動)을 일으킨 한유(韓愈)ㆍ유종원(柳宗元)의 법도를 따랐다. 이후 시강원 설서, 승정원 주서 등을 거쳐 25세 때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26세 때인 1612년에는 김직재(金直哉)의 옥사에 처남 황상(黃裳) 일가가 연루됨으로써 그도 연좌되어 파직당하였다. 이 시기는 북인(北人)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몇 차례의 옥사를 일으켜 서인(西人)들이 조정에서 밀려나 있던 때이다. 이후 그는 12년간 경기도 안산(安山)에 은거하여 독서와 저술로 나날을 보냈다. 이 시기가 그에게는 풍부한 독서를 통해 정신적 깊이를 더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장력을 튼튼하게 연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623년 3월 인조반정에 참가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다. 예문관 대교, 이조 좌랑 등을 거쳐 이조 정랑으로 승진되었으며, 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인조가 공주(公州)로 파천할 적에 왕을 호종하여, 그 공으로 신풍군(新豐君)에 봉해졌다. 이후 대사간, 대사성, 부제학, 대사헌 등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다. 또 인조 5년(1627)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에는 왕을 강화로 호종(扈從)하였고, 환도(還都)한 뒤에 이조 판서로 발탁되었다. 42세 때인 1628년에는 이조 판서로 홍문관ㆍ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였다. 1629년에는 대제학으로 나만갑(羅萬甲)의 유배를 반대하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서,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잇단 권유로 이듬해 다시 형조 판서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1631년에는 딸이 봉림대군(鳳林大君)과 가례(嘉禮)를 치렀다.
49세 때인 1635년에는 병으로 예조 판서를 사직하고 요양하면서, 자신의 저술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계곡초고》26권을 만들었다. 이듬해 다시 공조 판서로 나아갔다.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하였고,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講和)를 주장하였다. 1637년 1월 모친상을 당하였다. 최명길 등이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 계곡을 기복(起復)시켜야 한다고 아뢰어, 4월에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계곡은 모친상을 마치게 해 달라고 18차례나 애절하게 상소하여 끝내 인조의 윤허를 받았다. 이해 11월 인조가 장유ㆍ이경전(李慶全)ㆍ조희일(趙希逸)ㆍ이경석(李景奭)에게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짓게 하였는데, 청 나라 범문정(范文程) 등이 이경석의 글을 택하였다.
계곡은 1637년 모친상을 당한 뒤로 신병이 더욱 심해져, 이듬해 3월 17일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해 6월 안산(安山) 월곡리(月谷里)에 장사 지냈고, 1655년(효종 6) 5월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충(文忠)’이란 시호가 내렸다.
2) 학문 성향
계곡의 학문적 특성은 한 마디로 박학다식함과 개방성에 있다. 《계곡집》의 서문을 쓴 박미(朴瀰)ㆍ이명한(李明漢) 등이 계곡의 학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한결같이 경전과 성리서는 물론이고 제자백가 및 도가ㆍ불가ㆍ의복(醫卜)ㆍ풍수ㆍ천문ㆍ지리 등에 두루 통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계곡은 젊어서부터 폭넓은 독서를 했고, 그래서 그의 사상은 성리학적 사유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박학다식함과 개방적 성향은 그의 사유를 정주학적(程朱學的) 틀 속에 묶어 둘 수 없게 하였다. 그는 16세기 후반 퇴계(退溪)ㆍ율곡(栗谷) 이후로 학문이 정주학 일변도로 획일화되어 교조적 성향을 띄게 된 것을 황무지에 비유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려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힌 뒤에야 오곡(五穀)과 피[稊稗]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에서 무엇이 오곡이 되고 무엇이 피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 그의 주장은 중국처럼 정주학ㆍ육왕학(陸王學)ㆍ선학(禪學)ㆍ단학(丹學) 등 모든 학문과 사상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나중에 그 진위를 가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그의 개방적 성향은 틀에 갇힌 사고를 탈피하여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 사유를 낳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조종조(祖宗朝)의 법이라는 점만 내세우며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생각을 반대하고, 시세(時勢)와 인심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를 희구하였다. 그가 청 나라의 침입 때 최명길 등과 함께 화의(和議)를 주장한 것도 이런 실리를 추구하고 변화를 인식하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좁은 소견만 믿고 사물의 변화와 역사의 진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명분론자들의 고루하고 국한된 사고를 우물 안의 개구리와 여름철 벌레에 비유하여 비판하였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장유는 당시 절대시되던 주자의 학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그 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설을 내세웠다. 예컨대, 그는 《중용(中庸)》첫 장의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敎)’의 ‘수(修)’를 ‘품절지(品節之)’로 ‘교(敎)’를 ‘예악형정지속(禮樂刑政之屬)’으로 보는 주자의 설에 반대하고, ‘수(修)’를 ‘수명(修明)’ㆍ‘수치(修治)’로, ‘교(敎)’를 ‘계구(戒懼)’ㆍ‘신독(愼獨)’으로 보았다. 또한 주자의 《중용장구(中庸章句)》제5장은 ‘자왈도기불행의부(子曰道其不行矣夫)’ 8자가 1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계곡은 이를 제4장에 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였는데, 다산(茶山)의 《중용자잠(中庸自箴)》에도 계곡의 설과 같이 제5장을 제4장에 합해 놓고 있다. 그리고 계곡은 주자의 《시집전(詩集傳)》에 대해서도 주자가 국풍(國風)의 시를 음시(淫詩)로 보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계곡은 선유의 정설(定說)이라 하여,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고증적인 태도로 접근하여 자신의 설을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학문 태도는 당시 학자들이 이단(異端)으로 지목하던 양명학(陽明學)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였다. 일부 학자들이 계곡의 학문 성향을 전적으로 양명학인 것인 양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 시대 양명학을 학문의 본령으로 한 학자는 정제두(鄭齊斗)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계곡 등은 개방적인 학문 자세로 양명학까지도 자신의 학문 영역 안에 끌어들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계곡의 학문은 정주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양명학ㆍ도가ㆍ불가 등의 설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계곡의 학문에 대해, 정치적ㆍ학문적으로 노선을 같이 했던 송시열(宋時烈)ㆍ황경원(黃景源) 등은 계곡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미봉식으로 변론하며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서인이면서도 주자학적 사유 체계에 철저했던 사람들, 예컨대 이식(李植)ㆍ정홍명(鄭弘溟)ㆍ박세채(朴世采) 등은 계곡이 이단에 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동시대 계곡과 문명(文名)을 나란히 했던 이식은 그의 문집 잡저(雜著)에서 “장공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일생 동안 지조를 지키고 살았다. 그의 학문은 박학하면서도 요약되니, 언뜻 보면 누가 그를 대유(大儒)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의 논의는 전적으로 육왕(陸王)을 위주로 하여, 선유들이 해석해 놓은 정설에 구절마다 이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교의 학문이 비록 이단이기는 하지만 몸과 마음에 유익함이 있다면 공격해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는 바로 내가 말하는 ‘배우지 않은 사람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비록 훌륭하지만, 그의 설은 물리칠 만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이런 이식의 언급은 기실 당색이 같지 않다면, 사문난적으로 몰아갈 만큼 비판적인 발언이다. 계곡의 학문에 대해, 양명학자로 보는 시각이나 노장 사상에 깊이 빠져 있던 학자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계곡은, 조선 성리학인 정주학적 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틀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양명학ㆍ노장 사상ㆍ불교 사상 등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학문 자세를 가진 인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3) 문학 성향
계곡을 거론하면, 누구든지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즉 그는 조선 시대 뛰어난 문학가로, 시보다도 산문에 장점이 있던 문장가였다. 따라서 우리는 계곡을 논하면서 그의 문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계곡의 문학적 특성을 그의 문학관 내지 문학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한말 김택영(金澤榮)은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 가운데 장유ㆍ이식만을 여한구가(麗韓九家)에 넣고, 조선 시대 문장이 누추함을 벗고 전아한 데로 나아간 것이 이 두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계곡집》의 서문을 쓴 김상헌(金尙憲)은 우리나라 역대 문장가로 최치원(崔致遠)ㆍ이색(李穡)ㆍ김종직(金宗直)ㆍ최립(崔岦)ㆍ신흠(申欽)ㆍ이정귀(李廷龜)를 들면서, 그 뒤를 이어 계곡이 나왔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그는 계곡의 문장을 이색의 문장과 비교해, 그 규모는 이색만큼 크지는 못하지만 정치(精緻)함은 그보다 나으며, 문채(文彩)는 이색보다 약간 뒤지지만 이치(理致)를 드러낸 점은 더 치밀하다고 평하였다.
김상헌이 평한 것처럼, 계곡의 산문은 정밀하고 치밀하게 논지를 전개하였고 문채보다는 이치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계곡은 용졸당기(用拙堂記)에서 “문채[文]는 바탕[質]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여, 문채보다는 바탕, 즉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는 팔곡집서(八谷集序)에서 진한(秦漢) 이전의 박실(朴實)한 문장과 위진(魏晉) 이후의 부화(浮華)한 문장에 대해 논하며, 후대로 내려올수록 근본을 무시하고 겉만 화려하게 수식하는 문장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진한 이전의 고문이 박실한 이유를 ‘옛날 사람들은 근본을 돈독히 하고 실질을 숭상하여[敦本尙實] 마음속에서 얻어진 것이 발해 문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언표를 통해서, 우리는 계곡의 문학관이 부화한 수식이나 기교를 일삼는 것보다는 근본을 돈독히 하고 내실을 숭상하는 ‘돈본상실(敦本尙實)’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본을 돈독히 한다[敦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계곡은 명 나라 때 의고주의(擬古主義) 문학의 폐단이 근본을 충실히 하지 않고 말단만을 흉내 내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런 풍조는 조선에도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팔곡집서에서 “옛날 문운이 성대하던 때의 문사를 다스리던 선비들은 모두 경술(經術)에 근원하여 이취(理趣)를 주로 삼았다.”고 하면서, 기이한 것만 일삼으려는 당시의 문풍을 비판하였다. 또한 논평자들의 말을 보면, 계곡의 문장은 경술에 근본하였다는 말이 한결같이 나온다. 예컨대, 이정귀(李廷龜)는 경연에서 “장모(張某)의 문장은 경학에서 얻어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명한은 《계곡집》서문에서 “공의 문장은 육경에 근본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식도 서문에서 경전에만 근본하면 통속적인 데 가깝고 문사만을 일삼으면 배우와 유사하게 되는데 이 양자를 하나로 융합시킨 사람이 계곡이라 하였다.
이런 언급을 종합해 볼 때, 계곡이 주장한 ‘돈본’은 경학 또는 경술에 근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학이 문학보다 우위에 있던 중세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에 있어, 근본을 돈독히 하는 문제는 곧 도(道)와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은 그 속에 도를 담아야 하고, 도를 담지 않으면 겉만 화려하게 수식한 부화한 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런 문학관은 ‘문은 도를 꿰는 그릇이다[文貫道之器]’라는 재도적(載道的) 문학관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근본을 돈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문장에서 내실(內實)을 숭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곡은 답인논문(答人論文)에서, 사(辭)를 문장의 화(華)로 이(理)를 문장의 실(實)로 보고, 성현의 문장처럼 화와 실이 겸비된 문장이 극진한 것이지만, 화만 있고 실이 없기보다는 차라리 실하면서 화하지 않은 송대 선유들의 문장과 같은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계곡은 화려한 수식만 일삼은 문장을 배격하고, 이치가 담긴 내실 있는 문장을 선호한 것이다. 문장에서의 화와 실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신라 시대 원효(元曉)로부터 비롯된 문학의 원론적인 논제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을 따진다면,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조이다.
계곡은 화와 실을 겸비한 선진 고문(先秦古文)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다 갖출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내실을 더 중시하는 문학관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문장의 생명력은 내실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문장에는 저절로 정해진 값이 있다.……천추에 썩지 않는 것은 그 실(實)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며, 또 “도를 밝히는 것은 나에게 있고, 알아주는 것은 남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실이 있으면, 아무리 호사스런 것도 영화가 되기에 부족하고, 아무리 더러운 것도 욕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계곡은 문장의 실(實)을 이(理)로 보았는데, 이 이(理)를 그는 ‘이치(理致)’ 또는 ‘이취(理趣)’라는 말로 구체화시켜 쓰고 있다. 따라서 이 이(理)는 문장의 조리(條理)나 논리(論理)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담긴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생이나 사물에 대한 심오한 이치를 뜻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돈본상실의 문학관은 ‘이(理)를 위주로 하는 문론(文論)’으로 전개된다. 계곡은 “문장은 이(理)를 위주로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이치가 빼어나면 문장은 저절로 아름답게 되지만, 이치가 어긋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일지라도 군자는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위주로 하는 문론’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함께 언급하였다. 첫째, 문사(文詞)는 간략하면서도 의미는 극진한 문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케케묵은 말을 인용하여 수식하는 것을 반대하고 개성 있는 창작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생경하거나 난삽한 문장보다는 평이한 문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이를 위주로 하는 문론’은 산문뿐만이 아니라, 운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계곡은 홍성민(洪聖民)의 시를 평하면서, 성색(聲色)으로 공교로움을 삼지 않고 이치를 주로 하여 의미를 창달하는 데서 그치고자 하였다고 논하였다. 또한 계곡의 문장에 대해, 《인조실록》에서 사관은 ‘기완이이도(氣完而理到)’라 하였고, 이정귀(李廷龜)는 ‘사리겸비(詞理兼備)’라 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은 ‘이승위정(理勝爲正)’이라 하였고, 김창협(金昌協)은 ‘전칙이치(典則理致)’라 하였다. 이런 평어를 종합해 볼 때, 계곡의 문학론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것이 ‘이치를 위주로 하는 문론’이라 하겠다.
다음은 그의 시론(詩論)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계곡은 어려서부터 고문만을 좋아하고 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작품을 품평한 말을 보면, 시에 대해서도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사부(詞賦) 6, 7편은 이규보(李奎報)의 것과 비견되고, 작법에 맞는 고문은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것보다 나으며, 시도 기상이 체(體)에 충만하고 시어는 의사를 창달하여 몇몇 소가(小家)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산문 문학론으로 ‘이치를 위주로 하는 문론’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시 문학론에 있어서도 나름의 독창적인 시론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계곡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진단하면서, 공언(空言)과 유담(游談)만을 일삼는 위선자들이 많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학문이든 문학이든 이런 위선적인 것 즉 허(虛)와 위(僞)를 물리치고, 실(實)과 진(眞)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유는 명분론적 틀에 갇히지 않고 이 실과 진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것이든 기꺼이 수용하려 하였다.
이런 사유가 시문학으로 표출된 것이 그의 시론인 천기론(天機論)이다. 조선 전기에는 문장은 도를 실어야 한다는 재도적 문학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도를 위주로 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시도 도덕적 심성 수양을 통해 우러나오는 성정지정(性情之正)에 근본해야 한다는 성정론(性情論)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 이런 도덕주의적 문학관이 오히려 인간의 진솔한 정감을 저해한다는 반성이 일기 시작하여, 허균(許筠) 같은 사람은 인간의 감정이 도덕적 예교(禮敎)에 예속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정지정으로 인식되던 성정론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되어, 이수광(李睟光) 같은 이는 ‘도덕에 근본한 성정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우러나오는 순수하고 진솔한 정취’를 성정(性情)으로 보았다. 이런 논의는 후대 김창협(金昌協)에 의해 성정을 ‘성정지진(性情之眞)’으로 정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런 문학적 풍토 속에서 계곡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시론이 천기론이다. 천기(天機)라는 말은 ‘일체의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한 무위자연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흥기되는 진정(眞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계곡은 와명부(蛙鳴賦)에서 “형체를 받고 기를 품부받은 것들은 모두 천기가 저절로 울려 나와 각기 자기의 품성에 따라 자기의 정감을 펴는 것이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보고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타자를 위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개구리의 울음 소리는 품성 그대로에서 자연스럽게 울려나오는 진정이니, 그것이 곧 천기이다. 이는 인교(人巧)를 반대하고 천교(天巧)를 중시하며, 인공(人工)을 반대하고 천성(天成)을 중시하는 문예 의식이다.
계곡은 “시는 천기가 울린 것인지라, 소리도 화려하고 색깔도 윤택하며 청(淸)ㆍ탁(濁)ㆍ아(雅)ㆍ속(俗)이 모두 자연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이 ‘자연에서 나온다[出乎自然]’는 말이다. 이는 인위적인 요소를 일체 배제한 자연 상태에서 표출되어 나오는 순수하고 진정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곡이 내세운 천기론의 미의식이다.
또한 계곡은 시를 지을 때, 첨예한 기교를 부리지 말 것[毋尖巧], 껄끄럽고 난삽하게 하지 말 것[毋滯澁], 표절하지 말 것[毋剽竊], 모방하지 말 것[毋摸擬], 의심스런 일이나 편벽된 말을 쓰지 말 것[毋使疑事僻語] 등 오계(五戒)를 늘 염두에 두었다. 이런 오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虛)와 위(僞)를 물리치고 실(實)과 진(眞)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그의 문예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계곡은 이와 관련하여 “‘시언지(詩言志)’라고 하는 이유는 반드시 진정실경(眞情實境)을 말한 뒤에야 볼만하기 때문이다. 실사(實事)가 없는데도 억지로 허어(虛語)를 만든다면, 아무리 공교롭게 하더라도 일컬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즉 천기가 발로된 진정의 세계는 실사(實事)가 없는 허경(虛境)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계곡이 내세운 천기론의 또 다른 미의식 ‘진정실경(眞情實境)’을 만나게 된다.
이런 계곡의 천기론은 후대 홍세태(洪世泰 1653~1725)ㆍ홍양호(洪良浩 1724~1802)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에서 천기론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논의한 것은 계곡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문집의 구성과 내용
본 국역서의 대본인 《계곡집》은 36권 18책으로 원집 34권, 만필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집 권두에 박미ㆍ이명한ㆍ김상헌ㆍ이식의 서문 및 저자의 자서가 실려 있고, 문집 전체의 목록은 붙어 있지 않다.
권1에는 사부(詞賦) 17수가 수록되어 있다. 위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곡초고》에는 사부가 16수인데 《계곡집》에 와서 1수가 늘어 17수가 되었다. 이 1수는 권1 맨 뒤에 실린 조령부(鳥嶺賦)로, 이 부의 뒤에 후지(後識)가 붙어 있어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후지에 의하면, 이 부는 저자 나이 20세 때 장인 김상용(金尙容)을 뵈러 임소(任所)인 상주(尙州)로 가다가 조령(鳥嶺)을 넘으며 지은 것이다. 계곡은 1635년 《계곡초고》를 편집할 때, 이 부를 불태워 버렸다. 그 뒤 1636년 아들 선징이 베껴 둔 사본을 우연히 발견하고서 수정해 두었다가 《계곡집》을 만들 때 첨가해 넣은 것이다. 권1에 실린 사부에서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의 현상과 재해,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읊은 글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 이 가운데에는 과작(課作)도 4수나 들어 있다. 계곡은 자신의 사부 가운데 6, 7편은 이규보의 것에 비견될 수 있다고 자부하였는데, 속천문(續天問)ㆍ추림부(秋霖賦)ㆍ설부(雪賦)ㆍ뇌부(雷賦)ㆍ와명부(蛙鳴賦)ㆍ조기자부(弔箕子賦) 등은 모두 빼어난 작품으로 여겨진다.
권2에는 표(表)ㆍ전(箋)ㆍ장(狀)이 23수, 교서(敎書)ㆍ비답(批答)이 10수, 책문(冊文)이 3수, 잠(箴)ㆍ명(銘)ㆍ찬(贊)이 16수 수록되어 있다. 오랫동안 문형(文衡)을 지낸 인물인 만큼 사은표(謝恩表)ㆍ방물표(方物表)ㆍ하전(賀箋)ㆍ사전(謝箋)ㆍ교서ㆍ책문 등이 많이 실려 있다. 잠ㆍ명ㆍ찬은 자신의 호 묵소(黙所)ㆍ지리자(支離子)와 연관시킨 삶의 자세이거나 책ㆍ거문고 등을 통한 삶의 지취를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충정당명(忠正堂銘)ㆍ삼화찬(三畫贊)ㆍ지리자자찬(支離子自贊) 등 3수는 말년에 지은 속고다.
권3에 실린 잡저(雜著)는 첫머리에 ‘76수’라고 부기해 놓았는데, 이는 한 편명 아래 여러 수를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즉 우언(寓言) 2수, 방언(放言) 4수, 만기(漫記) 2수, 잡기(雜記) 11수, 책문(策問) 8수, 의연연주(擬演連珠) 20수를 모두 합해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35편이고, 작품 수는 76수이다. 이 가운데 서송구봉현승편후(書宋龜峯玄繩編後)ㆍ서설씨가전후(書偰氏家傳後)ㆍ선대부목천제영발(先大夫木川題詠跋)ㆍ중각백사집발(重刻白沙集跋)ㆍ임술동경계첩발(壬戌同庚稧帖跋)ㆍ인평대군신제상량문(麟坪大君新第上樑文)ㆍ의연연주는 속고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속고로 표기된 편수를 모두 합해도 26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 잡저는 《계곡초고》보다 36수나 첨가되었는데 속고로 표기된 것이 26수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0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잡저에 실린 글들에는 저자의 학설이나 주장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많다. 전례사의(典禮私議)ㆍ독정우복의례차(讀鄭愚伏議禮箚)ㆍ답사계선생(答沙溪先生) 등은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상례와 복제(服制)를 논한 것이고, 위인후위조후변(爲人後爲祖後辯)은 원종(元宗)의 추숭(追崇) 문제를 논한 것이다. 이런 글들은 왕실의 예에 관한 논변이므로 후대 예송 논쟁이 일어나기 전의 서인계 예학(禮學)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설맹장논변(設孟莊論辯)은 맹자와 장자가 서로 만나 도를 논하는 것을 허구적으로 설정한 글이며, 시능궁인변(詩能窮人辯)은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변론한 내용으로 시문학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글이며, 빙호선생전(氷壺先生傳)은 얼음 항아리를 의인화한 가전(假傳)이다. 이런 작품들은 문학적으로 주목해 볼만하다. 이 외에도 잡저에는 발문과 후지 등이 다수 들어 있어 문학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
권4에는 설(說) 1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화당설(化堂說)만이 속고로 표기되어 있다. 필설(筆說)은 족제비털에 개털을 섞어서 만든 붓을 두고 개탄하면서 당시의 사대부들을 빗대 비판한 글이며, 해구불하설(海鷗不下說)은 《열자(列子)》에 나오는 일화를 인용해 욕심 없이 담박하게 살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낸 글이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은 정자(程子), 주자(朱子), 나정암(羅整庵)이 인심과 도심에 대해 논한 설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려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분하게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저자의 개방적인 학문 성향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권5에서 권7까지에는 서(序) 53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뒤에 실린 남창잡고서(南窓雜稿序) 이하 11수는 속고이다. 이 가운데 송별하면서 지어 준 송서(送序)가 14수, 유배지로 보내는 서문이 1수, 회갑 등 수연(壽宴)을 경하하며 써 준 서문이 2수, 묵소고갑자서(黙所稿甲自序) 등 자신의 책에 쓴 자서가 4수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시문집 및 언해(諺解)ㆍ주해(註解)ㆍ가승(家乘)ㆍ지도ㆍ첩(帖) 등에 써 준 서문이다. 시문집의 서문 중에는 당대 문명이 높던 신흠(申欽)ㆍ최립(崔岦)ㆍ정철(鄭澈)ㆍ황정욱(黃廷彧)ㆍ홍성민(洪聖民)ㆍ임숙영(任叔英)ㆍ이정귀(李廷龜) 등의 문집에 쓴 서문이 다수 들어 있어 문학적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권8에는 기(記) 19수가 실려 있는데, 뒤에 실린 전생서대청중건기(典牲署大廳重建記) 이하 4수는 속고이다. 이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의인화해서 쓴 신명사기(神明舍記)와 신기루를 소재로 하여 쓴 신루기(蜃樓記)는 문학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다. 나머지는 모두 당(堂)이나 누각(樓閣) 등의 건물에 대한 기문이다. 권9에는 제문(祭文) 42수가 실려 있는데, 뒤에 실린 제월사이상공문(祭月沙李相公文) 이하 4수는 속고이다. 이 제문에는 기우제문(祈雨祭文)ㆍ기청제문(祈晴祭文)ㆍ사제문(賜祭文) 등 공적으로 쓴 제문과 윤근수(尹根壽)ㆍ이항복(李恒福)ㆍ정엽(鄭曄)ㆍ이정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제문이 함께 들어 있다.
권10에서 권14까지는 묘지(墓誌)ㆍ묘갈(墓碣)ㆍ비명(碑銘) 등 비지 문자(碑誌文字) 45수가 실려 있는데, 묘지는 12수 중 6수가 속고이고, 묘갈은 16수 중 6수가 속고이고, 비명은 17수 중 8수가 속고이다. 전체적으로 45수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수가 속고이다. 이 가운데에는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지(陵誌)를 비롯하여, 성혼(成渾)ㆍ김천일(金千鎰)ㆍ김장생(金長生) 등 전대 유명 인사들의 비지 문자가 다수 들어 있다.
권15부터 권16까지에는 행장(行狀) 7수가 실려 있는데, 뒤의 2수는 속고이다. 이 행장도 이항복ㆍ이산보(李山甫)ㆍ이수광ㆍ이정귀 등 당대 이름난 재상의 행장이 대부분이다. 권17부터 권20까지에는 소차(疏箚) 78수가 실려 있는데, 권20에 실린 28수는 모두 속고이다. 권21에는 계사(啓辭) 10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런 상소문에는 계곡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진전례문답차(進典禮問答箚)에는 당시 원종(元宗) 추숭(追崇)과 관련된 예학(禮學)에 관한 저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권22부터 권24까지는 주본(奏本) 5수, 자문(咨文) 26수, 격(檄) 1수, 정문(呈文) 2수, 첩(帖) 47수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첩 2수만 속고이다. 계곡은 중국과의 외교 문서인 자문을 잘 지었는데, 명 나라의 도독(都督) 모문룡(毛文龍)ㆍ황룡(黃龍) 등에게 보낸 자문ㆍ정문 등이 많다. 이는 대체로 저자가 대제학으로 있던 1627년부터 1632년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다.
권25부터 권34까지는 모두 시를 수록했는데, 오언 고시ㆍ칠언 고시ㆍ오언 율시ㆍ오언 배율ㆍ칠언 율시ㆍ칠언 배율ㆍ오언 절구ㆍ칠언 절구ㆍ육언(六言)ㆍ잡체(雜體)로 분류하여 1481수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190여 수가 속고이다. 계곡의 시는 총 1481수로, 그 가운데 고시가 209수, 율시가 841수, 절구가 333수, 배율이 44수, 육언이 10수, 잡체가 44수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고시보다는 율시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잡체시를 44수나 남겼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하다. 잡체시는 이 시기 권필(權韠)ㆍ조위한(趙緯韓) 등에 의해 지어진 한시의 희작화(戱作化)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문사(文辭)에 능한 사람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시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계곡집》과 그 저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계곡은 한문사대가로 알려져 흔히 문장가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는 조선 중기의 학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이며, 정치적으로도 인조반정에 참여하는 등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이제 《계곡집》이 완역되었으니, 앞으로 문학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산문 문학론과 시 문학론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작품 세계에 대한 정치한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다각도에서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성향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구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17세기 조선 사상계가 정주학 위주로 획일화된 길을 걷던 시기에 이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정주학적 사유 체계 속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고, 양명학ㆍ도가ㆍ불가 등 다양한 사상을 두루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사고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계곡처럼 학문의 개방성을 보인 경우는, 조선 성리학이 꽃피어 나던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서경덕(徐敬德)ㆍ조식(曺植) 등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퇴계ㆍ율곡 이후로는 조선 성리학계가 정주학으로 경도되어 획일화되었는데, 계곡은 그런 경직된 학문 풍토 속에서 다양성ㆍ개방성을 외친 학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곡의 정신 세계는 우리 학술사 내지 정신사에서 그 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崔昌久, 谿谷 張維의 文論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83.
呂廷淑, 谿谷 張維 思想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
朴英鎬, 谿谷 문학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4.
崔錫起, 谿谷 張維의 詩論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6.
魚秀定, 谿谷 張維의 문학론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6.
安東鮮, 谿谷論,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6.
崔錫起, 谿谷 張維의 學問精神과 文論, 《한국한문학연구》제9, 10합집, 1987.
鄭然峰, 谿谷 張維의 문학론과 양명학관, 고려대 《어문논집》, 1987.
李貴浩, 谿谷 張維의 문학론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8.
鄭然峰, 張維의 詩文學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池斗煥, 谿谷 張維의 생애와 사상, 《태동고전연구》제7집, 1991.
金南馨, 谿谷 張維의 「潛窩記」에 대하여, 《한문학연구》제8집, 1992.
李京男, 谿谷의 思想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2.
金容範, 谿谷 張維의 철학사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2.
金靖玉, 谿谷 張維의 辭賦文學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99.
金眩珠, 谿谷漫筆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1.
1994년 10월 20일
ⓒ 한국고전번역원 | 최석기(崔錫起) |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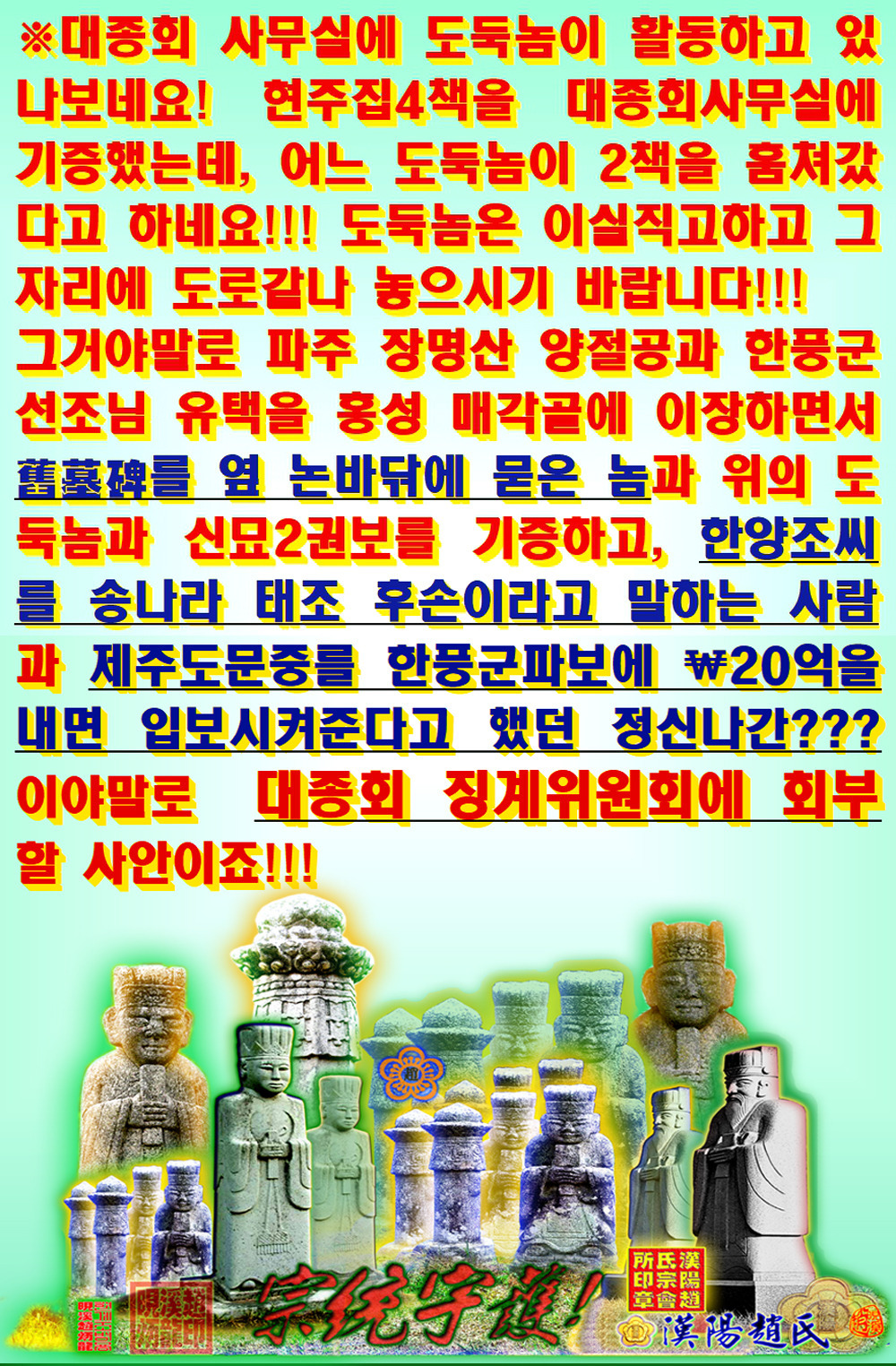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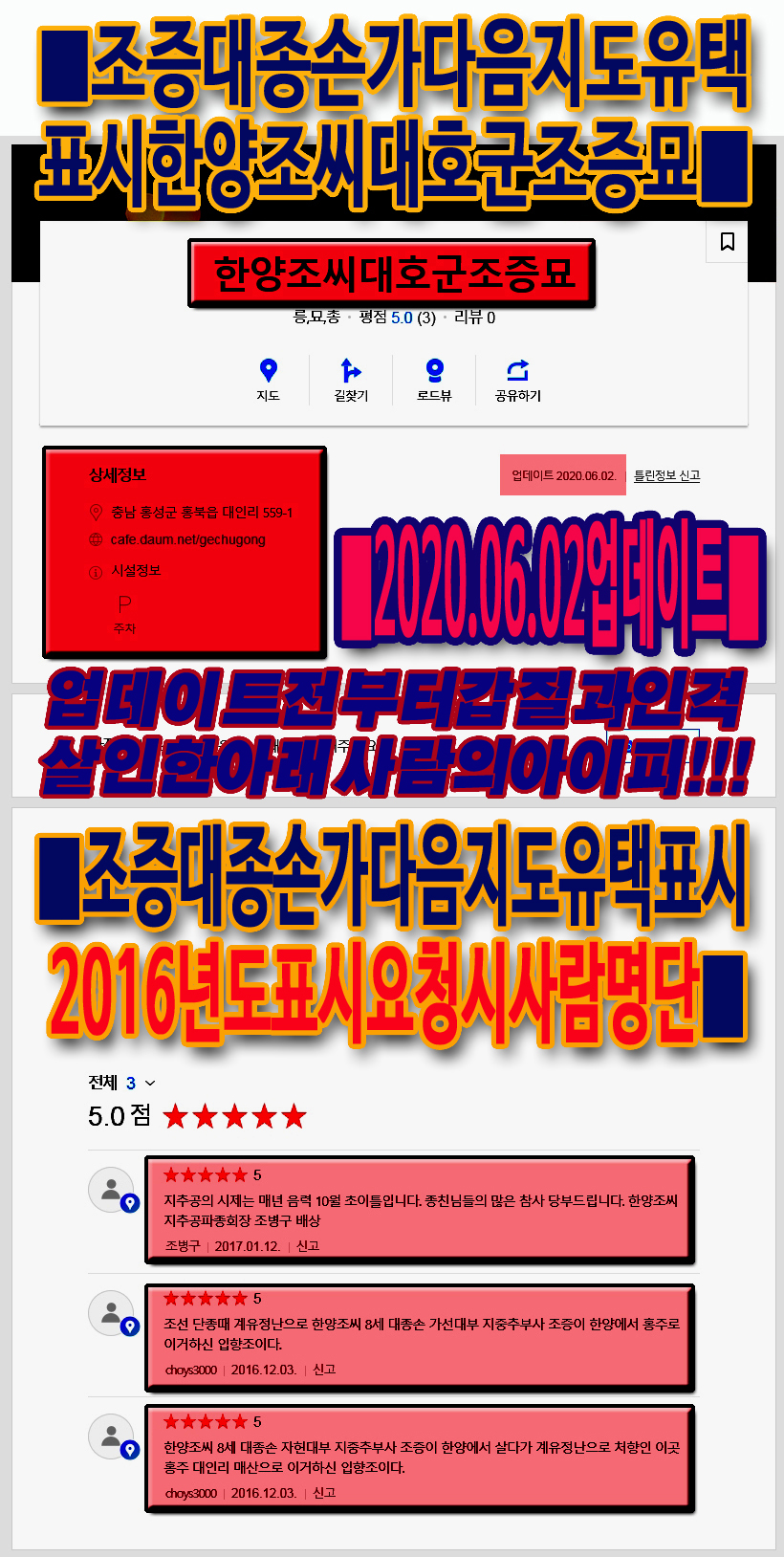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