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맑은 물에서 자라는 토하]


이 지역이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 무공해 특산품 토하(土蝦·민물새우)를 생산했던 것도 한 몫 차지한다. 토하는 맑은 물에서만 사는 새우로 조선시대 궁중이나, 해방 후 경무대에 진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약 때문에 논이나 도랑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주민들은 인공사료를 주고 토하를 키울 수도 있었지만 ‘옴천 토하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며 계곡 상류에 둑을 쌓고 웅덩이를 만들어 토하를 키웠다.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싹 트인 것이다. 이 자연친화적인 방법은 일손이 많이 가지만 주민들은 옛 방식을 고집했다. 현재 옴천토하는 매년 1리터들이 용기 400여개를 출하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인기이다.
무공해 산간계곡에서 자연 서식하는 민물새우 옴천 토하는 맛이 좋은 별미식품이다. 토하는 민물 새우로서 물의 오염에 대하여는 극히 약한 생물로 산란기는 4월부터 8월까지이며 적당한 수온은 25℃ 정도이고, 어미새우의 몸길이는 18-40mm 정도이며 1세대는 보통 1년 3개월이다. 옴천 지역 중에서도 물이 맑은 월곡리산 토하젓이 진품이라 전하며, 1947년 농지개혁 이전 소작인들이 추수감사시 경작권을 잇기 위해 이 토하젓을 상납했다고 한다.
그동안 농약사용 등 수질악화로 소멸위기에 있던 것을 지난 1991년부터 강진군이 산간계곡에 자연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라질 위기를 모면했다. 매년 가을추수가 끝나면 토하를 수확, 갖은 양념을 곁들인 젓갈로 가공 판매해 농가에 고소득을 가져다주는 효자 품목이지만 잡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제철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다. 수렁논과 폐경지 등 1급수지역 3.3ha의 면적에서 600리터의 토하를 잡아 연간 9천여만 원의 고소득으로 논농사의 3배에 이르는 알찬 대체 농업이 된 옴천 토하는 지난 1993년 전라남도 1읍면 1특품사업 가공부분 특품왕에 선발되었고 ‘옴천 토하젓’과 ‘청자골 토하젓’으로 판매되고 있다. 토하 특유의 흙 향기와 깔끔한 맛이 일품인 옴천 토하젓은 천일염에 3개월간 숙성시켜 천연재료인 찰밥과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반죽으로 저온에서 숙성시킨 완전한 자연식품이다. 숙성시기에 토하 껍질에서 생성되는 항생, 항암, DHA성분 등이 정장제 효과와 식욕증진은 물론 중금속 흡착배출과 면역력 강화로 질병 및 성인병 예방, 종기치료 등의 민간요법으로도 활용되는 고단백 천연 발효식품이다.


진짜배기 토하젓은 새우의 몸체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야 싱싱한 향내가 난다. 토하젓을 집어 씹어보면 몸이 탁탁 터지면서 향긋한 흙냄새가 난다. 그래서 토하젓이다. 이 토하젓을 한 젓가락씩 집어다 밥에 살살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힌데 비벼서 잠깐 놓아두면 이내 밥알이 삭아 버린다. 그래서 소화제라고도 부른다.
토하젓은 황석영의 산문에도 밥에 비벼 놓으면 밥알이 금방 삭는다고 표현되었듯이 예전에는 여름철에 보리밥을 먹고 체했을 때 토하젓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여 ‘소화젓’으로 불렸다. 이런 효능 때문인지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토하젓을 상비약으로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토하젓은 이러한 소화촉진 기능 외에도 키틴올리고당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분해효소인 프로타이제와 리파아제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재료
민물새우, 굵은 소금
조리과정
1.1. 싱싱한 민물새우를 깨끗이 손질한다.
2.2. 소독한 항아리에 민물새우와 굵은 소금을 번갈아 가며 쌓다가 굵은 소금으로 새우가 드러나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3.3. 항아리를 밀봉한 후 서늘한 장소에서 한 달 이상 숙성시킨다.
4.4. 숙성된 토하젓을 적당량 꺼내어 찹쌀밥과 다진 마늘과 파, 풋고추, 통깨 등의 양념으로 무쳐내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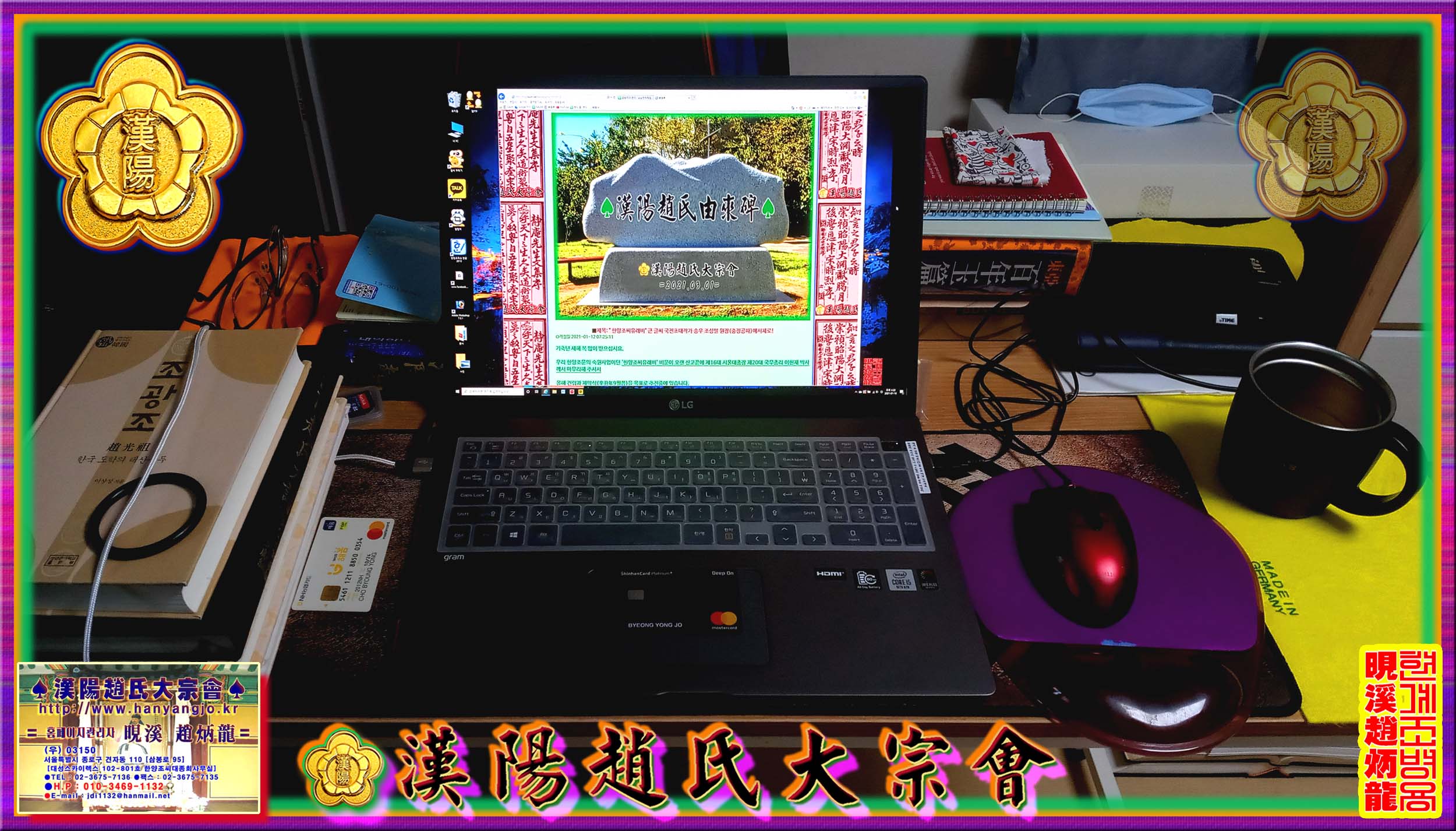









728x90
반응형
'❀漢陽人행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양조씨 참봉공파 2005년도 결산총회 (0) | 2006.01.15 |
|---|---|
| ▣한양조씨 2005년 임시총회장에서(2) (0) | 2005.12.16 |
| 한양조씨 2005년 임시총회장에서.... (0) | 2005.12.16 |
| 돈녕공파 모동종중 근황 (0) | 2005.08.21 |
| 2004년 시조중서공이하 2~5세조 설단준공식에서....◎二00四年四月十七日(陰二月.二八日) (0) | 2005.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