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다산시문집 제12권 / 서(序)
흠흠신서 서(欽欽新書序)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관이 또 그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히 살게 해 주고, 죄 있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 털끝만한 일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히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태연하고 편안하게 여긴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부인(婦人)들을 호리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비참하게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구휼할 줄 모르니, 이는 매우 큰 죄악이 된다.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獄事)는 군현(郡縣)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지방관이 항상 만나는 일인데도, 실상을 조사하는 것이 항상 엉성하고 죄를 결정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다. 옛날 우리 건릉(健陵 정조의 능호인데 정조를 가리킴) 시대에 감사(監司)와 수령 등이 항상 이것 때문에 폄출(貶黜)을 당했으므로, 차츰 경계하여 근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다시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억울한 옥사가 많아졌다.
내가 목민에 관한 말을 수집하고 나서, 인명에 대해서는 ‘이는 마땅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어야겠다.’ 하고, 드디어 이 책을 별도로 편찬하였다. 경서(經書)의 훈설(訓說)을 머리에 실어서 정밀한 뜻을 밝히고, 다음에 사적(史跡)을 실어서 옛날의 관례를 나타내었으니, 이른바 경사지요(經史之要)로서 3권이다. 다음에는 비판하고 자세히 논박한 말을 실어서 당시의 법식을 살폈으니, 이른바 비상지준(批詳之雋)으로 5권이다. 다음에는 청(淸) 나라 사람이 의단(擬斷 죄를 헤아려 형벌을 정함)한 사례를 실어서 차등을 분별하였으니, 이른바 의율지차(擬律之差)로 4권이다. 다음에는 선조(先朝) 때 군현의 공안(公案) 중에서 문사(文詞)와 논리가 비루하고 속된 것은 그 뜻에 따라 윤색하고, 해조(該曹)의 의논과 왕의 판결은 삼가 그대로 기록하되 간간이 내 의견을 덧붙여서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상형지의(祥刑之議)로 15권이다. 전에 황해도 지방의 군읍에 있을 적에 왕명을 받들어 옥사를 다스렸고, 들어와서 형조 참의(刑曹參議)가 되어 또 이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죄를 받아 귀양살이하며 떠돌아다닌 이후로도 때때로 옥사의 정상을 들으면 또한 장난삼아 의의(擬議 가상적으로 옥사를 논하고 죄를 정함)해 보았는데, 변변치 못한 나의 이 글을 끝에 붙였으니, 이른바 전발지사(剪跋之詞)로 3권이다. 이들이 모두 30권인데, 《흠흠신서(欽欽新書)》라 이름하였다. 내용이 자잘하고 잡스러워서 순수하지는 못하지만, 일을 당한 이는 그래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자산(子産)이 형전(刑典)을 새기자[鑄] 군자가 그것을 나무랐고,이회(李悝)가 《법경(法經)》을 만들자 뒷사람이 그를 가벼이 보았다. 그러나 인명에 관한 조목은 그 중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 수당(隋唐) 때에 와서는 이를 절도(竊盜)ㆍ투송(鬪訟)과 혼합하고 나누지 않아서, 세상에서 아는 것은 오직 한 패공(漢沛公 한 고조(漢高祖))이 약속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는 그것뿐이었다. 명(明) 나라가 천하를 통치함에 이르러 율례(律例)가 크게 밝혀져서 인명에 관한 모든 조목이 환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모(謀)ㆍ고(故)ㆍ투(鬪)ㆍ희(戲)ㆍ과(過)ㆍ오(誤)의 분별이 세밀하게 나열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어둡거나 의혹스러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다만 사대부(士大夫)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오직 시부(詩賦)나 잡예(雜藝)만 익혔을 뿐이므로 갑자기 목민관이 되면 어리둥절하여 손쓸 바를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간사한 아전에게 맡겨 버리고는 감히 알아서 처리하지 못하니, 저 재화(財貨)를 숭상하고 의리를 천히 여기는 간사한 아전이 어찌 중도에 맞게 형벌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일을 다스리는 여가에 이 책을 펼쳐놓고서 인증(引證)하고 우익(羽翼)으로 하여 《세원록(洗冤錄)》ㆍ《대명률(大明律)》의 보좌로 삼으면, 그 유(類)를 미루어서 아주 정밀한 데에 이르러 또한 심의(審議)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이요, 하늘의 권한도 잘못 집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옛날 구양 문충(歐陽文忠)은 이릉(夷陵)에 있을 적에 관아(官衙)에 일이 없자 해묵은 공안(公案)을 가져다가 이리저리 사례를 끌어내어, 이를 일생 동안 옥사를 다스리는 데 경계의 자료로 삼았는데, 하물며 자신이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무를 걱정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흠흠(欽欽)’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가고 삼가는[欽欽] 것은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도광(道光 청 선종(淸宣宗)의 연호) 2년인 임오년(1822, 순조 22) 봄에 열수 정용은 서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윤태순 양홍렬 이정섭 (공역) | 1983
欽欽新書序
惟天生人而又死之。人命繫乎天。迺司牧又以其間。安其善良而生之。執有辠者而死之。是顯見天權耳。人代操天權。罔知兢畏。不剖豪析芒。迺漫迺昏。或生而致死之。亦死而致生之。尙恬焉安焉。厥或黷貨媚婦人。聽號叫慘痛之聲而莫之知恤。斯深孼哉。人命之獄。郡縣所恒起。牧臣恒値之。迺審覈恒疏。決擬恒舛。昔在我 健陵之世。藩臣牧臣。恒以是遭貶。稍亦警戒以底愼。比年仍復不理。獄用多冤。余旣輯牧民之說。至於人命則曰。是宜有專門之治。遂別纂爲是書。冕之以經訓。用昭精義。次之以史跡。用著故常。所謂經史之要三卷。次之以批判詳駁之詞。用察時式。所謂批詳之雋五卷。次之以淸人擬斷之例。
用別差等。所謂擬律之差四卷。次之以 先朝郡縣之公案。其詞理鄙俚者。因其意而潤色之。曹議御判。錄之唯謹。而間附己意以發明之。所謂祥刑之議十有五卷。前在西邑。承 命理獄。入佐秋官。又掌玆事。流落以來。時聞獄情。亦戲爲擬議其蕪拙之詞。係于末。所謂剪跋之詞三卷。通共三十卷。名之曰欽欽新書。雖薈萃相附。不能渾成。而當事者猶有考焉。昔子產鑄刑書。君子譏之。李悝作法經。後人易之。然且人命之目。不在列。下逮隋唐。與竊盜鬪訟。混合不分。世之所知者。唯沛公之約曰殺人者死而已。至 大明御世。律例大明。而人命諸條。粲然章顯。謀故鬪戲過誤之分。眉列掌示。斯無昏惑。顧士大夫。童習白紛。唯在詩賦雜藝。一朝司牧。芒然不知所以措手。寧任之奸胥而弗敢知焉。彼崇貨賤義。惡能咸中。無寧聽事之暇。明啓此書。以引以翼。爲洗冤錄大明律之藩閼。則推類充類。庶亦有裨乎審擬。而天權不誤秉矣。昔歐陽文忠在夷陵。公署無事。取陳年公案。上下
紬繹。爲一生之所資助。況身都厥位。不虞其職事哉。謂之欽欽者何也。欽欽固理刑之本也。
道光二年壬午春。洌水丁鏞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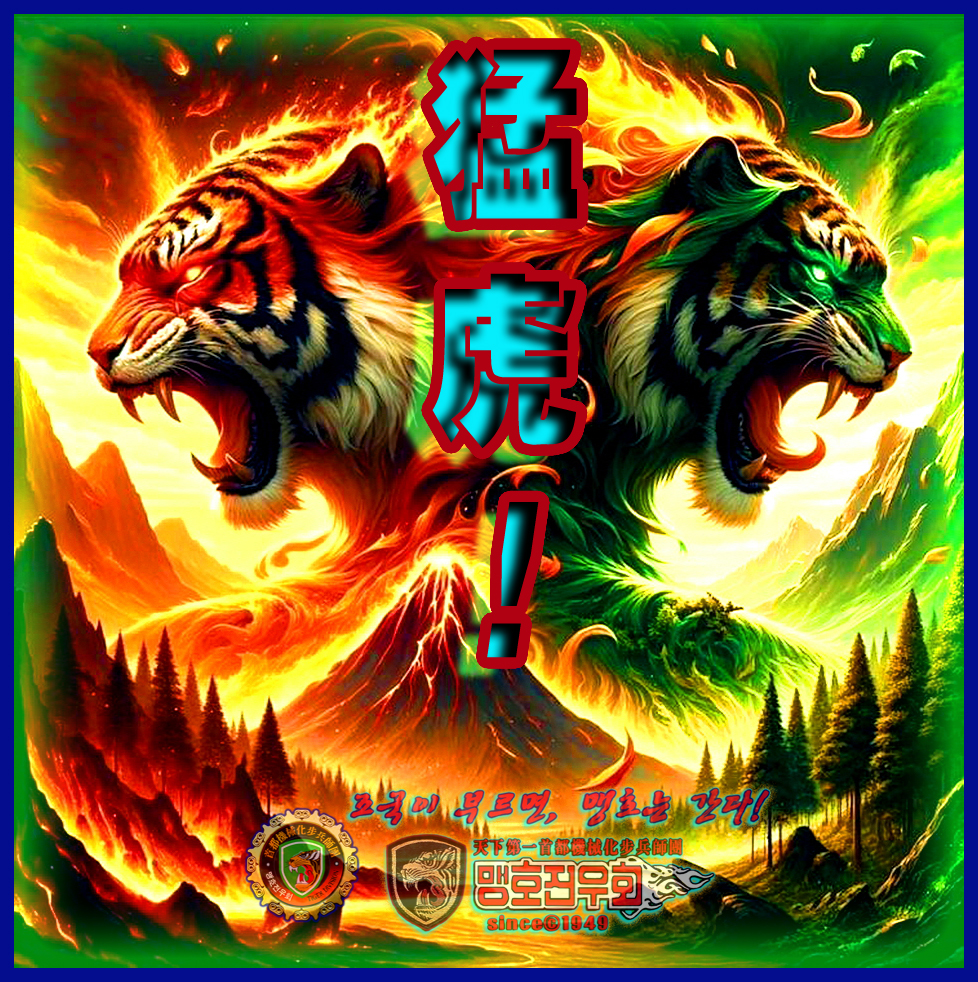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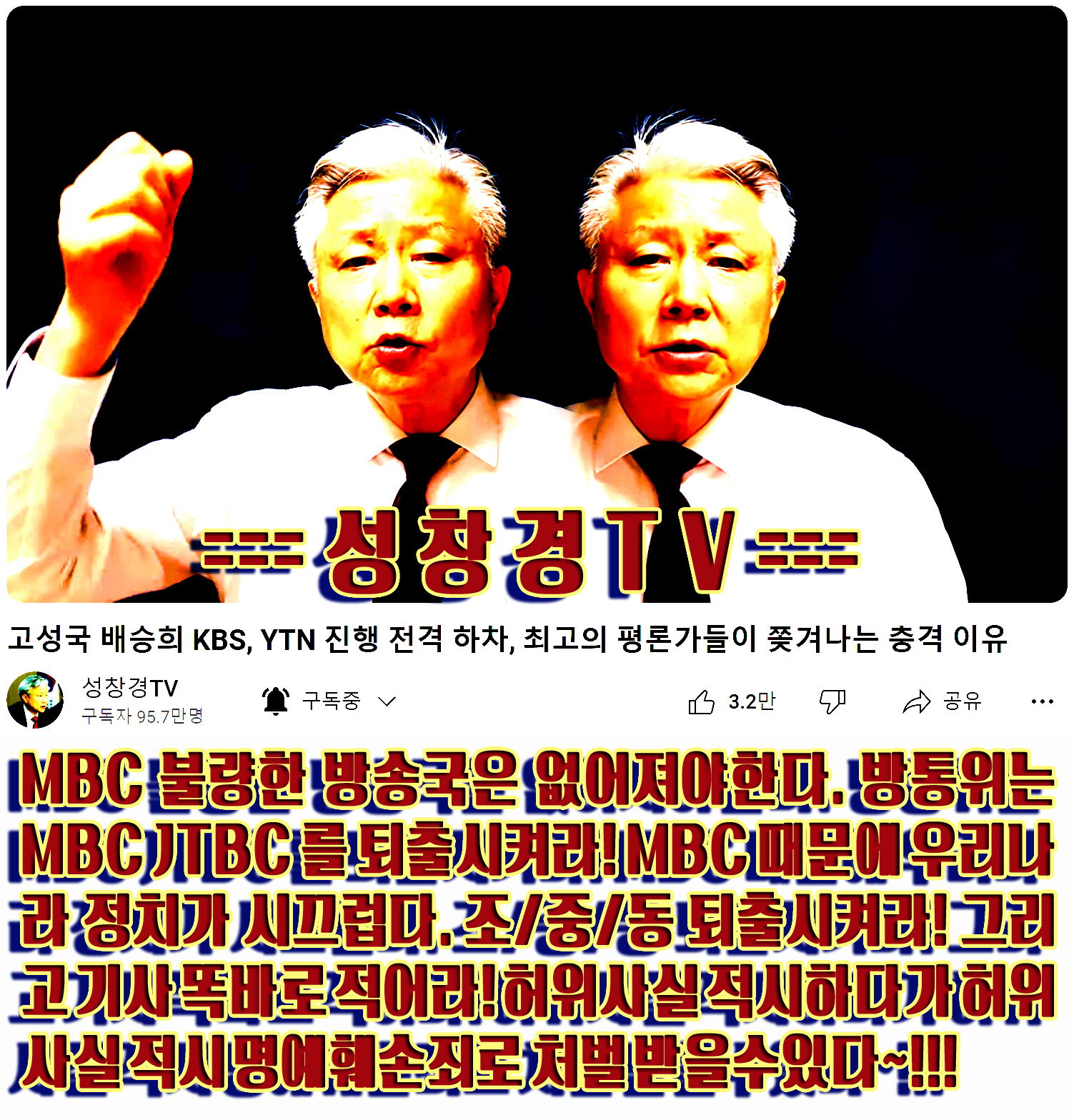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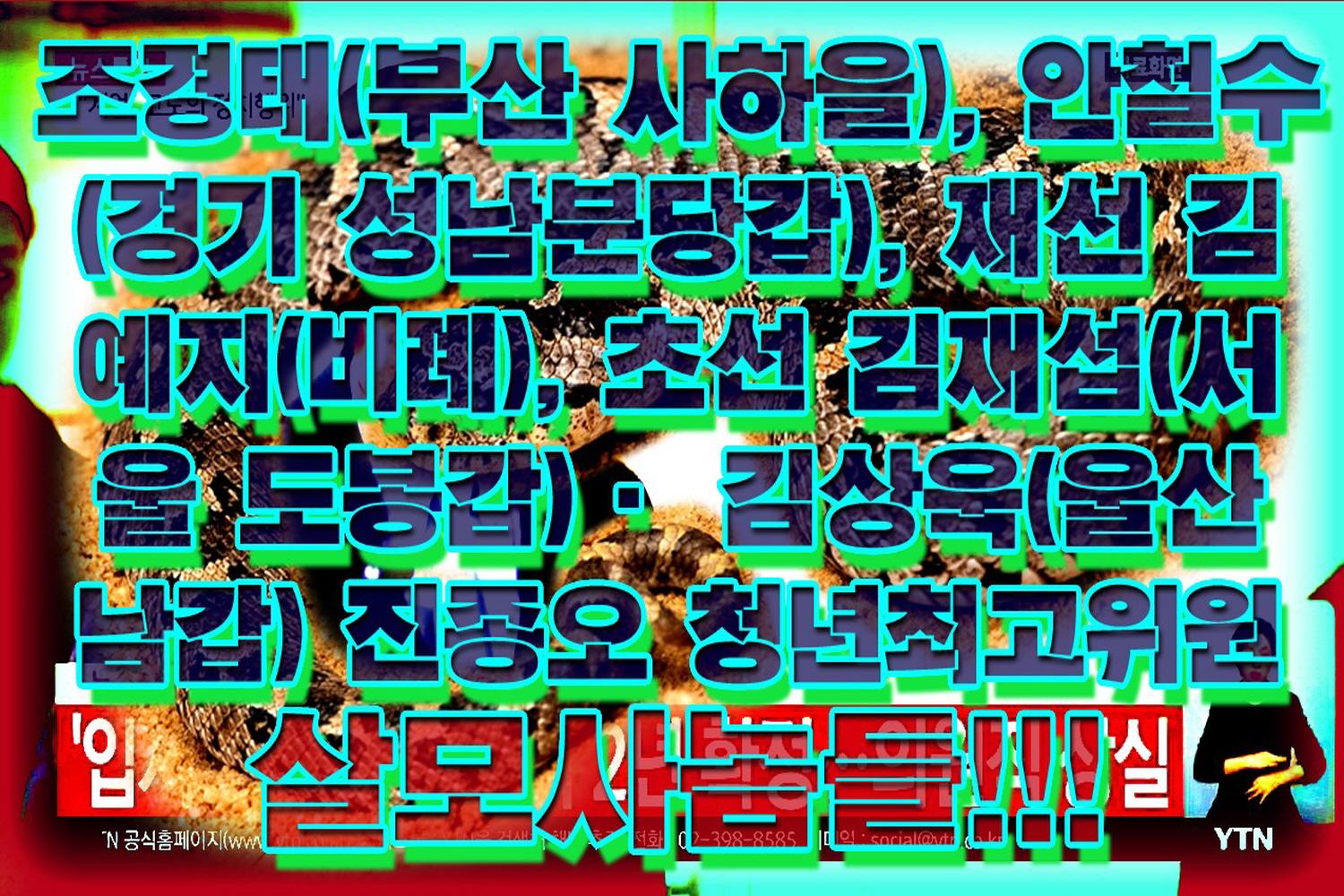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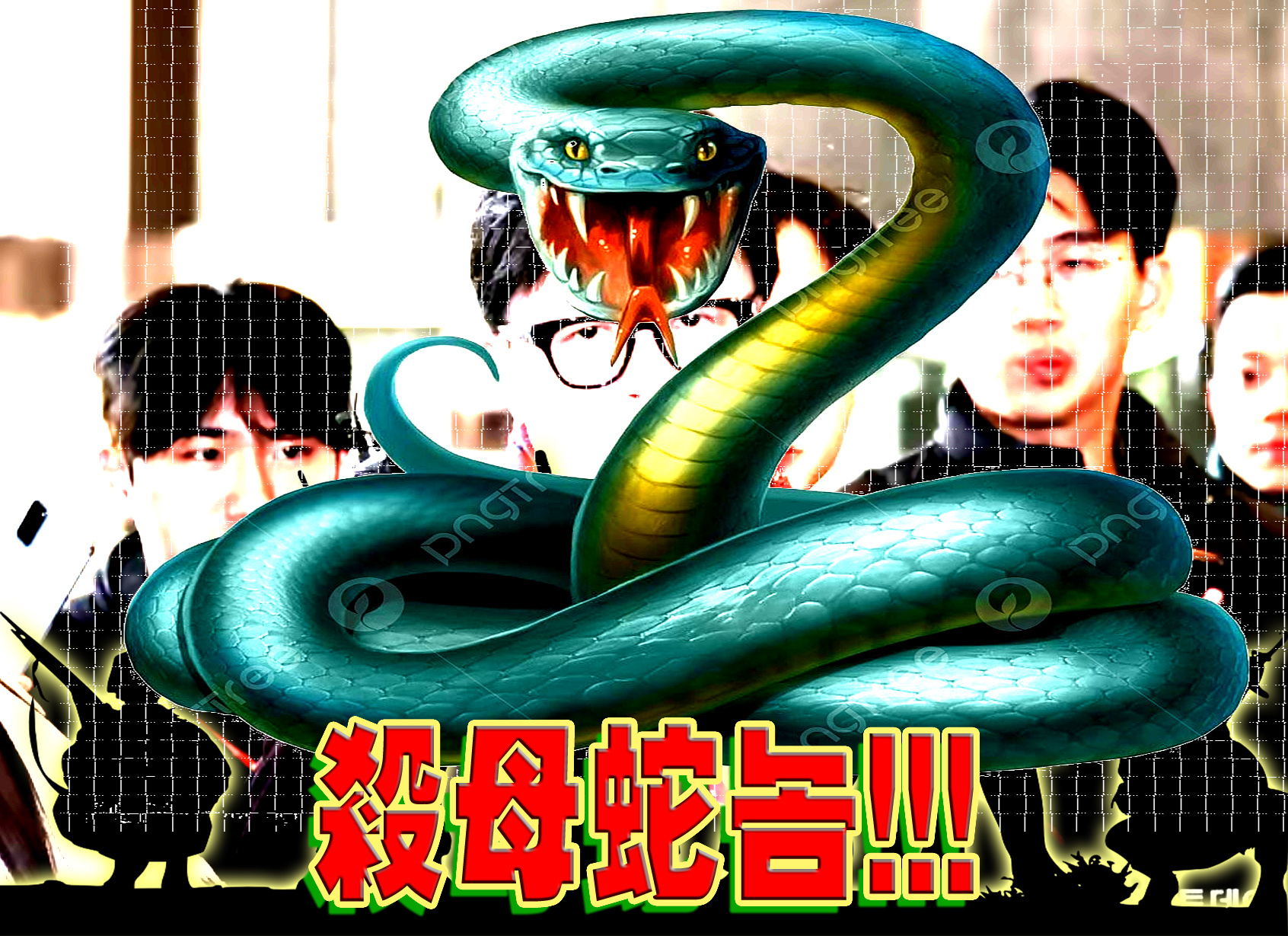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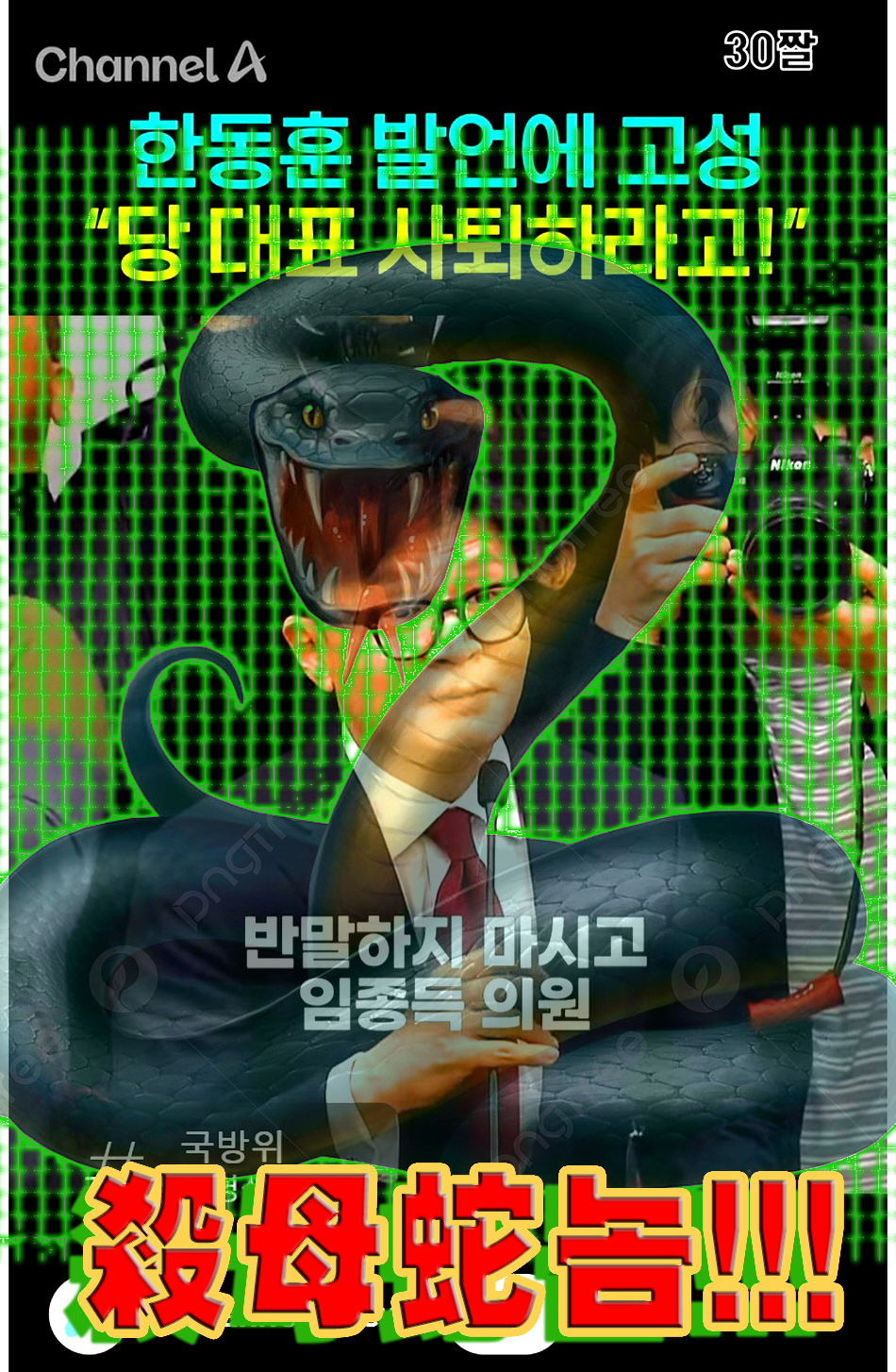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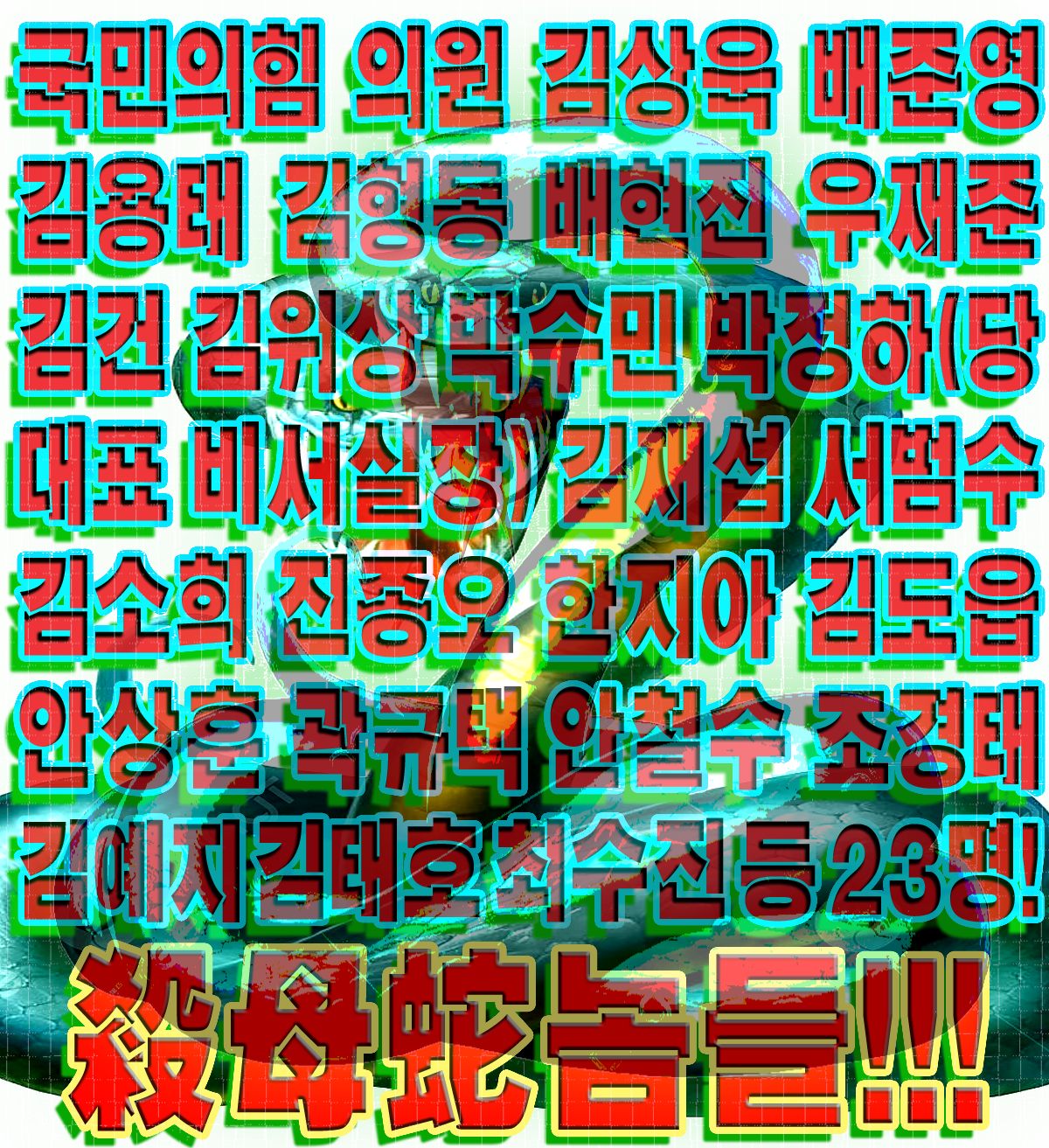

728x90
반응형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정선거는 만악의 근원! 검붉은 대형카르텔 뿌리뽑아야!!! (12) | 2024.12.26 |
|---|---|
| “여(與)와 야(野)가 꿈꾸는 나라가 서로 다른 것이었다는 동상이몽(同牀異夢)이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낳은 것입니다.” (5) | 2024.12.26 |
| 탄핵사태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7가지 징후? (4) | 2024.12.20 |
| 손흥민의 코너 바나나킥! 맨유잡다!!! (4) | 2024.12.20 |
| "손흥민? 글쎄…" 토트넘 차가운 반응 나왔다!→뮌헨 가서 '손케 콤비' 행복축구 하나 (2) | 2024.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