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조유선록서(國朝儒先錄序)」는 1570년(선조 3) 어명으로 『국조유선록』을 편찬, 간행한 경위를 소상하게 적은 글이다. 『국조유선록』은 당대 성리학의 거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화로 죽임을 당한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 등의 문적들을 모아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유가의 도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왕패(王覇)의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말하였다.

●李後白(이후백)
●出生日期 : 1520年(中宗15)~1578年(宣祖11)
●李後白1 1520 1578 延安 季眞 靑蓮, 松巢 文淸 延陽君
●宋子大全卷二百六 / 行狀 / 靑蓮李公行狀
本貫。黃海道延安府。
曾祖 淑瑊。觀察使。妣▣氏。
祖 世文。參奉。贈吏曹參判。妣洪氏。
父 國衡。贈領議政。妣林氏。贈貞敬夫人。
公諱後白。字季眞。號靑蓮。延安之李。爲東方大族。其譜云。唐中郞將
李茂。從蘇定方平百濟。留仕新羅。受籍于延。世有聞人。麗末有諱
係孫。以文忠公李齊賢之壻。官至工曹典書。於公八代祖也。高祖
末丁。禮賓少尹。贈延城府院君,
觀察使。以文章爲成廟朝名臣。祖與考兩世贈職。皆以公貴也。正德庚辰四月十一日辰時。公生焉。幼沈默少言笑。聰明絶倫。未十歲。父母俱歿。與內外諸從七八人。並鞠于伯父家。哀慕執喪。未嘗與群兒渾處笑語。一日往宗丈家。宗丈饋以醴酒。却之不飮。問之則曰。此雖醴。旣名以酒。不敢飮。一坐莫不歎嗟。年甫十歲。與盧玉溪禛,梁牧使喜。學于表公寅之門。一時學徒十五人。以次受學。公年最少。常居末席。聽諸人所受書。一皆背念。其中有性理大全書矣。表公聞其然。招使試之。公遍誦十四人書。如熟讀者然。表公大加驚異曰。未知古有如此兒否。嘗作瀟湘八景。歌詞傳播京中。或騰諸樂府。自是聲名益振。京師文士皆遲其至。時年十六矣。屢魁鄕解。至京師。名公巨卿重其名。多禮敬之。然公旣早嬰風樹。無心進取。放跡林泉。舍後有蒼松。因自號松巢。峒隱李公義健,孤竹崔公慶昌,玉峯白公光勳諸人從之遊。公少時。李芑謫康津。時人稱芑有學。公從而學焉。留數日卽歸。人問之則曰。吾數日見其處心行事而歸矣。問曰。何也。公曰。凡於毫末。一皆祕之。不欲人知之。君子心事。豈宜如是也。同鄕有參乙巳僞勳者。勢焰熏天。猶重公名。欲一見之。公嘗在山寺讀書。其人託於遊獵。與鄕人相約而至。公聞之。移棲以避之。遭祖母喪。守墓三年。朝夕上塚。不廢風雨。終始如一日。柳眉巖希春,林石川億齡相謂曰。純孝出於天性。雖古之孝子。無踰於此。推以自盡於方喪。必素食三年。淸溪柳夢井,金健齋千鎰。一時之名儒。每有禮文徑庭。經理疑晦處。必往復問難。每歎曰。論辨精確。眞非今世人所可跂及。年二十七。中司馬。三十六。中乙卯式年。歷颺淸顯。與奇公大升齊名。正色立朝。有壁立千仞不可奪之氣象。其履歷則初補槐院。薦入承政院爲注書。侍講院說書,司書。司諫院正言,司諫。兵曹正佐郞,吏曹正佐郞,議政府檢詳,舍人。弘文館應敎,典翰。又嘗選居湖堂。丁卯。以遠接使從事官。往迎詔使。其年擢拜承政院同副承旨,司諫院大司諫,兵曹參知,參議。未久還入政院。至都承旨。辛未。以文臣庭試壯元。加資爲禮曹參判,司憲府大司憲,弘文館副提學,吏曹參判。辛酉。以辨誣使赴京。還陞嘉義。錄光國勳。後追封延陽君。甲戌。以大臣薦。特拜刑曹判書。乙亥。關北缺監司。時本路歲凶。且有邊警。上難其人。公時在罷散中。上特命授之。道在遐遠。無名之賦。不法之事。狼藉無藝。公至悉經理而蠲革之。威惠幷行。一路澄淸。後許典翰篈。以御史巡撫本道。遇溪洞小氓。則必問李判書好在否。篈以其事志諸冊子而美之。入爲吏曹判書,兩館提學。銓選平允。士論重之。公久負文望。朝夕當秉文衡。而其時處其任者久居。而終不歸之公。物議甚歉焉。壬申春年饑。上命畫工寫流民圖。作屛十帖。又命公逐帖賦詩以進。以寓觀省焉。仁聖王后昇遐。朝廷論服制不一。公請上行三年之喪。據禮引經。明白精當。群議推爲第一。上竟從之。柳相成龍。時在玉堂。誦公文敬服曰。此老所學。其至此耶。爲寫一通置之几案。幷書公論議政事作一冊。以自玩賞焉。戊寅。以戶曹判書。乞暇省墓于咸陽。十月初七日病卒。訃聞。上震悼。隱卒之典有加焉。特命所經護喪。歸葬于坡州廣灘上先塋之側子坐午向之原。康津章甫立祠俎豆之。夫人洪氏。郡守處誠之女。男善慶。察訪。三女。適安昌善,奇誠獻,朴擧賢。察訪男泰吉,有吉,復吉,益吉,井吉。伯季皆縣監。仲叔皆縣令。第三別提。四女。爲柳希成,崔墍,李振先,金楪妻。曾孫壽仁,友仁,克仁,榮仁,好仁,壽仁文科典翰。有廉退節。克仁文科持平。玄孫。碩亨參奉。碩耇,碩臣,碩賓,碩昌,碩寬。幷庶出十三人。公器局峻整。神彩秀朗。見識通透。言論明白。蓋優游而灑落也。正大而從容也。平居夙興盥櫛。端拱危坐。硏覃經傳。沈潛奧義。踐履篤實。至微細事。未嘗放過。見事理眞實處。確然自守。不隨俗依違。至聞人善言。見人善行。必沛然從之。無所疑貳。宣廟初服。李文成公諸賢以爲。乙巳之禍甚於己卯。若不伸雪。人心拂鬱。無以爲國。遂協力竭心。爭論不已。雖以李文純之高明。亦不能無疑於眞僞之辨矣。及宣廟允從群議。當有頒敎中外之文。諸賢皆推筆於公。公不辭應命。其所以泝禍敗之源流。斥群邪之奸欺。著明廟友愛之情。發鳳城冤屈之狀。明白痛快。至使讀者感激而流涕。論者謂不獨文章出等。其志氣之拔萃。可見於此云爾。自是論議大定。以啓宣廟淸明之化。公之功可謂大矣。宣廟嘗命公作國朝儒先錄序。公上明道學之淵源。次敍傳授之統緖。老成典要。人無間言。公可謂知言之君子矣。不有眞知實踐之功。焉得而與此哉。古人云。一臠可以知全鼎。況此數件文字。不止一臠而已乎。其爲都承旨也。終日端坐。嚴毅不可犯。廳中寂然。無敢闌語。至於內間女侍相戒曰。今日李某入政院矣。惟恐語聲之出於外也。上以故久任於是職。其長銓曹也。有族人來有請。公正色出示一冊子。蓋錄才行人姓名也。其人亦在其中矣。公曰。吾錄子名。將以擬望矣。惜乎子若不言。可以得官矣。其人大慙而去。公每注擬時。必遍問於郞僚。論議歸一。然後用之。如或有誤則終夜不眠曰。我欺主上矣。公嘗以淸白見錄。李文成先生稱之曰。李某居官盡職。律身淸苦。位至六卿。寒素如儒。客至杯盤冷淡。人服其潔。思菴朴相公。嘗於筵席啓曰。李某可以托六尺之孤。寄百里之命云。嗚呼。以公之才之德。當宣廟盛際。倘任經綸之丕責。則其所猷爲必有可觀者。以故物議皆望其朝夕入相。而公則病矣。可勝惜哉。乙巳之禍。圭庵宋文忠公。余曾叔祖也。以一世領袖而受禍最酷。含冤九原。殆三十餘年矣。至於萬曆丁丑。公文一出。神人冤憤。一時淸雪。余每景仰於心。如一日也。今碩亨。以行狀千里來托。余不敢終辭。而第錄如右。以俟立言之君子云。崇禎紀元後丙寅八月日。恩津後人宋時烈。狀。
[주-D001] 年 : 年下恐脫
..........................
李後白1 1520 1578 延安 季眞 靑蓮, 松巢 文淸 延陽君
淵齋先生文集卷之四十一 / 墓表 / 判尹贈判書洪公 九敍 墓表
此故判尹洪公九敍之藏。夫人光山金氏。合塋。舊有大碑。見碎於龍蛇之亂。後孫懼無以識其封域。復伐石以表之。淳瓚請余記之曰。先祖。端廟朝人也。世代已邈。事蹟史無所徵。惟家乘有寂寥數語以爲英陵丙辰登科。由承文正字。歷典籍,佐郞,掌令,判官,弼善。文宗辛未。以兵曹參議。擢工曹參判。端廟壬申。拜漢城判尹。逮光廟受禪。見再從弟達孫。大責而告絶曰。汝不聞忠臣不二事之義乎。遂與外舅金司評子進。女壻李參奉世文。棄官南下。居于康津杏亭。深自鞱晦。遯世不悔。後人名其村曰君子里。聞寧越凶報。北望痛哭。每遇諱辰。輒不御肉。達孫言于朝。除以全羅監司。不就。後又屢徵而終不起。此其大略也。先祖有此卓異之節。而湮沒無稱。豈不爲痛恨乎。余曰。莊光之際。蓋多忠義之士。或死而報。或生而全。殆若殷之三仁。而出於至誠則一也。當時事爲國大諱。士之秉義遐擧之跡。往往隱晦而不顯於世。誠可悲也。然公之事。於莊陵誌。一不槩見。又何歟。後之尙論者。必有憾於斯也。公南陽人。胄於高麗太師殷悅。傳至忠平公諱灌。文正公諱彥博。俱殉國亂。事載麗史。再傳而諱彝。觀察使。生諱仁老小尹。生諱福從主簿。卽公三世。而歿於壬子五月十七日。成廟朝。贈兵曹判書。有二男一女。永遜僉知。永順司直。女李世文妻也。曰處謙,處讓司正。處誠郡守。李國衡。贈判書。是內外孫。而宣傳官韓鵬。長房壻也。曾孫曰允煕。昭威將軍。壽海。上護軍。文淸公李後白。其妹壻也。玄孫多不盡錄。而源深流長。世益蕃衍。公之蓄於躳者。發於後。斯可見矣。立言闡幽。余非其人。而慨其名節之泯沒。略書如此。以俟百世之來讀者焉。
............................
| 1 | 李靑蓮 後白 挽 | 挽詞 | 梁應鼎 | 松川遺集 | a037_515c 종합DB |
| 2 | 祭李家宰後白文 字季眞。號靑蓮居士。 | 祭文 | 具思孟 | 八谷集 | a040_509a 종합DB |
| 3 | 靑蓮先生挽 | 挽詞 | 白光勳 | 玉峯集 | a047_128a 종합DB |
| 4 | 輓李靑蓮 | 挽詞 | 柳成龍 | 西厓集 | a052_416a 종합DB |
| 5 | 靑蓮李公行狀 | 行狀 | 宋時烈 | 宋子大全 | a115_013d 종합DB |
| 6 | 資憲大夫吏曹判書...文淸李公神道碑銘。幷序 | 神道碑 | 黃景源 | 江漢集 | a224_271b 종합DB |
| 7 | 靑蓮先生李公行狀[宋時烈] | 行狀* | 宋時烈 | 靑蓮集 | b003_058a 종합DB |
| 8 | 挽李判書 後白 | 挽詞 | 裵三益 | 臨淵齋集 | b004_229c 종합DB |
........................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년 을사 > 4월 16일 > 최종정보
영조 1년 을사(1725) 4월 16일(계미) 맑음
01-04-16[21] 강진(康津)에 있는 고(故) 이조 판서 이후백(李後白)의 사우(祠宇)에 사액(賜額)의 은전을 내려 줄 것을 청하는 전라도 유학(幼學) 김면(金冕) 등의 상소
전라도 유학(幼學) 김면(金冕)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아 5년 사이에 거듭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지극히 효성스럽고 우애로우신 우리 전하께서 거듭 화란을 당하셨으니 지난번의 슬픔과 새로운 비통함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신 이후에 일심으로 선치(善治)를 도모하여 모든 일을 잘 다스렸는데, 특히 유교를 숭상하고 도학을 중시하며 많은 선비를 일으키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이미 어두워진 의리가 이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되었고 사라져 가는 사문(斯文)이 이로 말미암아 다시 진흥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아랫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뛸 듯이 기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어 삼가 생각건대 교화의 근원이 비록 조정의 풍속이 아름다운 데 달려 있지만 실제로는 옛날의 현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현자를 표창하여 지금 사람들의 모범으로 삼는 것은 교화에 얼마간 도움이 되며, 이것이 서원을 설립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재위하실 적에 인재가 성대하게 일어나고 유교가 크게 밝혀졌으니, 그때 고(故) 이조 판서 이후백(李後白)과 같은 이가 있어서 덕행, 경술(經術), 문장, 언의(言議)가 참으로 진신(搢紳)의 모범이 되고 사림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후백의 시대로부터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그의 호인 청련(靑蓮)을 외우는 자가 있으니, 초야의 어리석고 미천한 신들도 어찌 그를 경모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미 경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유림에서 그를 존숭하여 보답하는 예를 갖추었으며, 이미 존숭하여 보답하는 예를 갖추었으니 어찌 조정에 그를 현양(顯揚)하는 은전(恩典)을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성명께서 위에 계시면서 현자를 기리고 유덕자를 높이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삼고 있으니, 이 때문에 신들은 이후백이 현자임을 즐거이 말하여 전하께서 굽어살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신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말하신다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신들이 삼가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이후백의 행장을 살펴보니, ‘이후백은 기량과 재국(才局)이 뛰어나고 반듯하며 정신과 풍채가 빼어나고 밝으며 식견이 투철하고 언론이 분명하며 여유롭고 소탈하며 정대(正大)하고 차분하다. 경전(經傳)을 깊이 연구하고 심오한 의미를 깊이 음미하여 독실하게 실천하고 확고하게 지킨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이후백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행적을 지적하여 말한다면, ‘선묘(宣廟)께서 처음 즉위하셨을 때 선정신 이이(李珥) 등 여러 현신은 을사년의 재앙을 신설(伸雪)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고 하고서 마침내 힘을 합하고 마음을 다하여 끊임없이 쟁론하였다. 선묘께서 여러 사람의 의론을 윤허하여 따르고서 중외에 반교(頒敎)하는 글을 지을 때 여러 현신이 이후백에게 미루었다. 이후백은 사양하지 않고 명을 따랐는데, 화패(禍敗)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사특한 자들이 속이고 가린 정황을 논박한 것이 명백하고 통쾌하여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논자들은 문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의론이 크게 정해져서 선묘 대의 청명한 다스림을 열었다고 하였으니, 이후백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후백은 할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산소를 지키면서 아침저녁으로 산소에 올랐으며, 이를 미루어 방상(方喪)에 스스로 정성을 다하여 반드시 3년 동안 소사(素食)를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의 효성이 독실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몽정(柳夢井)과 김천일(金千鎰)은 모두 한 시대의 이름난 유학자인데, 예문(禮文)에 의문점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이후백에게 가서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그 논변의 정확함에 감탄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인성왕후(仁聖王后 인종(仁宗)의 비)가 승하하셨을 때 조정에서 복제(服制)를 논한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후백은 상에게 삼년상을 행하라고 청하였는데, 예(禮)에 근거하고 경(經)을 인용한 것이 명백하고 정치하며 합당하여, 여러 사람이 제일이라고 추대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가 예(禮)에 정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도승지로 있을 때에는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 있어 청(廳) 안이 조용하였으며, 내간(內間)의 시녀들은 서로 경계하여, 「오늘 이 아무개가 정원에 들어왔으니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걱정이다.」라고 말하였다.’ 하였으며, ‘일찍이 청백리에 올랐으며, 지위가 육경(六卿)에 이르렀으나 가난하고 소박하기가 유생과 같았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처신이 엄숙하고 굳세며 행실이 청고(淸苦)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는 역시 모두 송시열이 지은 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故) 부제학 유희춘(柳希春)이 기록한 ‘이후백의 도덕과 문장은 한 시대의 으뜸가는 모범이다.’라는 등의 말과 같은 것은 모두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송시열의 도덕과 학문이라면 그 지혜는 이후백의 사람됨을 알기에 충분하고 그 말은 후세 사람에게 믿음을 얻기에 충분한데, 그가 말한 바가 곧 이와 같습니다. 이후백과 같은 자가 어찌 이른바 진신의 모범이며 사림의 사표로서 백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이후백의 어짊은 온 세상이 함께 경모하는 바이며 한 지방에서만 홀로 존숭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은 바로 이후백이 살던 고장으로, 지역의 선조들은 몸소 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후학들은 멀리 그의 풍성(風聲)을 흠앙하고 있으니, 깊이 알고 간절하게 사랑하며 지극히 존숭하고 극진하게 공경함이 자연히 다른 사람의 갑절이나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강진(康津)의 고향에 사우(祠宇)를 창건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으니, 존숭하여 보답하는 일은 유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액을 청하는 한 가지 일은 처음에는 차일피일하다가 거행하지 못하였고, 중간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서 폐기하였습니다.
지난 갑술년(1694, 숙종20)에 본도 유생 김증(金䎖) 등이 한 편의 상소를 올려 은전(恩典)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해당 조(曹)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의 복계(覆啓)에서는 또한 말하기를, ‘이후백의 경술(經術), 문장, 행의(行誼), 언론은 진실로 한 시대의 명현들이 받들어 복종한 바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사액(賜額)의 은전을 내리는 일은 도덕과 학문이 후세에 두드러진 자가 아니면 가벼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시골 유생들의 사액 요청을 번번이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수교(受敎)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끝내 버려두고 시행하지 않았으니, 이에 신은 개탄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후백의 본말을 통틀어 논해 보면, ‘소탈하고 정대하며 깊이 음미하고 직접 실천한다.’라는 것과 ‘효성이 독실하고 예학에 정통하며 처신을 엄격하게 하고 행실을 맑게 한다.’라는 선정신 송시열의 찬술이 위에서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도덕과 학문이라는 것은 진실로 이것들을 버려두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현들이 받들어 복종하였다고 이미 말하였다면 어찌하여 후세에 표창하기에 부족합니까. 복계한 내용에서는 이미 드러내어 칭찬해 놓고, 또 이러쿵저러쿵하며 은전(恩典)을 내리는 일을 멈추라는 뜻을 보였으니, 실로 이해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신들이 우러러 청하는 것이 감히 이후백을 사사로이 위하려는 것이 아니니, 성조(聖朝)에서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어찌 신들을 위하는 데에 있겠습니까. 진실로 현자를 앙모하는 정성은 상도(常道)를 지키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모두 마찬가지이며, 유덕자를 숭상하는 은전은 왕정(王政)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바이므로, 청하지 않을 수 없는 바가 있으며 윤허하지 않을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말이 시골 유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대뜸 단정하는 것이 어찌 수교의 본뜻이겠으며, 이 수교를 또 어찌 신들이 청한 일에 끌어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백과 같은 현자가 표창하는 반열에 끼이지 못한다면 신들은 그것이 이후백에게는 손상되는 바가 없으나 성조에는 흠이 될까 걱정됩니다. 신들이 이어 들으니, 당시의 예관(禮官)도 이후백을 표창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화를 펼치는 초기를 맞이하여 조정에서 현재 사문(斯文)에 더욱 유의하고 있으니, 예전의 현자를 위하여 사우를 건립하려는 원근의 유사(儒士)들이 소문을 듣고 일제히 일어나서 서로 연이어 사액을 청하여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그 가운데 혹 진실로 들어줄 필요가 없는 자도 있어서 예관이 취사선택을 하려 하지 않고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백처럼 탁월하고 출중한 자는 우선적으로 현양해야 하는데 뒤섞여 방치되어 버림을 면치 못하였으니, 한때의 사세(事勢)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사림의 공공의 의론을 끝내 억누를 수 없음은 어찌하겠습니까.
이에 신들은 감히 천 리 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달려와 대궐 앞에서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후백의 도덕의 실상을 깊이 생각하시고 선정신의 정론(定論)을 참고하시어 신들이 경모하는 정성을 굽어살피시고 사전(祀典)이 결여되었음을 진념하시어 유사에게 분명하게 하교하여 속히 아름다운 편액을 하사하신다면, 이후백에게 빛이 날 뿐 아니라 실로 성덕에 빛이 날 것이며 신들의 다행일 뿐 아니라 바로 사문의 다행일 것입니다. 신들은 너무나 황송하고 간절하게 비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주-D001] 이는 …… 평가입니다 : 원문은 ‘思庵卽朴淳號也 此固後白之大略’인데, 문맥상 ‘思庵卽朴淳號也’ 7자는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송시열(宋時烈)이 쓴 이후백(李後白)의 행장에는 “사암(思菴) 박 상공(朴相公)이 전에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이 아무개에게는 어린 사군(嗣君)을 부탁하고 나라의 정사를 맡길 수 있다.’ 하였다.”라는 말이 나온다. 《宋子大全 卷206 靑蓮李公行狀》 여기에서는 송시열이 쓴 행장의 내용을 군데군데 인용하였는데, 필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듯하다.[주-D002] 방상(方喪) : 왕을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이다. ‘방(方)’은 비긴다는 뜻으로 부모의 상사(喪事)와 비겨 행한다고 하여 이르는 말이다. 《禮記 檀弓》[주-D003] 예문(禮文)에 …… 때마다 : 원문은 ‘每有斯文疑晦處’인데,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06 〈청련이공행장(靑蓮李公行狀)〉에 ‘每有禮文徑庭 經理疑晦處’라고 한 것과 본문의 아랫부분에 “예(禮)에 정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斯’를 ‘禮’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장승현 (역) | 2011










●靑蓮先生集一 / 序
[國朝儒先錄序]
[DCI]ITKC_MO_0685A_0020_090_0010_2010_B003_XML DCI복사 URL복사
隆慶庚午歲。卽我殿下踐祚之三年也。于時宵旰求治。勤御經筵。尤留意於性理之學。一日夕講罷。上語副提學柳希春曰李彦迪文集則予旣覽之矣。金宏弼,鄭汝昌,趙光祖。玆皆不世出之賢。亦豈無所著述乎。爾其爲予裒輯以來。希春承命兢惶。退與玉堂諸儒。蒐摭標別。幷收其行狀及遺事。彙次凡例。倣伊洛淵源錄。屢稟睿裁而更定焉。於宏弼則取景賢錄所載。稍有增損。彦迪文字頗多。不可盡錄。則抄列其緊要者若干篇。其他多得之於聞見。書旣成。投進請名之爲國朝儒先錄。上允之。深加玩繹。下校書館印布國中。且命臣序之。臣竊惟自孟子沒而儒者之學不傳。人心貿貿。邪說幷興。千有餘年。至于有宋。濂洛關閩諸君子相繼而作。發其關鍵。極其歸趣。而集其大成。使孔孟之道。粲然復明於世。雖其身不見用於當時。百代之下。遺書尙存。讀而味之者。於義理王霸之辨。操存克治之方。瞭然若親承指誨而作興焉。其功可謂盛矣。吾東方自箕子受封。肇被仁賢之化。世代荒邈。文獻無徵。降及新羅。以迄高麗。非無名人器士之可稱。顧其所治者章句。所尙者詞藻。而其尤者不過以節義勳業相高而已。有能自拔於流俗。硏窮性命。超然自得。妙契聖賢之旨。卓乎爲世儒宗者。鄭夢周外未聞其人焉。天眷我朝。列聖相承。培養之厚。歷年之久。人材之出。敻絶古昔。宏弼奮乎絶學。遠紹夢周之緖。志學聖賢。精積力久。忠信篤敬。動遵禮法。汝昌生幷一世。志同道合。相與講磨切磋。以闡義理。光祖蚤師宏弼。得其依歸。其嚮道誠而其厲志確。潛心主敬。涵養本源。省身克己。常若不及。彦迪天資近道。自奮於爲學。持敬功深。大有定力。神會心融。所見精邃。玆四臣者。倡之於前。而繼之於後。其工程之疏密。造詣之淺深。臣後生愚鹵。何足以知之。然其所學。卽濂洛關閩之學。專事爲己。體履眞實。從事於人倫日用之常。以求至乎聖賢之閫奧。則其揆一也。乃蹇連困躓於讒賊之口。俱不免奇禍以死。豈天不欲斯民蒙至治之澤乎。何其遭遇休明。言聽計從者。亦不得保其終耶。民彝不墜。淸議難泯。至今閭巷之間。縫掖之流。欽其風而慕其人。咸知好善而惡惡。子孝而臣忠。崇吾道而斥異端。謂文藝爲不足尙。謂聖賢爲必可學者。是誰之功也。惜乎。時世不遠。而遺響莫尋。徽言懿行之播於人者。日就煙沒。寧不爲斯文之憾也。我殿下臨御以來。不遑他事。首擧曠典。褒贈二人。昭雪幽冤。四方之耳目。固已煥然一新。又命撰印是編。與濂洛關閩之書。幷傳於天地之間。是表章眞儒。扶植正道之盛意。嗚呼至哉。第恨採摭無據。其平生言行之大者。蓋十亡其七八。而於汝昌爲尤疏略。然卽此以觀。亦足以知其致意用力之地。無彼此之間。而箴敬規諫之文。經席勸講之說。丁寧懇惻。裨補君德而興起來學。亦已多矣。深宮燕閑之中。常置之几案。日賜覽觀。則是猶四臣者環侍左右。迭進嘉言。所以一聖心導聖德者。何可勝言。而志學之士。莊誦景仰。以爲吾邦亦有此等人。想像親切。不自覺其脫舊習而立根基。其亦賢於披閱陳編而嘐嘐者矣。由是而彝倫日明。俗尙日變。善人輩出而至治可復。是書之行。其有補於世道。爲如何哉。我殿下之眷眷於斯。誠所謂急先務矣。視彼役意於筆札文詞之工者。殆不可以同年語也。抑臣於此。有感焉。正直難親。讒諛易惑。是非雖定於百年。好惡或眩於一時。此古今之通患也。是以褒旣往之賢爲難。而信當世之賢尤難。蓋士之特立篤行。躬道義之學者雖等級有異。何代無其人也。獨人君知之不明。用之不誠。而媢嫉之徒排陷讐怨之深耳。宋理宗能崇顯周程張朱。尊尙其書。而眞德秀魏了翁乃不免貶逐。姦臣擅政。運祚衰替。此固不足論。且如聖哲在上。夢周之祀旣升矣。宏弼,汝昌之爵旣隆矣。畢竟憸邪得志。事有不忍言者。豈不痛哉。今我殿下之於四臣。崇奬表異之可謂盡矣。後之視今。亦猶今之視昔。願聖明念玆在玆。終始罔間。益充好賢之實。以盡委任之誠。則斯道大幸。而宗社之福。悠久無疆矣。是歲冬十有二月下澣。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臣李後白奉敎謹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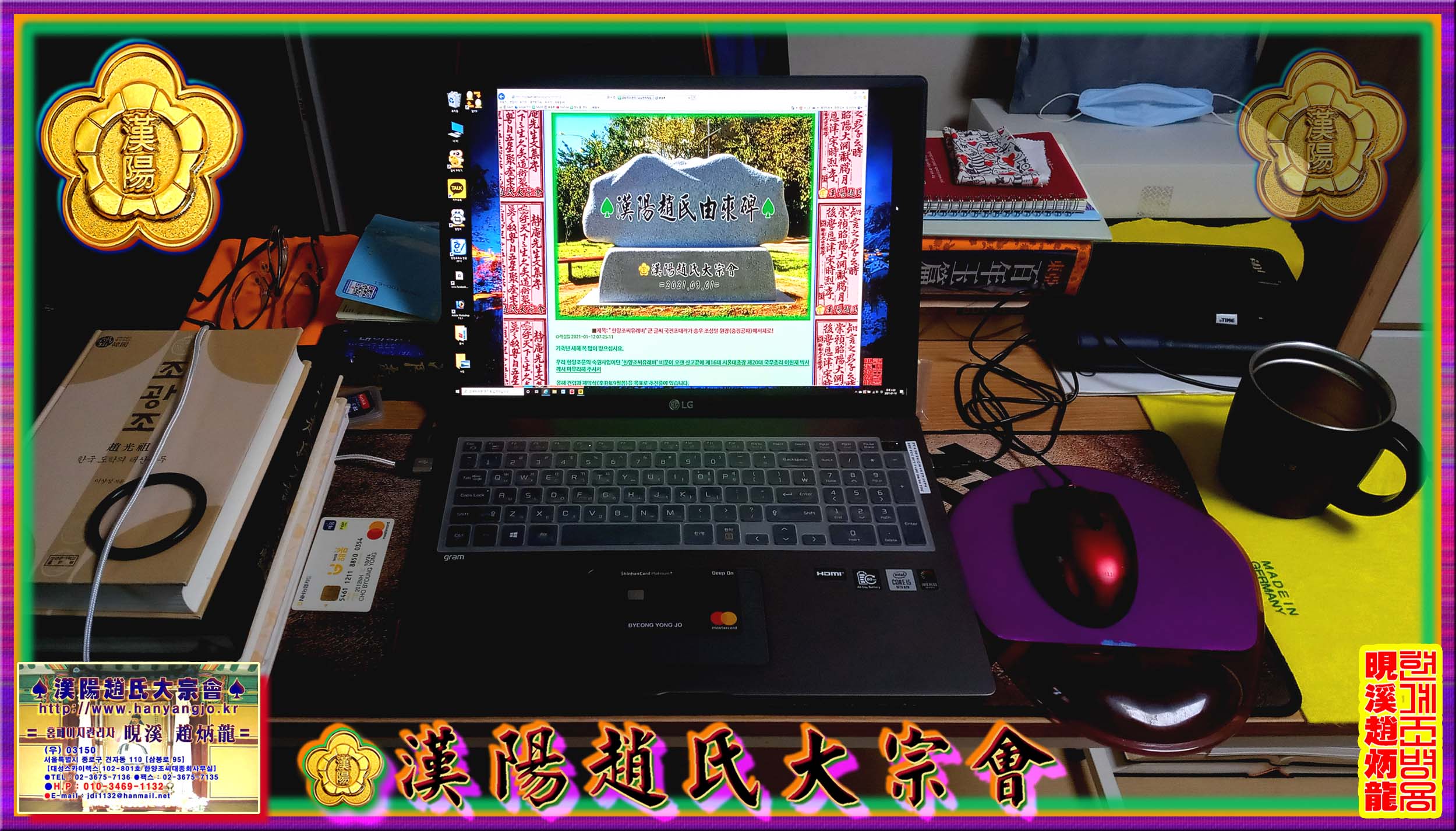









728x90
반응형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淸難三功臣都監儀軌) (0) | 2022.08.22 |
|---|---|
| [해동유선록 海東儒先錄] : 문신·학자 김수항 (0) | 2022.08.21 |
| 성주이씨(星州李氏) 형보(衡輔)의 부인 해평윤씨(海平尹氏1660~1701) 服飾 : 해평윤씨 유물 수습 경위와 성주이씨 이형보의 가계 (0) | 2022.08.18 |
| ※배신자/반역자, 화천군 심정 무덤! (0) | 2022.08.12 |
| ♥다산초당(茶山艸堂)현판의 진실♣ (0) | 2022.0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