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院書江海
門道由
裔想敬
院書江莎
院書江污
齋正誠
齋復克
분강서원 상량문(汾江書院上樑文)
덕음(德音)을 잊지 못하여 이 높음을 갚으려는 전례를 거행하고, 남기신 영정(影幀)이 엄연하니 공경히 받드는 집을 경영하였다. 영(靈)의 모습은 새롭고 엄숙하다. 농암 선생은 경서를 타고났고 황하와 태산의 기상을 지녀 그 학문이 깊고 정미하였다.
학문하고 남는 시간에 벼슬을 하였으나, 높이 현달(顯達: 벼슬, 명성, 덕망이 높아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남)하여 일찍부터 경제의 뜻을 지녔다. 출처가 함께 마땅하였고 충효를 함께 갖추었다. 혼란한 임금을 섬겼으나 곤경에 처해도 더욱 형통하였고 벼슬은 간관에 이르러 바른 도에 숨김이 없었다. 어버이를 매우 정성스럽게 봉양하고 여덟 고을을 다스림에 그 효도의 마음을 미루어 다스렸으니, 거문고 노래가 백 리에 걸쳐 퍼졌다.
당(堂)에는 애일(愛日)의 액자를 걸었고 집에는 명농(明農)의 헌함이 있었다. 귀거도를 그려 놓고 고인을 생각하였고 어부가를 불러 장안을 바라보았다. 좌석에는 늘 연로하고 덕이 높은 낙사(洛社)의 호걸이 앉아 있었고 뜰아래는 사가(謝家)의 나무들이 빽빽하여 난형난제를 이루고 있었다.
대부(大夫)와 명사들이 찾아들어 시를 읊고 노래하였으며, 퇴계 선생 같은 이가 찾아와 도의(道義)로써 좇았다. 문장과 학행이 거룩하여 진신(縉紳)의 모범이 되었고, 덕업과 관작이 높았으니 나라에서 시귀(蓍龜)처럼 우러렀다. 큰 덕은 수(壽)를 얻게 되리라 사람들이 추앙하였는데, 엄연하던 소미성(少微星)이 빛을 감추고 말았으니 이제 어디를 의지할 것인가?
아름다운 소리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어 탄식을 하였더니, 다행히 영정이 간수되어 있었다. 둥글고 모남이 활달하여 바다와 호수의 기상이 있었고, 심의(深衣)와 대대(大帶)가 완연하고 의연히 팔짱 지른 모습이라.
비록 춘추로 향현사(鄕賢社)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이 서원에서는 받들지 못하였기에 후덕한 여풍(餘風)을 전하지 못해 자손에게 부끄러웠고 청렴하고 올곧음을 펴지 못해 후인(後人)들을 볼 낯이 없었다. 이에 드디어 뒤 사묘(祀廟)의 예를 강론하고 앞마루의 제도를 천명하니 사민(四民)이 다투어 따르고 권하였다.
고향 인근에 정남향으로 터를 정하고 건물을 우러러보니 몇 날 지나지 않아 새가 날개를 펼치 듯 하였다. 서원에 액자를 붙이니 실로 여러 선비가 모일 곳이라, 돌이켜 보고 말하건대 이곳이 흥기함이 어찌 후손의 경사일 뿐이겠는가? 어린이와 백발노인이 영지산(靈芝山)의 노래를 듣는 듯하였고, 대나무 작대와 검은 두건은 기수(沂水)의 읊음을 모신 것 같았다. 백 년 동안 올리지 못한 제사를 드디어 거행하니 길이 말이 있을 것이요, 일세(一世)의 유풍을 진작시키니 도움이 없을 수 없다. 짧은 노래를 지어 긴 들보를 올림을 돕는다.
어랏차 대들보를 동쪽으로 던지니,
너르고 너른 신령한 근원이 한 줄기 통하였다.
이같이 흐르고 쉬지 않음을 알라면 그대가 직접 퇴계 선생을 보았지.
대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우뚝 우뚝한 영지산이 푸른빛 나는구나.
선생의 진은(眞隱)하던 곳을 우러러보니 두어간 높은 정자가 백운(白雲)에 끼쳤도다.
대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니,
한 봉오리 부용산(芙蓉山)이 푸른빛 잠겼구나.
그대, 분수(汾水) 위에 가서 시험해 보라, 노인성(老人星)이 일찍 옛 선암(仙庵)에 비치었지.
대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손수 심은 푸른 솔이 줄기가 바르구나.
울울창창 몇 백 년이던고, 해가 추워도 당시 빛을 고치지 않는구나.
대들보를 위로 던지니,
산월강풍이 무진장일레.
가슴의 일반 맑음을 어디서 신령한 옷깃에 향하여 기상을 평론할 수 있겠는고.
대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우뚝하게 눈앞에 큰 집이 보이는구나.
지나간 어진이의 유촉(遺躅)을 어디에서 찾을꼬?
강물이 출렁거리고 시내가 집을 둘렀도다.
엎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 귀신은 상서롭지 않음을 금지하고 지령은 빼어난 자를 잉태하여라. 후생이 와서도 네 조상을 생각하고 그 덕을 닦으라. 공의 영정이 당에 있으니 우리 뒤를 은혜로써 넉넉하게 하리라. 그 덕이 장하지 않은가, 사람이 시름이 없도다.
-玉川 趙德鄰(조덕린), 『농암집(聾巖集)』
●분강서원은 1699년 후손과 사림士林이 농암선생의 학덕學德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위패를 모신 숭덕사崇德祠와 강당 흥교당興敎堂과 성정재誠正齋, 동재 극복재克復齋, 서재 경서재敬恕齋, 그리고 관리사로 되어있다. ‘분강서원’ 편액은 성세정成世珽, 상량문 조덕린趙德隣, 기문 장신張璶, 봉안문은 김화金璍가 썼고, 서원창건의 전 과정이 적힌 ‘창원일기創院日記’와 ‘복원일기復元日記’를 비롯하여, ‘영정개모일기影幀改摹日記’, ‘전장기傳掌記’, ‘부조기扶助記’, ‘임사록任司錄’, ‘분강영당영건소계첩汾江影堂營建所稧帖’, ‘진설도陳設圖’, ‘홀기笏記’ 등의 적지 않은 자료가 남아있어 서원건축과 운영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숭덕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 분강서원은 매년 한 번 향사享祀를 치며, 평소에는 학생이나 학술단체 등에 개방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암사당(聾巖祠堂)
이 건물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농암 이현보(聾巖 李賢輔: 1467-1555)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분강서원(汾江書院)의 사당이다. 순조(純祖) 27년(1827)에 건립되었으며 원래는 도산면 분천동에 있었으나 안동댐 건설로 1975년에 도산면 운곡리로 옮겼다. 그 후 2005년 농암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 위치로 다시 이전하였다. 현재의 사당은 신문(神門)과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장은 토석담장이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우물마루로 바닥을 깔고 벽에는 농암의 영정을 모셨는데 경상도 관찰사 시절의 모습이라고 한다. 1800년대 건물이지만 고식이 잘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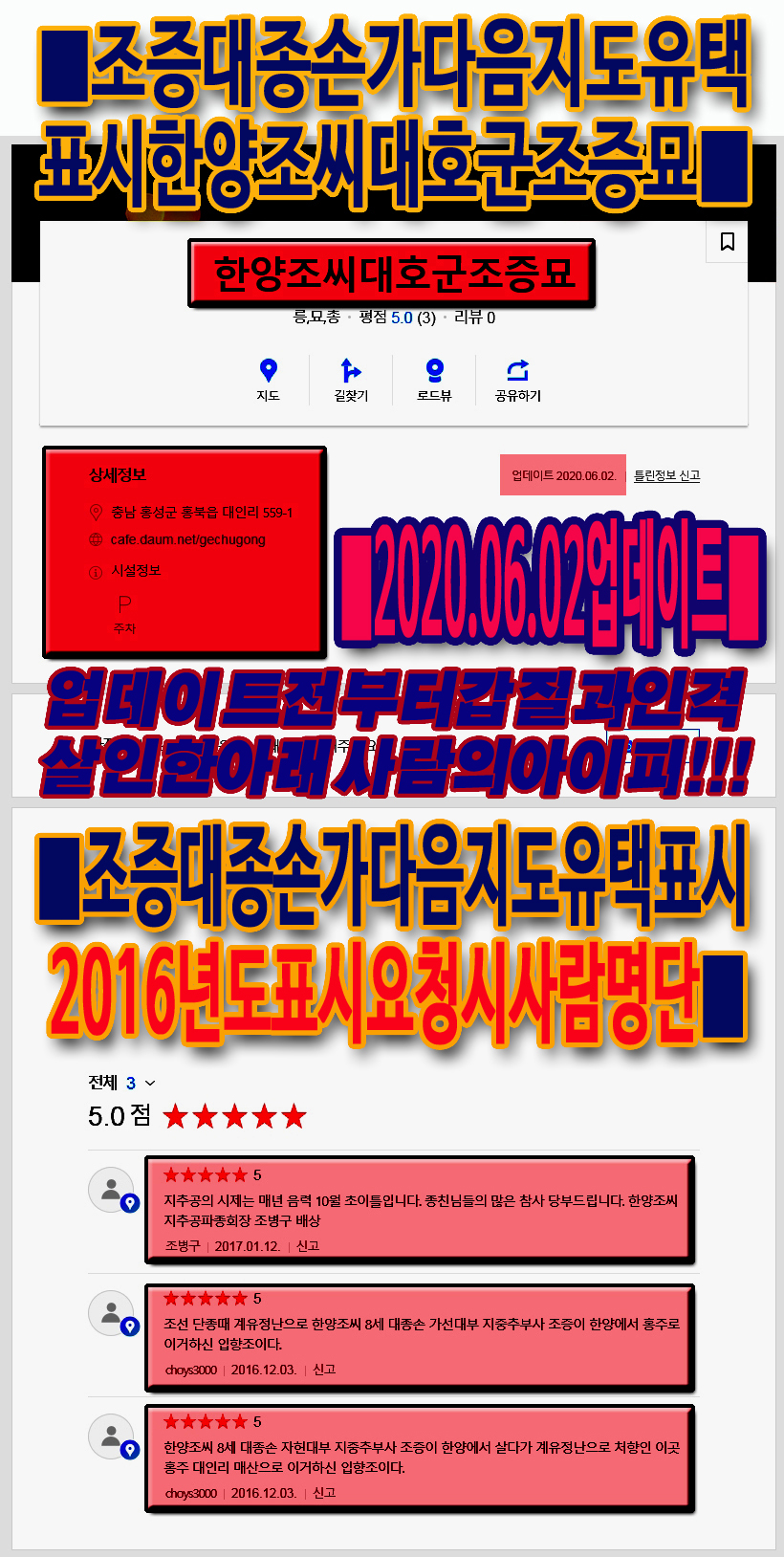

728x90
반응형
'❀漢陽人문화유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팔우헌집(八友軒集)▣ (5) | 2024.09.30 |
|---|---|
| 玉川公 趙德鄰(조덕린) 선조님 간찰 (4) | 2024.09.27 |
| ■모계집(慕溪集)부록 一.효충사 일록 4.제영(題詠) P.189 (4) | 2024.09.17 |
| ●성균진사조공강유허비음기(成均進士趙綱遺墟碑陰記)/趙綱先生行狀!!! (5) | 2024.09.14 |
| ▣神道碑銘:有朝鮮純忠奮義佐命開國元勳資憲大夫吏曹判書漢山府院君贈謚忠靖漢陽趙公仁沃▣ (4) | 2024.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