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zh.wikisource.org/wiki/%E5%85%83%E5%8F%B2/%E5%8D%B7166#%E7%8E%8B%E7%B6%A7




조순대부 첨의중서사에 대한 자료정리(조영휘님 연구)
朝順大夫僉議中書事의 연구.
1. 朝順大夫僉議中書事에 대한 우리 인식의 현주소.
2. 朝順大夫를 산계(散階)로 인식하는 경우의 문제점.
1) 산계(散階)와 직위의 불일치.
2) 조선 석학들의 관점.
3. 朝順大夫의 새로운 이해.
4. 결론
1. 朝順大夫僉議中書事’에 대한 우리 인식의 현주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서에도 없는 우리 시조의 관직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최초 족보 갑신보(甲申譜)는 4세 이상에 대하여 그 사적을 간략히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제(服制)가 끝났으므로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다고 문절공(文節公)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절공(文節公)의 지론과 맞물리면서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의 정체 문제는 우리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공(公)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세월이 몇 백 년은 흘렀을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상의 사적에 호기심을 가진 후손들도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의문에 관심 있는 후손들의 추구는 간단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미진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우리 세대 이전에는 그 어떤 연구 결과도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와서도 추론들은 더러 있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우리는 고맙게도 호형(昊衡) 씨의 연구 성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씨의 연구는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가 고려조의 첨의정승(僉議政丞)으로서 정일품(正一品)의 관직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씨의 노고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던 의문은 일순간에 안개 걷히듯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께서는 고려 조정에서 최고위직을 역임하셨습니다. 1651년에 간행된 한양 조씨의 두 번째 족보 신묘삼권보(辛卯三卷譜)가 최초로 기록한 시조의 행적‘朝順大夫僉議中書事’의 후반부 기록 僉議中書事에 대한 의문은 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朝順大夫僉議中書事’의 전반부 기록 朝順大夫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아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최근 간행된 우리 족보의 기록처럼‘朝順大夫僉議中書事를 역임하셨다.’고 그저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멈춰 서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족보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朝順大夫僉議中書事를 역임하셨다.’고 이해하는 데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朝順大夫는 산계를 말하는 것이고 僉議中書事는 밝혀진 바와 같이 관직이었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 해왔던 것입니다.
관직을 표시할 때 산계(散階)를 먼저 적고 뒤에 직위를 적었던 것은 이 나라가 중국의 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한 이래 바뀌지 않았던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산계(散階)는 朝順大夫이고 직위는 僉議中書事였다는 인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2. 朝順大夫를 산계(散階)로 인식하는 경우의 문제점.
1) 산계(散階)와 직위의 불일치.
그런데 우리는 朝順大夫를 산계(散階)로 인식하는 경우 심각한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朝順大夫라는 이름의 문산계(文散階)를 고려사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 비슷한 명칭의 朝(?)大夫 또는 (?)順大夫의 품계를 보면 기껏해야 3~4품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계(散階)와 직위의 불균형 관계는 朝順大夫가 문산계(文散階)를 표시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믿음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조선 석학들의 관점.
산계(散階)와 직위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朝順大夫가 빈번했던 고려 관직 개편 과정에서 잠시 존재했던 산계(散階)가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 견해는 현재 필자의 결론과는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미 있는 추론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대 석학들은 朝順大夫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를 살펴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 석학들의 견해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다음은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디지털화한 각종 문헌 자료에서 검색한 것입니다. 모두 한양 조씨의 시조(始祖)에 관한 기록입니다.
표1. 시조공의 관직 기술 사례
| 근거문헌 | 저자 (생존기간) |
출판년도 | 기록 종류 | 기록 내 용 |
| 한양조씨 辛卯譜 |
대종회 | 1651 | 族譜 | 朝順大夫僉議中書事 |
| 정암집 靜菴集 |
조선왕조 1681년 |
1681 | 世系圖 | 之壽漢城府人 高麗朝順大夫僉議中書事 |
| 현주집 玄洲集 |
趙纘韓 1572-1631 | 1651 | 墓碣銘 | 鼻祖諱之壽 高麗僉議中書事 |
| 기 언 記 言 |
許穆 1595-1682 | 1772 | 諡狀 神道碑 墓碣銘 |
始祖高麗僉議中書事 之壽 有僉議中書事 之壽 有諱之壽 爲僉議中書事 |
| 갈암집 葛庵集 |
李玄逸 1627-1704 | 1909 | 墓誌銘 | 仕高麗 官僉議中書事 之壽仕至僉議中書事 之壽仕高麗爲僉議中書事 |
| 남계집 南溪集 |
朴世采 1631-1695 | 1732 | 墓碣銘 | 之壽 高麗僉議中書事 |
| 염헌집 恬軒集 |
任相元 1638-1697 | 1760 | 墓誌銘 | 始祖之壽 僉議中書事 |
| 옥천집 玉川集 |
趙德鄰 1658-1737 | 1898 | 墓碑銘 行狀 |
之壽 仕爲高麗僉議中書事 麗之僉議中書事諱之壽 |
| 경암유고 敬庵遺稿 |
尹東洙 1674-1739 | 1916 | 墓碣銘 | 以高麗僉議中書事 諱之壽爲鼻祖 |
| 대산집 大山集 |
李象靖 1711-1781 | 1802 | 墓碣銘 | 高麗僉議中書事之壽 |
| 소산집 小山集 |
李光靖 1714-1789 |
? | 行狀 | 高麗僉議中書事曰之壽 |
| 번암집 樊巖集 |
蔡濟恭 1720-1799 | 1824 | 墓誌銘 | 之壽 在麗朝僉議中書事 |
| 해좌집 海左集 |
丁範祖 1723-1801 | 1867 | 墓誌銘 | 始祖之壽 高麗僉議中書事 |
위 문집의 저자들은 현주공 조찬한(趙纘韓)으로부터 채제공(蔡濟恭) 정범조(丁範祖)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대 조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양 조씨 가문의 문간공 조경(趙絅)을 비롯한 여러분의 묘지명 내지는 행장(行狀)을 저작하였습니다.
1651년 간행된 우리 족보 신묘보(辛卯譜)는 시조의 행적을 朝順大夫僉議中書事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1681년에 숙종 임금의 명에 따라 발간한 정암집(靜菴集)은 高麗朝順大夫僉議中書事라고 기록하였습니다. 1651년 신묘보(辛卯譜)와 함께 간행된 현주집(玄洲集)을 제외하면 모두 신묘보(辛卯譜) 간행 이후에 저작된 기록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신묘보(辛卯譜)의 기록에 의존해 시조의 행적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은 신묘보(辛卯譜)의 기록 朝順大夫僉議中書事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했을까요? 앞 표는 좀 복잡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표2. 시조 공의 관직 기술 요약.
| 근거 문헌 | 간행시기 | 관직기록 내용 |
| 辛卯譜 | 1651 | 朝順大夫僉議中書事 |
| 정암집 | 1651년 이후 | 高麗朝順大夫僉議中書事 |
| 기타 | 1651년 이후 | 仕高麗 官僉議中書事 之壽仕至僉議中書事 之壽仕高麗爲僉議中書事 |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우리 시조의 관직과 관련한 기록은 모두 30건입니다. 당대의 석학들은 모두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묘보(辛卯譜)의 기록 朝順大夫僉議中書事를 보고서도 관직 앞에 산계(散階)를 적지 않고 달랑 직위만을 기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신묘보(辛卯譜)와 같은 해에 간행되었던 현주집(玄洲集)의 경우에는 朝順大夫라는 구절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생을 한문과 더불어 살아온 학자들이 그 것도 관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관직 앞에 산계(散階)를 적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은 그들이 신묘보(辛卯譜)의 기록 朝順大夫를 산계(散階)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 朝順大夫의 새로운 이해.
우리는 앞에서 朝順大夫를 산계(散階)로 인식하는 경우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려 관제에 변동이 많았으나 朝順大夫와 충렬왕 이전 정승(政丞)의 산계와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양 조씨 선조들의 묘비명이나 행장을 썼던 당대의 대학자들은 朝順大夫를 산계(散階)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묘보(辛卯譜)가 기록한 朝順大夫를 이제까지의 인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당대 석학들의 기록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단서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표2를 다시 보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표2. 시조 공의 관직 기술 요약.
| 근거 문헌 | 간행시기 | 관직기록 내용 |
| 辛卯譜 | 1651 | 朝順大夫僉議中書事 |
| 정암집 | 1651년 이후 | 高麗朝順大夫僉議中書事 |
| 기타 | 1651년 이후 | 仕高麗 官僉議中書事 之壽仕至僉議中書事 之壽仕高麗爲僉議中書事 |
신묘보(辛卯譜)나 정암집은 (高麗)朝順大夫僉議中書事라고 적었습니다. ()속의 高麗는 국호로서 이의 사용 여부가 문장의 의미 차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高麗朝라고 썼든 그냥 朝라고 썼든 우리는 고려 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朝順大夫僉議中書事의 기록을 보았을 당대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시조가 고려 조정에서 벼슬하여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역임하였다.’라는 의미로 기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朝順大夫를‘(고려)조정에서 벼슬하여 00 직을 역임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朝順大夫의 大夫는 아무래도 분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大夫의 쓰임에 동사(動詞)로서의 기능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朝順大夫僉議中書事에서 朝順의 의미만을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표3. 朝와 順의 의미.
| 글자 | 의미 | 비고 |
| 朝 | (고려) 조정(朝廷) | 高麗朝 = 朝 |
| 順 | 有次第地放置 或移動物件 (중국판, 한어대사전의 설명) |
차례로 내려놓음. 또는 물건을 차례로 이동시킴. *放置 = 안배(安排, 按排) |
위 표3에서 살펴본 바대로 朝順의 의미를 새겨보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고려)조정이 00 벼슬에 (시조를) 차례로 안배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高麗)朝順大夫僉議中書事의 의미는‘(고려) 조정이 (시조를) 대부(大夫) 벼슬과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 벼슬에 차례로 안배하였다.’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시조는 대부(大夫) 벼슬과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 벼슬을 차례로 역임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大夫)를 산계(散階)의 명칭이 아닌 직위(職位)로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대부(大夫)는 정말 산계(散階)의 명칭이 아니고 벼슬자리의 명칭이었을까요? 아래 고려사 기록을 보기로 합시다.
<고려사 자료 1>
#高麗史76卷-志30-百官1-司議大夫-001
○司議大夫穆宗時有左右諫議大夫.文宗定左右各一人秩正四品.睿宗十一年詔:立本品行頭.後改左右司議大夫.忠烈王二十四年忠宣改左右諫議大夫降從四品後復改左右司議大夫.恭愍王五年復改諫議大夫陞從三品班在直門下上十一年復改右左司議大夫十八年復改左右諫議大夫二十一年復改左右司議大夫.
<고려사 자료 2>
#高麗史77卷-志31-百官2-文散階-001
○國初官階不分文武曰大舒發韓曰舒發韓曰夷粲曰蘇判曰波珍粲曰韓粲曰閼粲曰一吉粲曰級粲新羅之制也曰大宰相曰重副曰台司訓曰輔佐相曰注書令曰光祿丞曰奉朝判曰奉進位曰佐眞使泰封之制也.太祖以泰封主任情改制民不習知悉從新羅唯名義易知者從泰封之制尋用大匡正匡大丞大相之號.成宗十四年始分文武官階賜紫衫以上正階;改文官大匡爲開府儀同三司; 正匡爲特進; 大丞爲興祿大夫; 大相爲金紫興祿大夫; 銀靑光祿大夫爲銀靑興祿大夫.文宗改官制文散階凡二十九:從一品曰開府儀同三司; 正二品曰特進; 從二品曰金紫光祿大夫; 正三品曰銀靑光祿大夫; 從三品曰光祿大夫; 正四品上曰正議大夫下曰通議大夫; 從四品上曰大中大夫下曰中大夫正五品; 上曰中散大夫下曰朝議大夫; 從五品上曰朝請大夫下曰朝散大夫; 正六品上曰朝議郞下曰承議郞; 從六品上曰奉議郞下曰通直郞; 正七品上曰朝請郞下曰宣德郞; 從七品上曰宣議郞下曰朝散郞; 正八品上曰給事郞下曰徵事郞; 從八品上曰承奉郞下曰承務郞; 正九品上曰儒林郞下曰登仕郞; 從九品上曰文林郞下曰將仕郞. 忠烈王元年改金紫光祿爲匡靖銀靑光祿爲中奉其餘擬上國者悉改之. 二十四年忠宣改: 從一品曰崇祿大夫; 正二品曰興祿大夫; 從二品曰正奉大夫; 正三品曰正議大夫; 從三品曰通議大夫; 正四品曰大中大夫; 從四品曰中大夫. 正五品以下有上下?仍文宗舊制. 後有榮列正獻朝顯大夫之階. 三十四年忠宣又改官制: 一品始置正曰三重大匡; 從一品曰重大匡; 正二品曰匡靖大夫; 從二品曰通憲大夫; 正三品上曰正順大夫下曰奉順大夫; 從三品上曰中正大夫下曰中顯大夫; 正四品曰奉常大夫; 從四品曰奉善大夫; 五品始爲郞曰通直郞; 六品曰承奉郞; 七品曰從事郞; 八品曰徵事郞; 九品曰通仕郞. 尋於三重大匡重大匡之上加壁上三韓之號. 忠宣王二年去壁上三韓之號改: 正一品曰三重大匡; 從一品曰重大匡; 正二品上曰大匡下曰正匡; 從二品上曰匡靖大夫下曰奉翊大夫; 正三品上曰正順大夫下曰奉順大夫; 從三品上曰中正大夫下曰中顯大夫; 正四品曰奉常大夫; 從四品曰奉善大夫; 正五品曰通直郞; 從五品曰朝奉郞; 正六品曰承奉郞; 從六品曰宣德郞; 七品曰從事郞; 八品曰徵事郞; 九品曰通仕郞. 恭愍王五年改: 正一品上曰開府儀同三司下曰儀同三司; 從一品上曰金紫光祿大夫下曰金紫崇祿大夫; 正二品上曰銀靑光祿大夫下曰銀靑榮祿大夫; 從二品上曰光祿大夫下曰榮祿大夫; 正三品上曰正議大夫下曰通議大夫; 從三品上曰大中大夫下曰中大夫; 正四品曰中散大夫; 從四品曰朝散大夫; 正五品曰朝議郞; 從五品曰朝奉郞; 正六品曰朝請郞; 從六品曰宣德郞; 七品曰修職郞; 八品曰承事郞; 九品曰登仕郞. 十一年改: 正一品上曰壁上三韓三重大匡下曰三重大匡; 從一品曰重大匡; 正二品曰匡靖大夫; 從二品曰奉翊大夫; 正三品上曰正順大夫下曰奉順大夫; 從三品上曰中正大夫下曰中顯大夫; 正四品曰奉常大夫; 從四品曰奉善大夫; 正五品曰通直郞; 從五品曰朝奉郞; 正六品曰承奉郞; 從六品曰宣德郞; 七品曰從事郞; 八品曰徵仕郞; 九品曰通仕郞. 十八年改: 正一品上曰特進輔國三重大匡下曰特進三重大匡; 從一品上曰三重大匡下曰重大匡; 正二品上曰光祿大夫下曰崇祿大夫; 從二品上曰榮祿大夫下曰資德大夫; 正三品上曰正議大夫下曰通議大夫; 從三品上曰大中大夫下曰中正大夫; 正四品上曰中散大夫下曰中議大夫; 從四品上曰朝散大夫下曰朝列大夫; 正五品以下同五年之制. 二十一年又改階號未考.
<고려사 자료 3>
#高麗史76卷-志30-百官1-司憲府-001
○司憲府掌論執時政矯正風俗*紏{糾}察殫劾之任. 國初稱司憲臺.成宗十四年改御史臺有大夫中丞侍御史殿中侍御史監察御史.顯宗五年武臣金訓等請罷御史臺置金吾臺使副使錄事並無常員.六年罷金吾臺復以御史臺爲司憲臺置大夫中丞雜端侍御司憲殿中侍御司憲監察司憲.十四年復改御史臺.宗十一年陞權知監察御史班在閣門祗候上.文宗定:判事一人大夫一人秩正三品;知事一人中丞一人從四品;雜端一人侍御史二人並從五品;殿中侍御史二人正六品;監察御史十人從六品[文吏各五人.]. 睿宗十一年詔:知事雜端立本品行頭.神宗五年御史二人陞爲叅秩.忠烈王元年改監察司仍改大夫爲提憲中丞爲侍丞侍御史爲侍史監察御史爲監察史.二十四年忠宣改爲司憲府改提憲復爲大夫陞從二品侍丞復爲中丞增二人陞從三品侍史改內侍史殿中侍御史改殿中內侍史監察史改監察內史省爲六人新置注簿一人正七品减知事雜端尋復改監察司以內侍史復爲侍御史殿中內侍史爲殿中侍御史監察內史爲監察御史.三十四年忠宣復改司憲府改大夫爲大司憲陞正二品中丞爲執義陞正三品侍御史爲掌令陞從四品殿中侍御史爲持平陞正五品監察御史爲*紏{糾}正增十四人其四兼官仍從六品.忠宣王三年降大司憲正三品執義從三品後復改監察司以大司憲爲大夫.恭愍王五年復改御史臺大夫如故改執義爲中丞省一人掌令爲侍御史持平爲殿中侍御史降從五品*紏{糾}正爲監察御史.十一年復改監察司仍復改中丞爲執義侍御史爲掌令殿中侍御史爲持平陞正五品監察御史爲*紏{糾}正.十八年復稱司憲府改大夫爲大司憲革執義置知事兼知事從三品掌令改侍史持平改雜端降從五品加置兼*紏{糾}正.二十一年革知事復置執義改侍史復爲掌令雜端爲持平.吏屬文宗置錄事三人令史四人書令史六人計史一人知班二人記官六人筭士一人記事十人所由五十人.
<고려사 자료 4>
#高麗史78卷-志32-食貨1-田制-田柴科-003
穆宗元年三月賜郡縣安逸戶長職田之半.十二月改定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第一科田一百結柴七十結[內史令侍中.];第二科田九十五結柴六十五結[內史門下侍郞平章事致仕侍中.];第三科田九十結柴六十結[叅知政事左右僕射檢校太師.];第四科田八十五結柴五十五結[六尙書御史大夫左右散騎常侍*大常卿致仕左右僕射太子太保.];第五科田八十結柴五十結[秘書殿中少府將作監開城尹上將軍散左右僕射.];第六科田七十五結柴四十五結[左右丞諸侍郞 諫議大夫大將軍散六尙書.];第七科田七十結柴四十結[軍器*大常少卿給舍中丞太子賓客太子詹事散卿監侍郞.];第八科田六十五結柴三十五結[諸少卿少監國子司業諸衛將軍太卜監散軍器監上將軍太子庶子.];第九科田六十結柴三十三結[諸郞中軍器少監秘書殿中丞內常侍國子博士中郞將折衝都尉*大醫監閣門使宣徽諸使判事散少卿少監.]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려에서는 간의대부(諫議大夫)와 어사대부(御史大夫)라는 벼슬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계(散階)의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산계(散階)의 명칭인지 아닌지는 <고려사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 자료 2>는 고려 전 기간에 걸쳐 문산계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쳤는지 밝히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의대부(諫議大夫)와 어사대부(御史大夫)라는 산계(散階)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들이 산계(散階) 명칭이 아니고 직위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간의대부(諫議大夫)와 어사대부(御史大夫) 외에도 <고려사 자료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헌부(司憲府)에는 말씀 그대로 대부(大夫)라는 2-3품의 벼슬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에서 우리는 朝順大夫의 大夫가 벼슬자리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께서 차례로 대부(大夫)와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를 역임했다면 대부(大夫)는 간의대부(諫議大夫)와 어사대부(御史大夫) 그리고 사헌부의 대부(大夫) 중 어느 것이었을까요? 필자에게는 사헌부(司憲府)의 대부(大夫) 벼슬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간의대부(諫議大夫)가 충렬왕 이전까지 정4품(正四品) 자리였는데 반해 사헌부(司憲府)의 대부(大夫) 자리는 최소 정3품(正三品)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朝順大夫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朝順은‘조정이 아무개를 어떤 자리에 배치(排置)한다.’는 의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大夫는 산계(散階) 명칭과는 관계없는 벼슬자리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 신묘보(辛卯譜)의 기록 朝順大夫僉議中書事는 우리 선조들의 묘비명이나 행장을 쓴 당대 석학들의 해석과 상치되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신묘보(辛卯譜)의 기록 朝順大夫僉議中書事를 기존의 이해선상에서 바라보면 완성된 문장이 아닌 명사(名詞)의 나열에 불과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朝順大夫라는 문제를 안고 고심했던 이유는 기본 전제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朝順大夫는 산계(散階) 명칭이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朝順大夫는 산계(散階)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갑신보에는 조지수만 조원기선조님이 기록하여 발간했는데, 신묘2권3책보(上/下上/下下)에는 문간공선조님이 사후 10년에 시조님의 관직까지 넣어 영흥조씨들 손록에 별록으로 발간한 엉터리 사기족보이나. 조세정선조님도 상주 함창현선생안에는 없는데도 함창군수를 임명하였다고 사기치면서 발간하였습으로 신묘3권보(상/중/하)라 하는 족보는 페기하야할 엉떵리 족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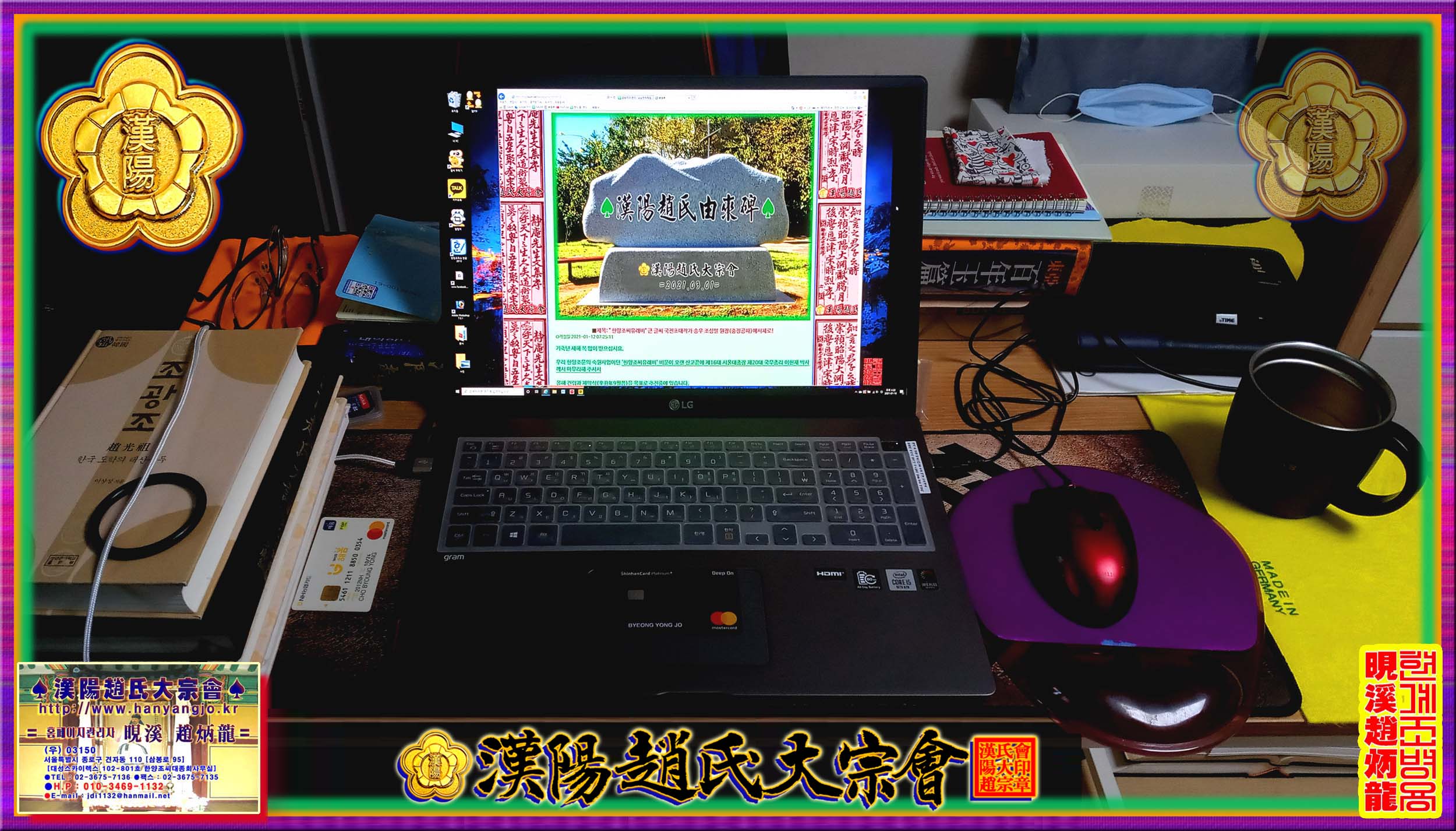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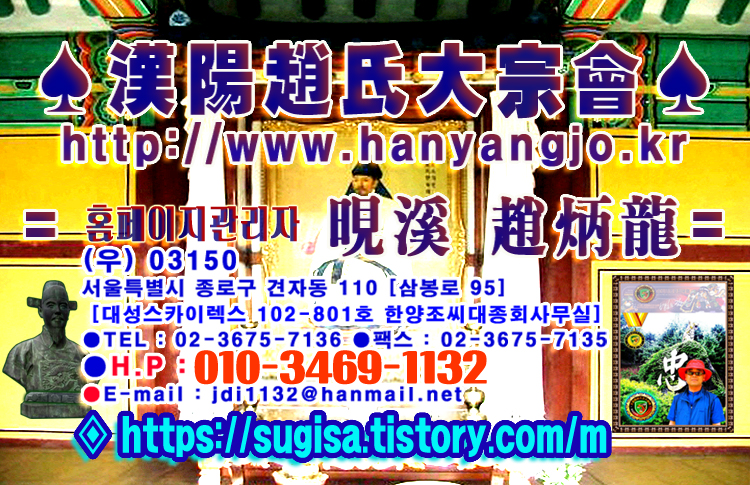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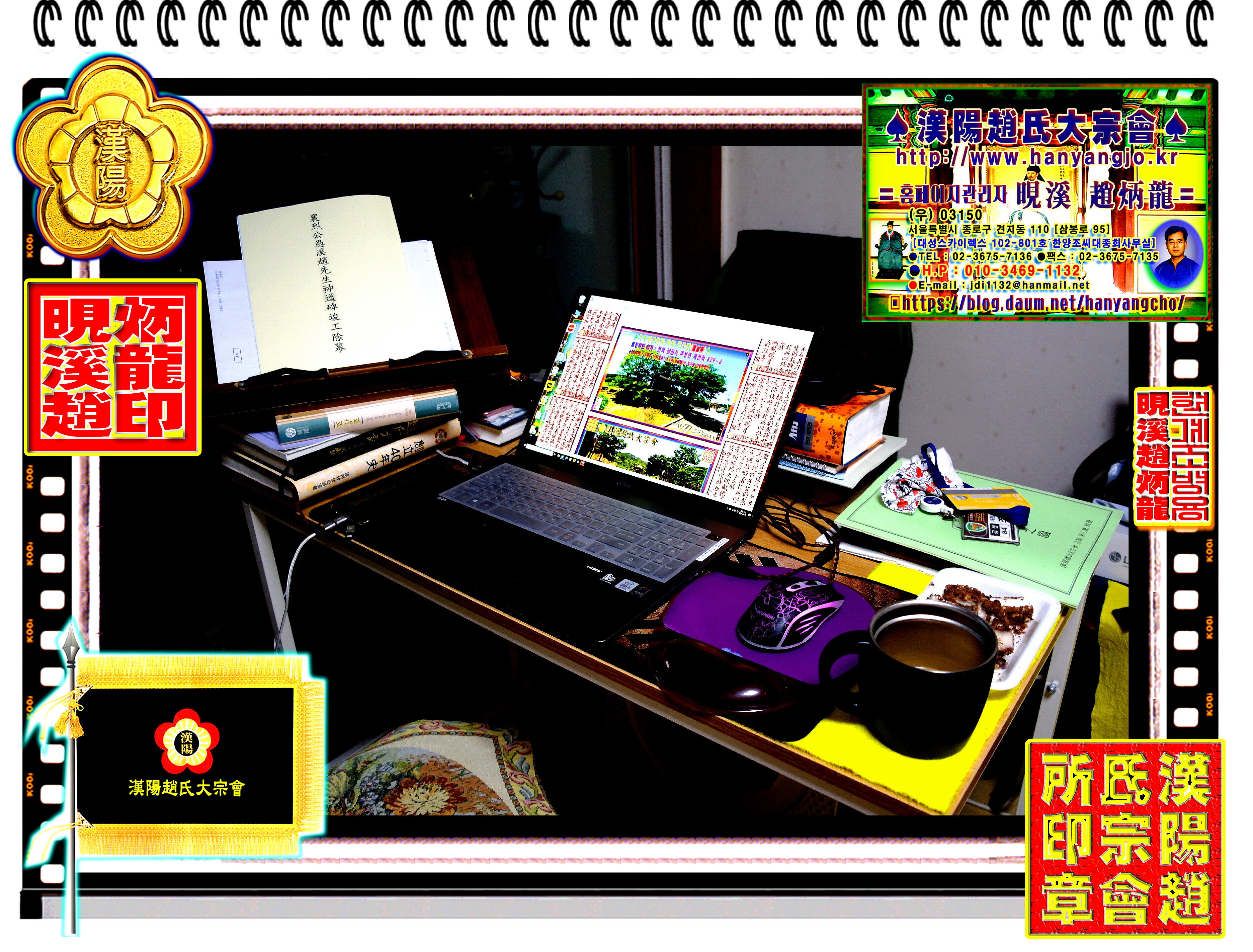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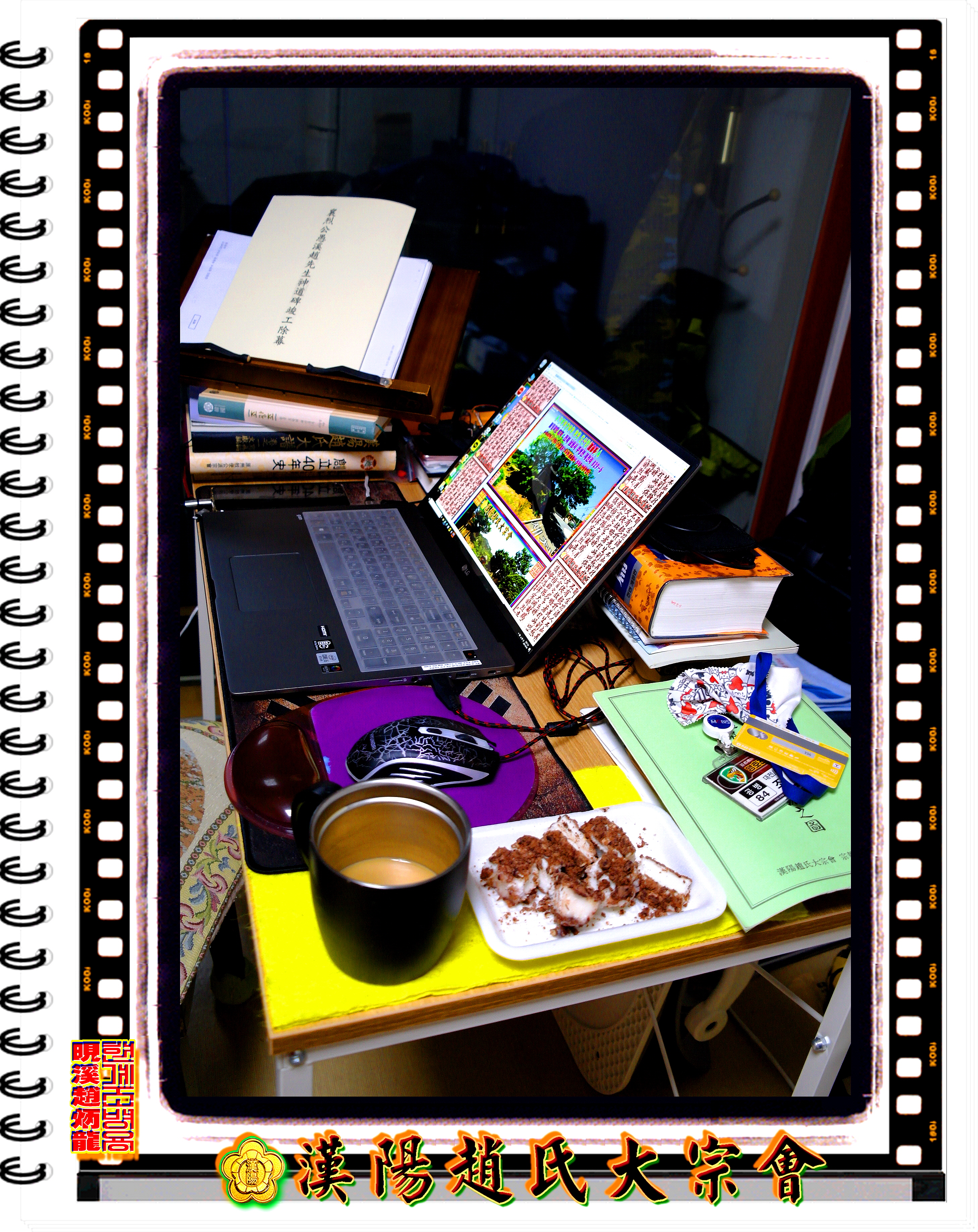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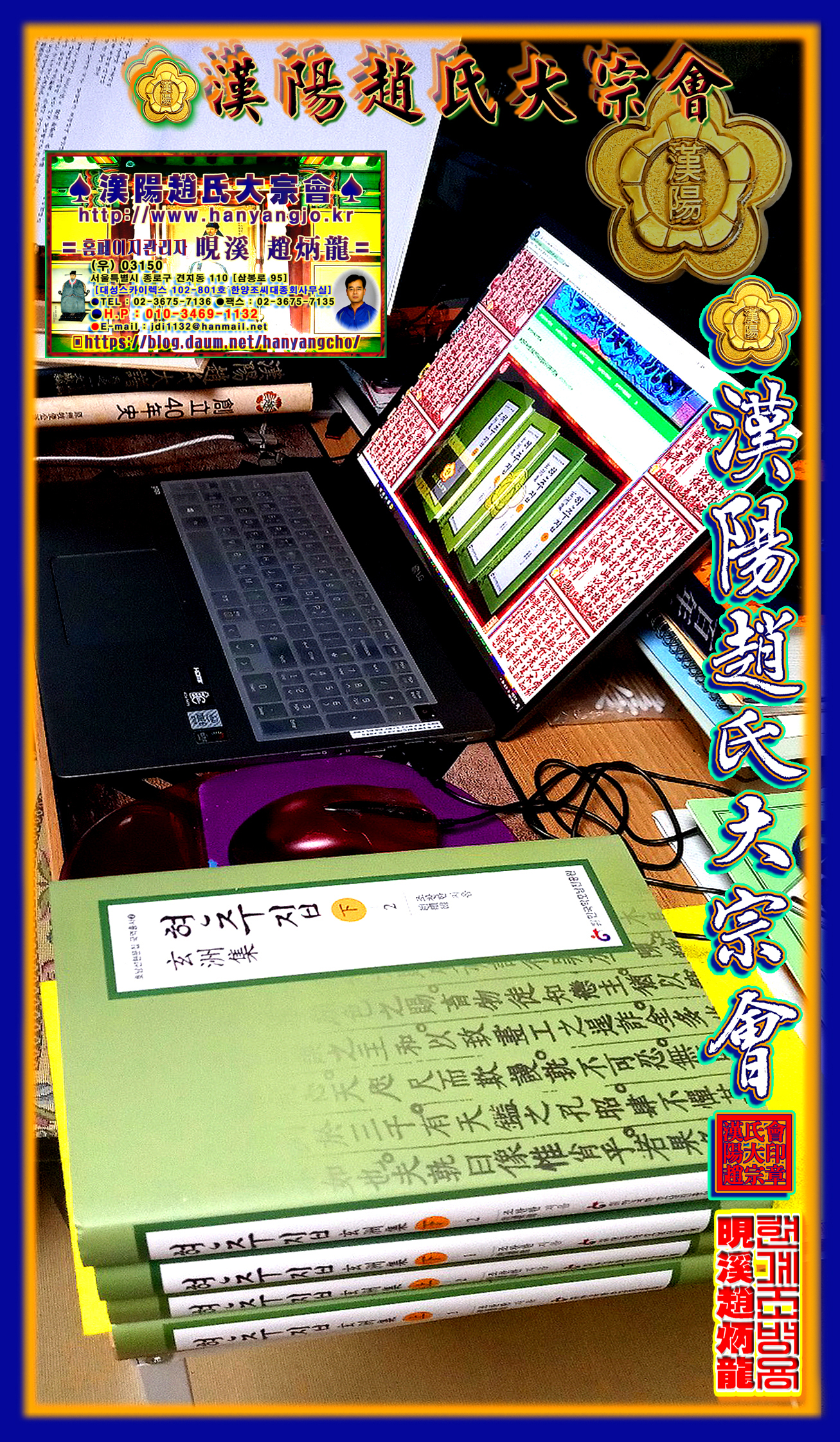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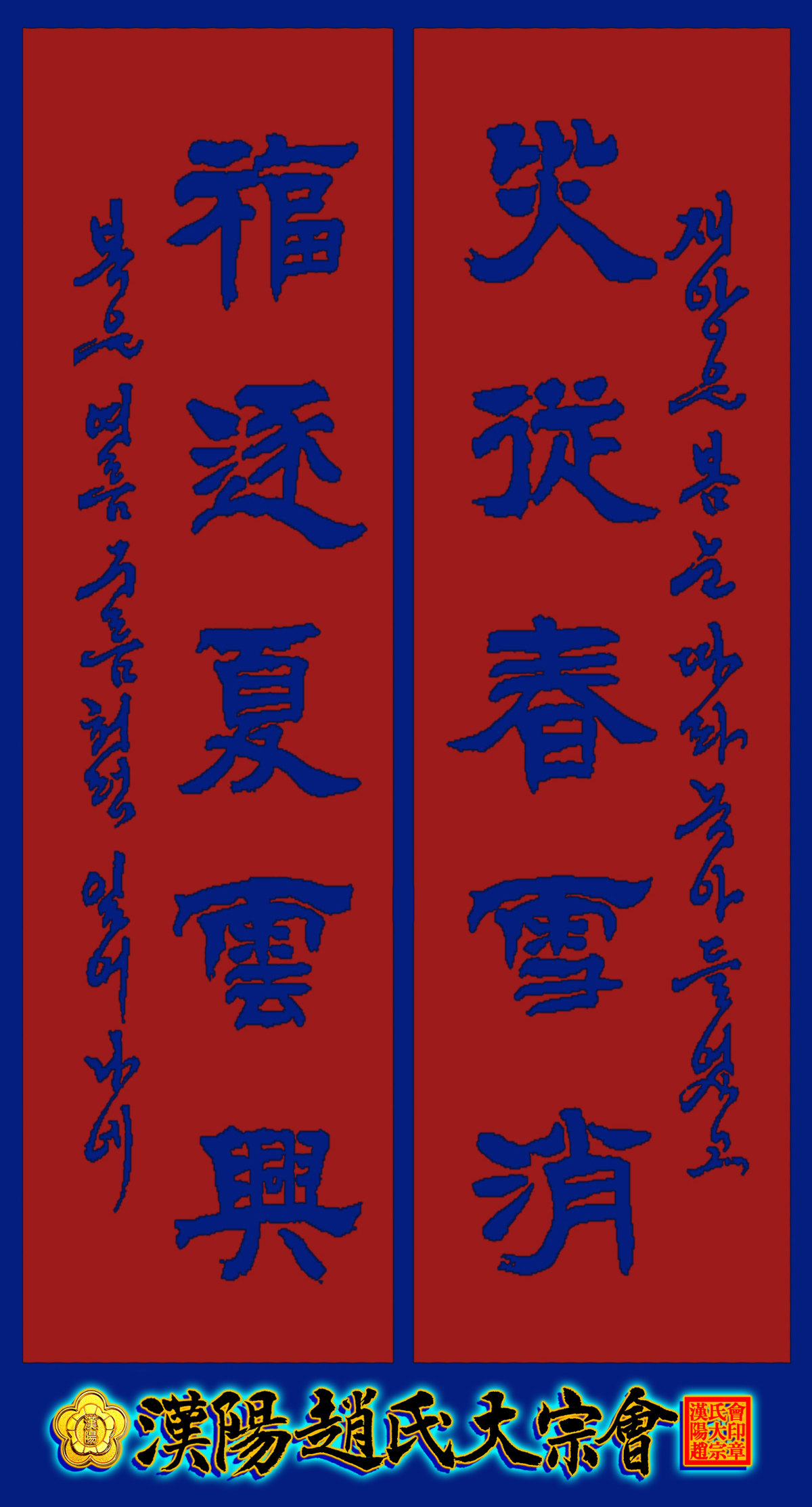
728x90
반응형
'❀漢陽人문화유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양조씨 양절공 부조묘 제향 (2024. 6. 24)♠ (0) | 2024.06.26 |
|---|---|
| ▣임시종회소 발문(發文) - 통고문(通告文)▣ (0) | 2024.06.26 |
| ▣종약장 제2호 통문(通文)▣대종약임시종회소 발문(發文,1933) 통고문(通告文)▣ (0) | 2024.06.25 |
| ◐靜菴先生文集跋[朴世采]◐안순지(安順之)에게 답장(答狀)한 편지◑ (0) | 2024.06.25 |
| 竹石館遺集 册二 / 跋 《정암집》 사본 뒤에 쓰다〔書靜菴集寫本後〕 (0) | 2024.06.25 |




